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총장 이건우)은 최상현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팀이 차세대(사진)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는 멤리스터를 웨이퍼 단위로 대규모 집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최 교수팀은 드미트리 스트르코프 미국 UC샌타바버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소재-소자-회로-알고리즘 공동 설계’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이 방식을 통해 복잡한 제조 과정 없이 10㎝ 웨이퍼 전면에 95% 이상의 높은 수율을 달성한 멤리스터 크로스바 회로를 구현했다.
연구팀은 수직 방향으로 여러 층을 쌓는 3차원(3D) 적층 구조도 만들었다. 이는 멤리스터 기반 회로가 대규모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다. 또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AI 연산에서 높은 효율성과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두뇌형 반도체’는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이지만 현존하는 AI 반도체는 복잡한 회로와 높은 전력 소비 등으로 두뇌 수준의 효율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멤리스터다. 멤리스터는 전류가 흐른 양을 기억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로,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구조가 단순해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밀도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크로스바 형태로 배열하면 기존 메모리(SRAM)의 수십 배 정보를 같은 면적에 저장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멤리스터 집적기술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차세대 AI 반도체 플랫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대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5 days ago
8
5 days ago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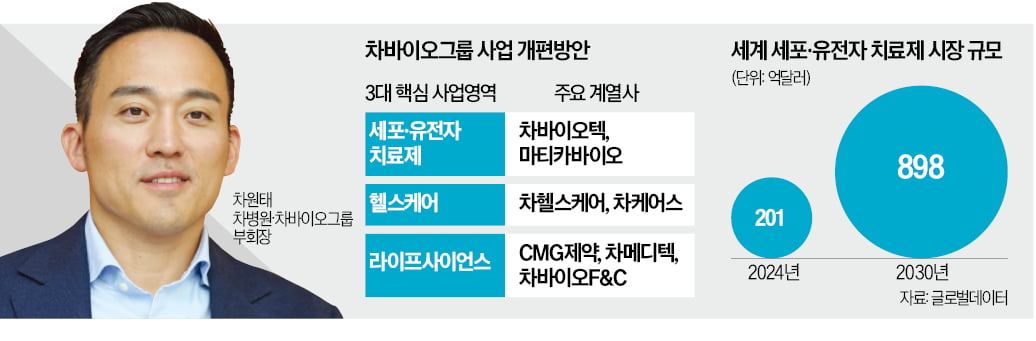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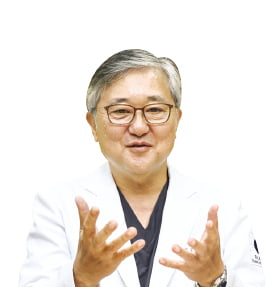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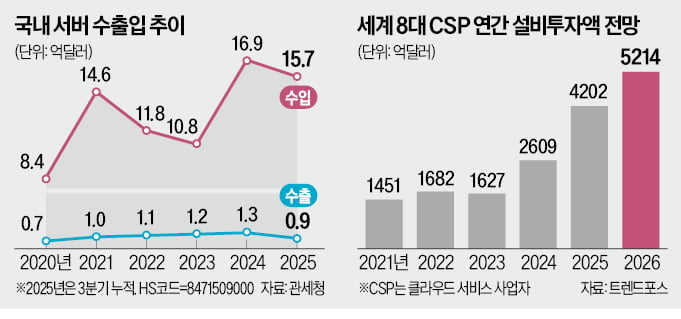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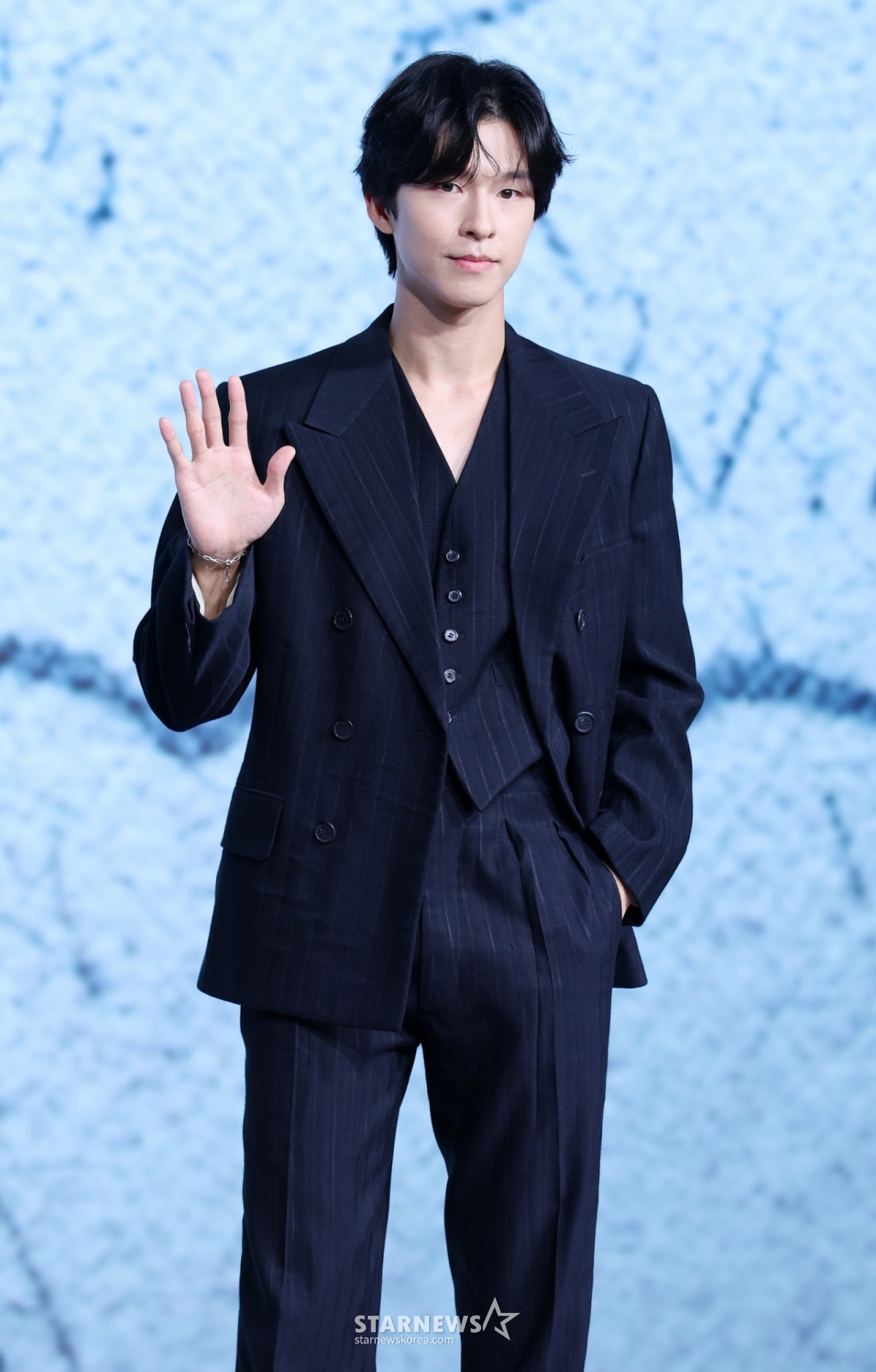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