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 장편소설 ‘상도’에는 계영배(戒盈杯)라는 비기(秘器)가 등장합니다.
석승 스님이 임상옥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를 점지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비기(秘器)로 전해준 바로 그 잔, 계영배(戒盈杯). 임상옥은 이 잔의 이름을 스스로 계영배라 작명하고 평생 이 잔을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다.최인호, <상도>, 여백, 2000, 2편 본문 中
소설 ‘상도’ 주인공 임상옥을 조선 최대의 무역왕으로 만들어준 비기(秘器) 계영배.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이 이 잔의 이름을 스스로 계영배라고 작명한 것으로 나와서 마치 소설적 상상력의 산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계영배는 한국 미술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매우 진귀하고 독특한 술잔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계영배를 소설의 결정적 모티브로 등장시킨 건 역시 이야기꾼 최인호다운 기발한 선택이죠. 하지만 계영배는 살피면 살필수록 흥미로운 서사를 지닌 매력적인 예술품입니다.
일단 계영배는 한자를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그 용도를 알기 어려운데요. 경계할 계(戒) 넘칠 영(盈) 술잔 배(杯) 즉 ‘술이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란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계영배는 평범한 도자기로 만든 예쁜 술잔처럼 보이지만, 이 술잔 내부에는 고도의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명 사이펀(siphon) 원리인데, 계영배 잔의 내부는 양쪽의 높이가 서로 다른 관이 들어있습니다. 관에 물이 들어가면 관 양쪽 끝의 위치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다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바로 사이펀입니다. 위치에너지가 높은 곳의 물이 관을 통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계영배는 조선이 창안한 발명품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서양과 동양에서 모두 존재했던 전세품(傳世品: 옛날부터 소중히 다루어 전래 된 물건으로 주로 미술품)으로, 서양의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만든 피타고라스의 컵이 시초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컵을 와인잔 용도로 만듭니다. 중국의 경우는 금원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전세품들이 있죠. 동서양 막론하고 술이나 물 등을 귀하고 특별하게 마시기 위한 용도는 동일합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비롯된 과학인 사이펀 원리가 조선시대 술잔에 등장한 것도 흥미롭지만, 이런 독특한 잔이 나온 배경은 더욱 재밌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폐쇄적인 유교문화가 가속화됐던 조선시대는 강력한 음주 규제책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국가가 나서서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술을 즐기는 문화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방증하죠. 결국 술은 마셔야겠고 국가의 정책도 지키고 싶은 사대부와 왕실 등 ‘지배계층의 딜레마’가 낳은 결과물이 계영배인 겁니다.
무엇보다 계영배는 조선의 사대부가 중시하는 품격 있는 풍류에도 꼭 들어맞았습니다. 술은 즐기되 일정 정도 이상 따르면 술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절주가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딱 적정하게 술을 따르지 않으면 마시기 어려운 잔이니 마시는 재미도 더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잔을 가득 채울수록 잔은 빈 잔이 되는 아이러니는, 흥은 취하되 술은 절제하는 정말 기발한 방법인 셈이죠.

조선시대 강력한 금주 정책의 산물인 계영배를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가 술을 폭음하는 문화를 계영배를 통해 술을 음미하는 문화로 바꾸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보였듯, 너무 넘쳐서 문제인 현대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넘침을 경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미술사 전공인 국민대 장지영 교수는 “계영배를 통해 마치 차를 음미하듯 술을 향음한 조선시대 전통을 오늘날에 부활해서 술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로 계승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통문화는 사실 그대로 답습만 해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상황에 견주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현대 문화에 적용하려는 과정이 중요하죠.
지금은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계영배. 조선시대를 통틀어 현재 전해지는 계영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귀한 진짜 계영배 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뮤지엄 굿즈(문화상품)을 줄여서 일명 ‘뮷즈’라는 신조어로 칭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뮷즈로 계영배를 판매 중입니다. 의미와 재미를 담은 수장품을 뮷즈로 만든 기획력이 탁월하죠.
올봄 만개해서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계영배는 없더라도 조선시대 선조들처럼 술을 차처럼 ‘음미하는 풍류’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최효안 예술 칼럼니스트·디아젠다랩 대표

 1 week ago
5
1 week ag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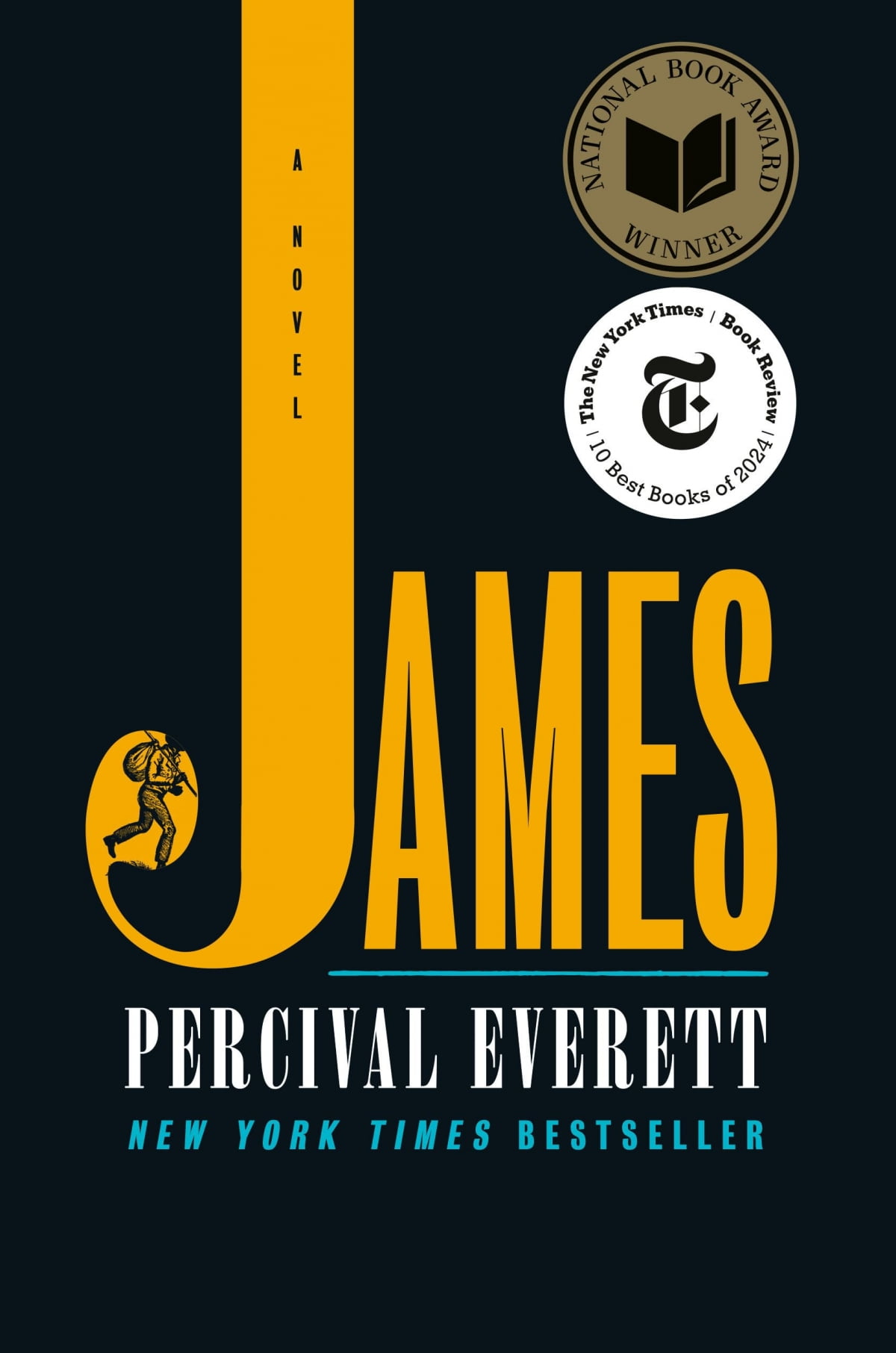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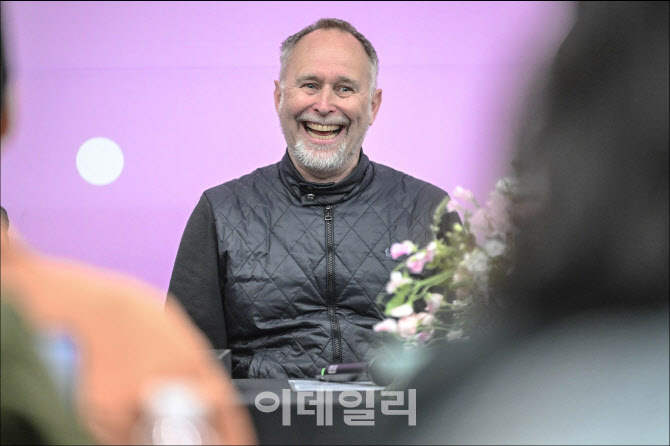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