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A씨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2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 C로부터 “대리점 실적을 위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가입신청서 및 확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C는 A씨 명의로 총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유심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을 허락해 ‘타인에 통신 제공’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유심 개통에 명확히 동의했고 일부 회선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C의 말을 믿고 단순히 돕기 위한 선의에서 유심 개통을 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회선의 유심을 개통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고, 금전적 대가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책임도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4 hours ago
5
4 hours ag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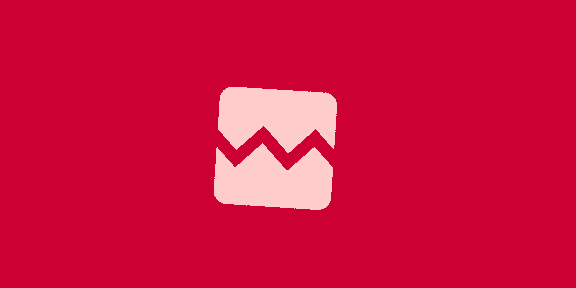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