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심해 기획한 갈라 공연은 전막 공연보다 힘이 셀 수 있다.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내한 공연이 증명하듯이 말이다. 서울 논현로 GS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3년 만에 내한한 ABT가 ‘클래식에서 컨템퍼러리까지’라는 제목으로 나흘간 공연했다. 고전발레 발췌작부터 20세기 미국 모던발레 대표작, 장르 경계를 허무는 최신작까지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매일 조금씩 달리 구성한 ‘미니 시즌’을 통해 단체가 보유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자랑하고 예술적 비전을 보여줬다.
◇고전부터 모던발레까지
개관 행사 이후 처음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25일 공연은 ‘상징적이고 혁신적인’(iconic&innovative)이라는 부제로 조지 발란신, 트와일라 타프, 카일 에이브러험의 작품을 트리플빌로 선보였다. 발란신과 타프는 미국 모던발레의 양대 기둥이고 에이브러험은 촉망받는 컨템퍼러리댄스 안무가다. 세 작품은 각각 40여 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혁신을 견인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와 변주’(1947)는 러시아 출신이지만 미국 발레의 아버지가 된 발란신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가 세운 뉴욕시티발레단이 아니라 ABT에서 초연했다는 점에서 ABT의 방대한 레퍼토리를 상징한다. 차이코프스키 모음곡 제3번 마지막 악장 ‘주제와 변주’의 구조를 반영한 신고전주의 발레다. 대칭으로 늘어선 대형에서 남녀 주역 무용수가 주고받는 단순한 탕뒤(tendu) 동작으로 시작해 정교하고 섬세하게 변주해 나간다.
여성 주역 데번 토셔는 성악가에게 비유하면 알토라고 할 정도로 묵직하고 단단한 축을 지니면서도 유독 날카롭고 정교한 발동작으로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줬다. 남성 주역인 한성우는 부드럽고 깔끔하게 춤췄으나 전날의 부상 여파를 감출 순 없었다. 24명의 솔리스트 및 군무는 균질하지 않고 잔실수가 있었지만 놀라운 생기를 뿜어냈다. 복잡하게 얽히는 대형과 동작은 줄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 춤이 아니라 게임하듯 함께 즐기는 춤이어서다.
◇고정관념 깬 새로운 시도
에이브러험의 ‘변덕스러운 아들’(2024)은 빈 무대에 일곱 명의 무용수가 계속 등·퇴장하는 추상발레다. 제목이 발란신의 대표작 ‘돌아온 탕아’(Prodigal Son)를 암시하는데, 성서 줄거리는 없지만 비현실적으로 부유하는 분위기에서 남성 무용수 한 명의 회귀로 귀결되는 구조나 남성 무용수들의 하늘거리는 튜닉이 탕아의 모티브를 연상케 했다. 동시에 수은이 지닌 금속적이고 강렬하며 변하기 쉬운 속성을 회전과 스피드 그리고 급변하는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무용수들은 돌고 또 돈다. 하나의 동작이 완결되고 이어진다기보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해버리고 포즈를 하기도 전에 녹아버린다.
타프의 ‘다락방에서’(1986)는 관객에게 고양감을 선사하는 마무리 작품으로 적격이었다. 무대를 채우다 못해 밖으로 쏟아지는 스모그 사이로 죄수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줄무늬 파자마, 빨간 양말과 레오타드, 흰 스니커즈 등을 신은 무용수들이 삼삼오오 들락날락하며 춤춘다. 이승 혹은 천국을 은유하는 모호한 공간에서 무용수들은 마치 아침 루틴을 시작하듯 헐렁한 파자마를 입고 무심하고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점차 옷을 벗는다. 발레부터 맨손체조, 재즈, 에어로빅을 넘나드는 생경한 움직임은 발레 어휘를 현대화했다기보다는 막춤을 추는데 몸에 밴 발레가 스며 나오는 듯하다.
소련 망명 스타로 ABT 예술감독을 지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는 타프를 선망해 여러 작품을 의뢰했다. 고전발레의 규율에서 벗어나 새로운 춤을 추고 싶던 그에게 타프의 춤은 자유의 이데아였을 것이다. 무용수들은 두세 명씩 같은 동작을 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맞추려는 대신 함께, 그러나 자기 몸의 리듬에 동기화된 춤을 춘다. 무용수의 위계, 중심과 주변의 경계, 안무의 규율이 흐려졌다.
조형미 대신 운동성, 집단 대신 개인이 강조된 세 작품을 보고 나자 ABT의 비전이 명료히 떠올랐다. 발레의 규범을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 삼아 다양한 몸이 자기 춤을 추는 것. 마른 몸들의 칼군무를 포기하더라도 말이다.
정옥희 무용비평가

 1 week ago
6
1 week ago
6
![장근석·오윤아 이어 진태현까지…갑상선암 발병 원인은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0269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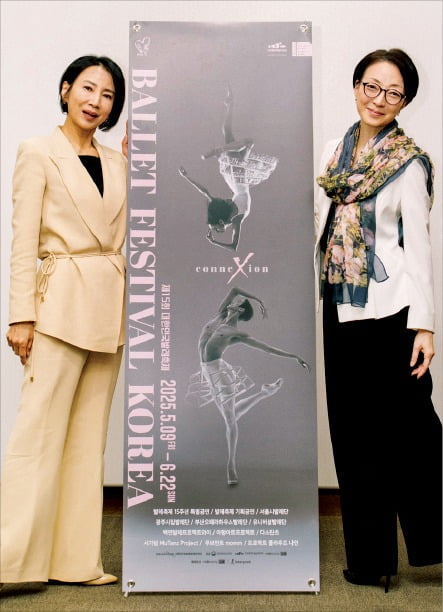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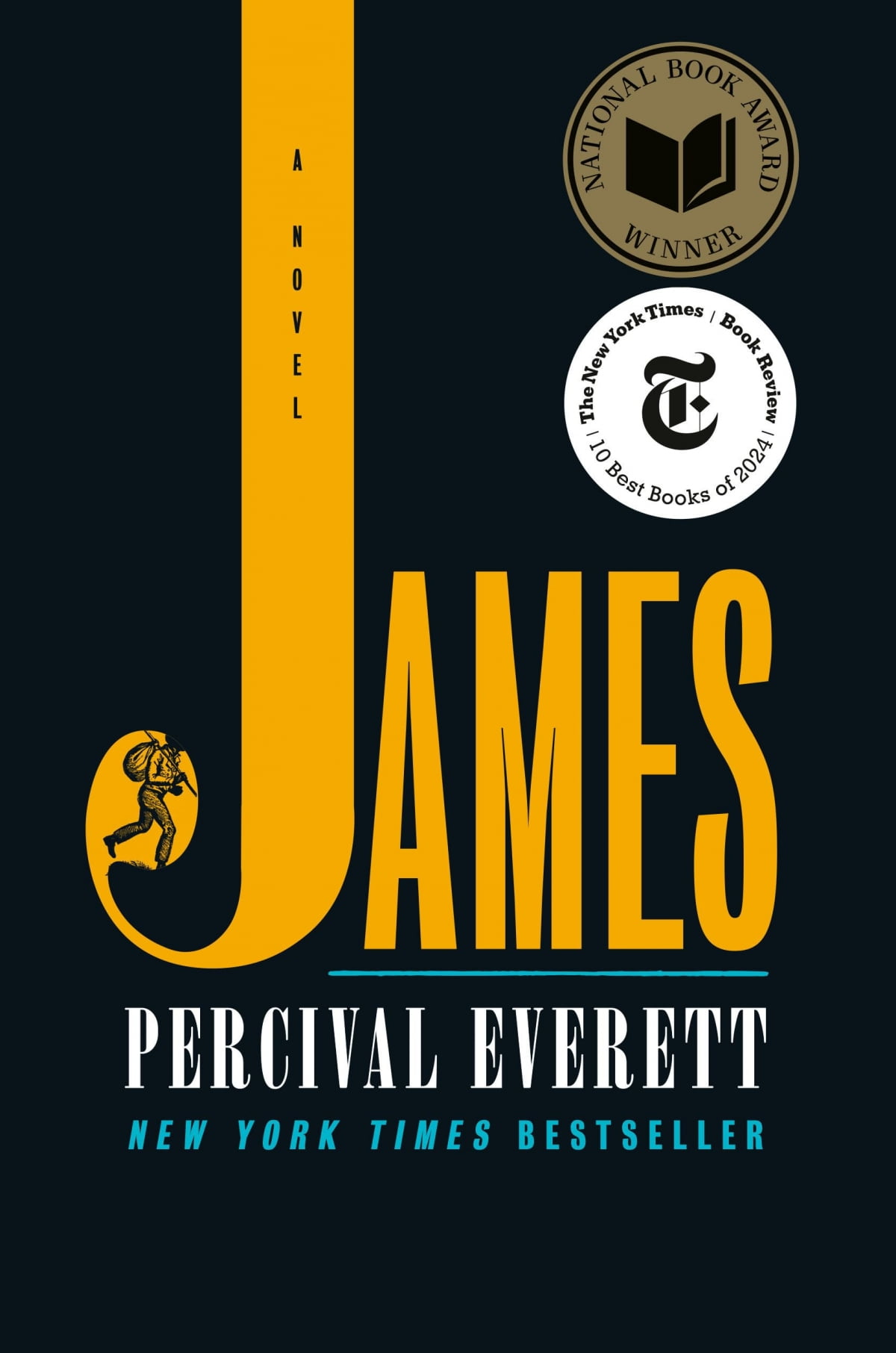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