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강신우 기자] 최근 구글코리아, 카카오, 쿠팡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동의의결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피해구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은 피해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죄부’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 경쟁당국에선 이 취지를 살려 동의의결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2011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32건으로 연간 평균 2건 수준이다. 이는 “기업 봐주기”라는 부정적 시각과 실효성이 낮다는 시각 때문이다.
실제로 동의의결은 기업의 시간 끌기와 같은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 2013년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건과 2014년 롯데와 CJ의 동의의결 신청 건은 최종 제재 결정 예정일 닷새 전 동의의결이 신청됐다. 2020년 남양유업과 2021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건의 조사 개시일은 각각 2017년 5월, 2016년 6월이었으나 동의의결 신청일은 2~3년 지난 2019년 7월, 6월이었다.
미국에선 동의의결제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통계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2023년까지 총 536건이 접수되는 등 활발히 활용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시정방안에 중점을 둔다.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동의의결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법무부(DOJ) 동의판결 사례에선 금지명령과 함께 직접적 소비자피해배상을 위한 금전적 배상명령이 이뤄진다”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해당 피해배상이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배상 방식으로 이뤄진 사례도 적다”고 짚었다.
일본 역시 독점적 배제조치에 관해 ‘확약절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형태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의의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보다 직접적인 소비자피해배상안이 동반돼야 하는 셈이다. 송 연구원은 “동의의결제도 운영의 신중성은 유지돼야 하지만,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의의결 활용이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구제로 이어질 경우 해당 제도의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되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활용에서 사업자 면죄부 부여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 hours ago
2
4 hours ago
2
![[속보] 코스피 2,625.36(▲16.94p, 0.65%), 원·달러 환율 1,418.0 (▲2.0원) 개장](https://www.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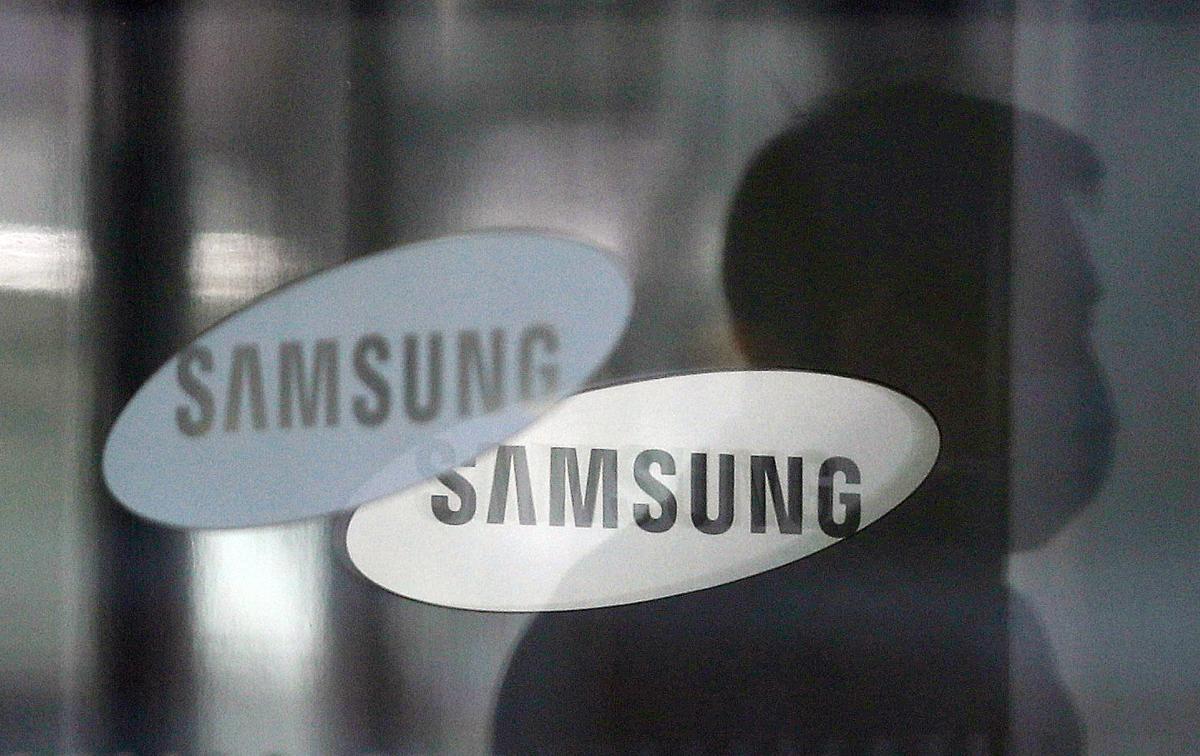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