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영화제의 심장이라면 화려한 개막식도, 가슴 뭉클한 회고전도, 그해의 경쟁 섹션도 아닌 바로 단편 경쟁 섹션이다.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같은 다른 메이저 영화제들도 그러하지만, 전주는 유독 뛰어난 단편 영화가 빛나는 영화제이다. 나 역시 처음으로 영화제에서 단편영화를 보고 열광했던 곳은 다름 아닌 전주였다. 영화제는 단편을 통해 영화제의 가능성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도 전주국제영화제의 단편 섹션은 발군의 한국 단편 영화들을 큐레이션 했다. 그중 3편을 먼저 만나보자.
① <월드 프리미어>, 김선빈

주인공인 영화감독 노정현은 촬영을 끝낸 후 편집에 매달려 있다가 6년 만에 드디어 영화제로부터 초청을 받게 된다. 그간 절친이었던 주연 배우와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정현은 용기를 내어 완성된 영화를 들고 수년 만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녀의 집에는 월드 클래스 시네필을 자처하는 남편이 있고 정현과 친구의 남편은 각자의 '영화관(映畵觀)'에 대한 설전을 벌인다. 정작 배우였던 친구는 영화라는 세계를 버린 지 오래인 듯하다. 변해버린 친구에게 마음이 상한 정현은 영화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녀의 집을 떠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스탭과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월드 프리미어>는 무엇보다 재기발랄하고 유쾌하다. 특히 친구의 남편으로 분하는 배우 문상훈(빠더너스)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인 요소다. 물론 영화를 완성해 놓고도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해, 혹은 개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동료를 마주할 수 없는 영화감독의 현실은 생각보다 흔하고 가슴 아픈 현재의 이야기지만, <월드 프리미어>는 그럼에도 이들을 다시 소환하는 존재 역시 영화라는, 아름답고도 자명한 진리를 공유한다. 문상훈 배우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퀴’ 수준의 자잘한 영화 지식 역시 이 영화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②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 남소현

단편 프로젝트에서 보기 쉽지 않은 해외 올 로케이션 영화다. 영화는 독일 베를린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7년간 살다가 어떠한 연유로 귀국해야 하는 ‘은하’의 이야기를 그린다. 은하가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녀가 7년 동안 닦아 놓은 터전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어떤 물건들을 23킬로그램 안에 포함시키고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안 그래도 우울한 은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궁극적으로 영화는 ‘(해외여행에서 요구되는) 23킬로그램밖에 넣을 수 없는 가방’이라는 상징적인 아이콘을 통해 타지와 타인, 그리고 추억과 기억을 기록하는 행위에 대한 사유를 해보기를 제안하는 듯하다. 그것은 꼭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은하는 이제 막 베를린으로 유학을 온 ‘윤정’을 통해 그녀의 자취를 추억한다. 은하의 방,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생필품들은 이제 윤정의 것이 된다. 그렇게 은하의 일상은 윤정의 일상으로, 윤정의 추억은 은하의 기억으로 서로를 대체하며 각자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는 30분이라는 러닝타임 안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쌓아놓는다. 그리고 분명 그것들은 ‘23킬로그램의 짐가방’으로는 싸지 못할 무게와 의미를 갖는다.
③ <세 개의 방향>, 이서현

영화는 세 사람(사진 강사, 중년의 남자 수강생, 모델)이 진행 중인 한 사진 강습을 그린다. 수강생은 강사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반박을 던지고, 강사 역시 아마추어에게 지기 싫은 듯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두 사람이 조용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모델은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본다.
마침내 강습이 끝나고 모델과 수강생은 옥상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운다. 수강생은 모델에게 본인이 찍었던 핸드폰 사진들을 보여준다. 신이 나서 사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수강생 뒤로 아름다운 노을빛이 비친다. 빛은 스튜디오에서 조명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던 둘의 논쟁을 무색하게 한다. 조율할 수 없는 찬란하고 귀한 빛. 모델은 남자의 뒷덜미를 쓸어내리는 빛과 피부의 경계를 한참이고 바라본다.
영화 <세 개의 방향>은 각기 다른 빛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시선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연의 빛이 (인간의 육신을 타고) 세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흩어지는 광경을 전시한다. 이 두 개의 접근은 각기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 개의 빛을 통한 하나의 예술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진'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접선(接線)이다. 자연은 인간을 품고, 인간은 빛을 통해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자연에서 예술과 접선한다.
김효정 영화평론가•아르떼 객원기자

 1 week ago
4
1 week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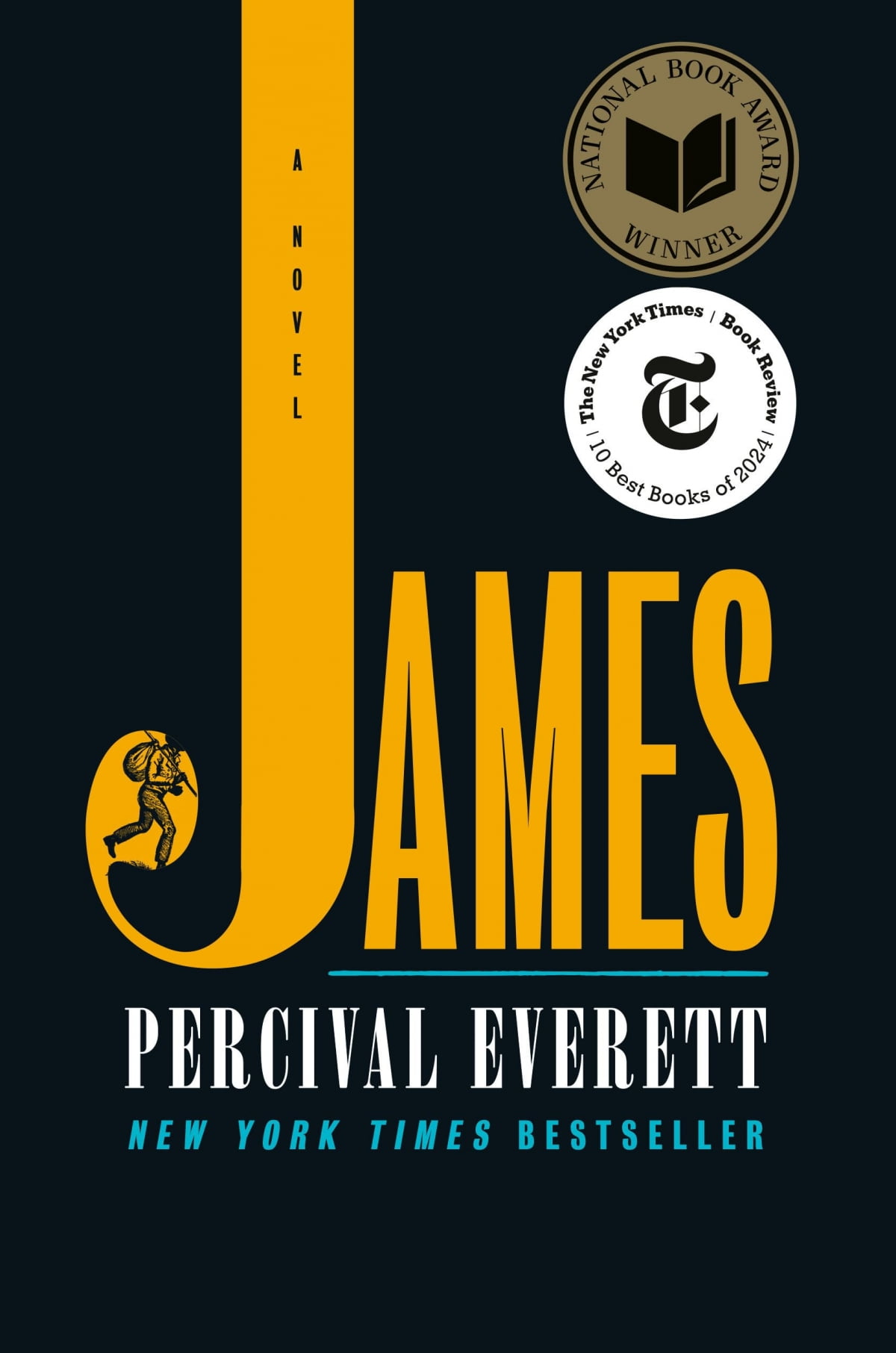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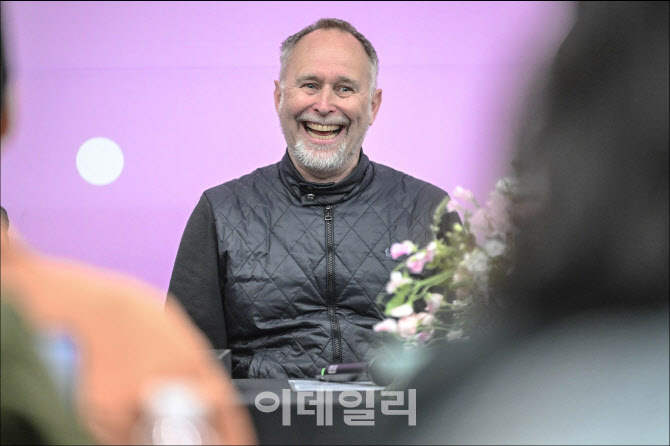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