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장기를 이식받으러 해외로 떠나느냐 싶죠. 하지만 ‘원정 이식’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식 후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정부 공식 집계는 없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런 환자가 여전히 병원을 드나든다고 합니다.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지쳐 국경을 넘는 사람들. 그들이 향하던 곳은 한때 중국이었습니다. 2000~2016년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한국 환자는 최소 2206명, 그중 97.3%가 중국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참고기사 [단독]年 130명 원정 이식… 97%는 중국서 수술)
그러나 201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거래를 단속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문이 좁아지자 새롭게 열린 문, 그곳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 “일반 환자 안 받는 수상한 병원… 그곳에서 5000만 원에 콩팥 이식받아”
최근 캄보디아의 한 교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에 70대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중국계 병원에서 콩팥을 이식받았어요. 한국에서 이식 순서가 언제 돌아올 지 모르니까 현지로 간 거예요. ‘(꼭 맞는 장기를) 찾았다’는 연락이 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2, 3일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창문엔 병원 표시(╋)가 붙어있지만 일반 환자는 받지 않는 수상한 병원이었어요.”
믿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교민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습니다.“대가는 5000만 원 정도였어요. 프놈펜에만 국내 폭력조직이 10개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중 장기 브로커 일을 겸하는 대구 쪽 조폭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환자는 이식 받은 장기가 자연사한 시신에서 적출된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분(이식 환자)은 죄 의식은 없어요. 병원에서는 자연사한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알 사람은 다 알죠.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라는 걸요.”
● 캄보디아, 10년 새 ‘장기 이식의 음지’로

물론, 그의 전언만으로 불법 거래의 실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장기 밀매를 입증하는 외신 보도는 이미 여럿입니다.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민 122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콩팥을 적출하려 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팬데믹 기간에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죠. 12명이 체포됐고, 그중 3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참고기사 Indonesia arrests 12 for human trafficking in illegal organ trade)
2022년 10월 대만 당국은 캄보디아에서 장기 적출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데려온 조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직은 “고수입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건강검진을 가장한 X-레이 촬영을 실시했고, 이후 ‘전염병 예방조치’라며 콩팥 등을 적출해 암시장에 판매했습니다.

● “수술은 누가 하나?”… 중국 병원의 그림자

문제는 캄보디아가 독자적으로 고난도 이식수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들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까.
김황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중국의 한 성(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적출 시스템이 그대로 수출된 겁니다.”
중국이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병원 여러 곳을 지어줬고, 그곳에서 장기 적출과 이식이 진행된다는 얘깁니다. 2022년 3월 중국이 프놈펜에 약 8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병원을 세웠을 땐 개원식에서 훈센 총리가 “이런 수술이 일부 사기꾼에게 불법 비즈니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군 병원들이 과거 장기 적출을 주도해 왔고, 그 의사들이 지금 캄보디아 병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병원을 사실상 중국 자본과 인력이 운영는 거죠.”
캄보디아가 2016년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장기 출처 관리체계의 투명성도 약합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이 불법 이식의 ‘안전지대’를 만든 셈입니다.
● 절망의 양 끝, 두 개의 ‘탈출’

한국의 ‘수요’와 동남아의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부유한 국가의 환자가 생존을 위해 돈을 내고, 가난한 국가의 주민은 생계를 위해 장기를 팔거나 중개합니다. 국제 사회가 ‘장기 관광(transplant tourism)’을 규제하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 교민들은 이식 수술에 쓰인 장기의 출처를 두고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한국인은 162명입니다. 이중 일부가 장기 매매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결국 이 의혹의 양 끝에는 두 부류의 한국인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한국에서 마땅히 먹고살 길을 찾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인신매매 단지에서 감금·착취에 시달리다 사라진 청년들, 다른 한쪽은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합법의 문턱 바깥으로 밀려난 환자들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콩팥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2222일에서 올해 6월 2888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간 이식의 경우 132일에서 204일로 늘어났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가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지난해 4만5567명까지 늘었는데,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397명까지 줄었습니다. (참고기사 장기기증 매년 줄어… 신장 이식 8년 가까이 기다려야)
● 왜 ‘기증 자동 동의제(Opt-out)’인가
불법 장기 거래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 ‘기증자의 부족’입니다. 합법 이식이 어려울수록 절박한 환자들은 국경 밖 음지로 몰립니다.
한국이 특별히 생명나눔 의식이 부족해서 기증 장기가 부족한 걸까요. 제 견해는 다릅니다. 제도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기 기증은 현재 ‘명시 동의제(Opt-in)’입니다.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기증 등록자는 줄고 있습니다. 2014년 176만 명이던 장기기증 희망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12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기자는 10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널리 퍼졌고, 맥스와 키이라의 가족은 이후 장기기증 제도 개혁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맥스는 이식 후 건강을 되찾아 BBC 등에서 “키이라 덕분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019년, 영국 의회는 이들의 이름을 딴 법을 통과시켜 ‘자동 동의제(Opt-out)’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즉, 생전에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망 시 자동으로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덕에 장기 기증 동의율이 2020년 58%에서 지난해 67%로 상승했고, 가족 반대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32%로 하락했습니다. 기증 거부 등록자는 전체 성인 중 3.1%에 그쳤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참고자료 NHS 보고서)
40년 넘게 자동 동의제를 운영하는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기증률(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48.9명)을 기록 중입니다. 한국(9.3명)의 5배가 넘습니다.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1999년 2월 제정됐을 때부터 줄곧 명시 동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긴 했지만 법안 논의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국내에서 기다림에 지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 합법의 경로를 넓혀야 불법이 줄어든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장기 밀매 시장을 추적하는 일은 국제 공조가 필요한 복잡한 과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협력해 한국 청년이 감금돼있을 ‘웬치(범죄단지)’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장기 밀매가 이뤄진다고 지목된 병원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에 있습니다. 기증자가 부족한 사회에서, 장기를 사고파는 시장은 음지에서 스스로 생겨납니다. 장기 기증의 문턱을 낮추고, 합법적 경로를 넓혀야 불법 시장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죠.
그 절박함이 법의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복지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제는 자동 동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제도적 복지는 언제나 가장 절박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6 hours ago
2
16 hour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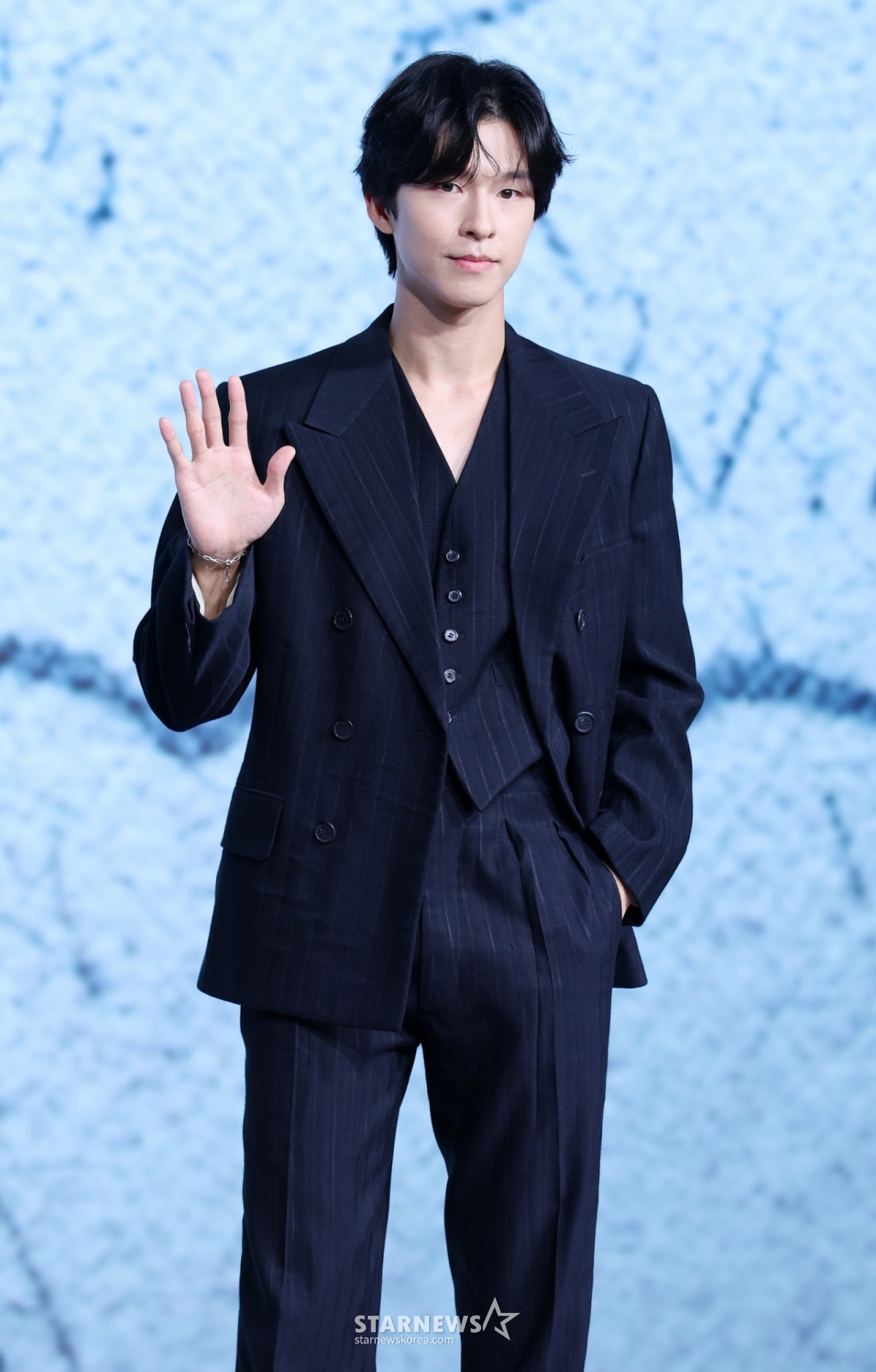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