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위 아이돌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까요? 아름다워 보일수록 타인이 결정한 육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외모지상주의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이 집약된 곳입니다. 몸매를 드러낸 아이돌이 무대를 장악합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 가슴, 허리의 곡선을 부각합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육체를 난도질하듯 하나하나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코가 너무 크고 누군가는 가슴이 빈약합니다. 완벽한 외모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누군가 역시 젊음과 미모를 잃는 순간, 끝장입니다. 그들은 대체 가능한 소비재일 뿐입니다. 곧바로 다른 신인들이 그들의 빈 자리를 메꿉니다. 연예인의 육체를 소비하는 행위는 이처럼 순환의 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영화 <서브스턴스>(2024) 제목의 뜻은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생성하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영화는 주사기에 든 약물을 달걀 노른자에 주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곧바로 새로운 노른자가 원래의 노른자 안에서 만들어져 옆으로 튀어나옵니다. 새로 탄생한 노른자는 원래의 그것보다 더 선명하고 탱탱한 색을 띱니다. 이 샛노란 빛은 주인공 엘리자베스 스파클(데미 무어)이 즐겨 입는 코트의 색상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은 젊음과 경쾌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의와 경고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공사 현장에 붙은 경고문과 안전모의 색상 역시 노란색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오스카상을 받은 여배우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든 그녀는 왕년의 스타 취급을 받습니다.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서브스턴스 요법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영화 초반 달걀 노른자에서 이루어졌던 복제가 엘리자베스의 육체에서 재현됩니다. '보다 나은 내가 되어라'라는 서브스턴스의 광고 문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찢는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숙주의 가슴을 뚫고 탄생하는 에일리언처럼 클론(복제 인간)은 그녀의 등골을 찢고 세상에 나옵니다. 숙주의 죽음과 함께 탄생하는 에일리언과 달리 클론은 원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당신은 하나다'라는 제약회사의 슬로건처럼 원본과 클론은 정신과 자아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육체를 지닌 두 존재가 동일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점점 서로 다른 두 인간처럼 분열되어 갑니다. 엘리자베스에게서 태어난 수(마가렛 퀄리)는 엘리자베스가 진행하던 에어로빅 쇼의 진행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되어 잃어버린 젊음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수가 아닌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점점 두 개체는 동일성을 잃어갑니다. 이제 그들의 자아정체성은 붕괴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태어난 수에게 엘리자베스는 모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수는 점차 엘리자베스의 몸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수의 젊음을 질투합니다. 이는 외모 강박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의 자기혐오를 상징하는 동시에 여성 집단 간의 시기와 반목을 상징합니다.
카메라는 수의 입술과 엉덩이, 가슴, 배 등 그녀의 신체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후술하겠지만, 파편화되고 조각난 바디 이미지는 이 신랄한 바디 호러 영화에서 충격적인 형태로 표출됩니다. 완벽한 바디 이미지에 대한 요구는 사회가 현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배는 납작해야 하지만 가슴과 엉덩이는 풍만해야 합니다. 이 모순적 욕망을 실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수 역을 맡은 마가렛 퀄리는 풍만한 가슴을 위해 보형물을 옷 속에 덧대야 했습니다)

수는 제약회사의 경고를 어기고 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엘리자베스로 지내야 하는 기간을 줄입니다.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수의 등을 찢고 다시 한번 클론이 탄생합니다. 용법을 어겨서였을까요? 두 번째 클론은 끔찍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론의 등에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앞판에는 수의 얼굴이 달려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여러 개의 눈과 코, 유방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름다울지도 모를 신체의 파편들은 배치가 잘못된 탓에 기괴하고 추악해 보일 뿐입니다.
수의 몸에서 유방처럼 보이는 살덩어리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수의 몸은 기괴한 고깃덩이가 되어 관객들에게 피와 살점을 흩뿌립니다. 여성에게 가하는 사회의 폭력을 향한 피의 복수극입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인물과 상황을 내세웁니다. 자괴감과 외모 강박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 여성을 상품으로만 보는 엔터 업계 인물, 성적 매력만을 내세우는 젊은 여성. 얼핏 보면 전형적인 클리셰로 보이지만 이 설정에는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의도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영화 속 세계보다 세련되고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걸 크러쉬'나 진보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관한 직설적인 언급은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근원적 욕망은 여전히 아름답고 젊은 여성의 육체를 판매하려는 데 있습니다. 코랄리 파르자 감독은 그 욕망의 원형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 위해 전형적인 인물과 상황을 제시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에 데미 무어가 캐스팅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든 데미 무어는 엘리자베스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성형 수술을 한다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데미 무어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외모에 대한 결코 닿을 수 없는 기준을 내면화하는 악녀로 데미 무어만큼 적절한 배우가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고스트>(1990) 시절의 청순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 영리한 배우는 잘 가꾼 외모만큼이나 성숙해진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화는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원본의 등골을 뚫고 나온 또 다른 자아처럼 데미 무어는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태어난듯한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영화 <서브스턴스>는 서글픈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한다는 사실을요.
이수정 문화콘텐츠 기획자

 1 week ago
1
1 week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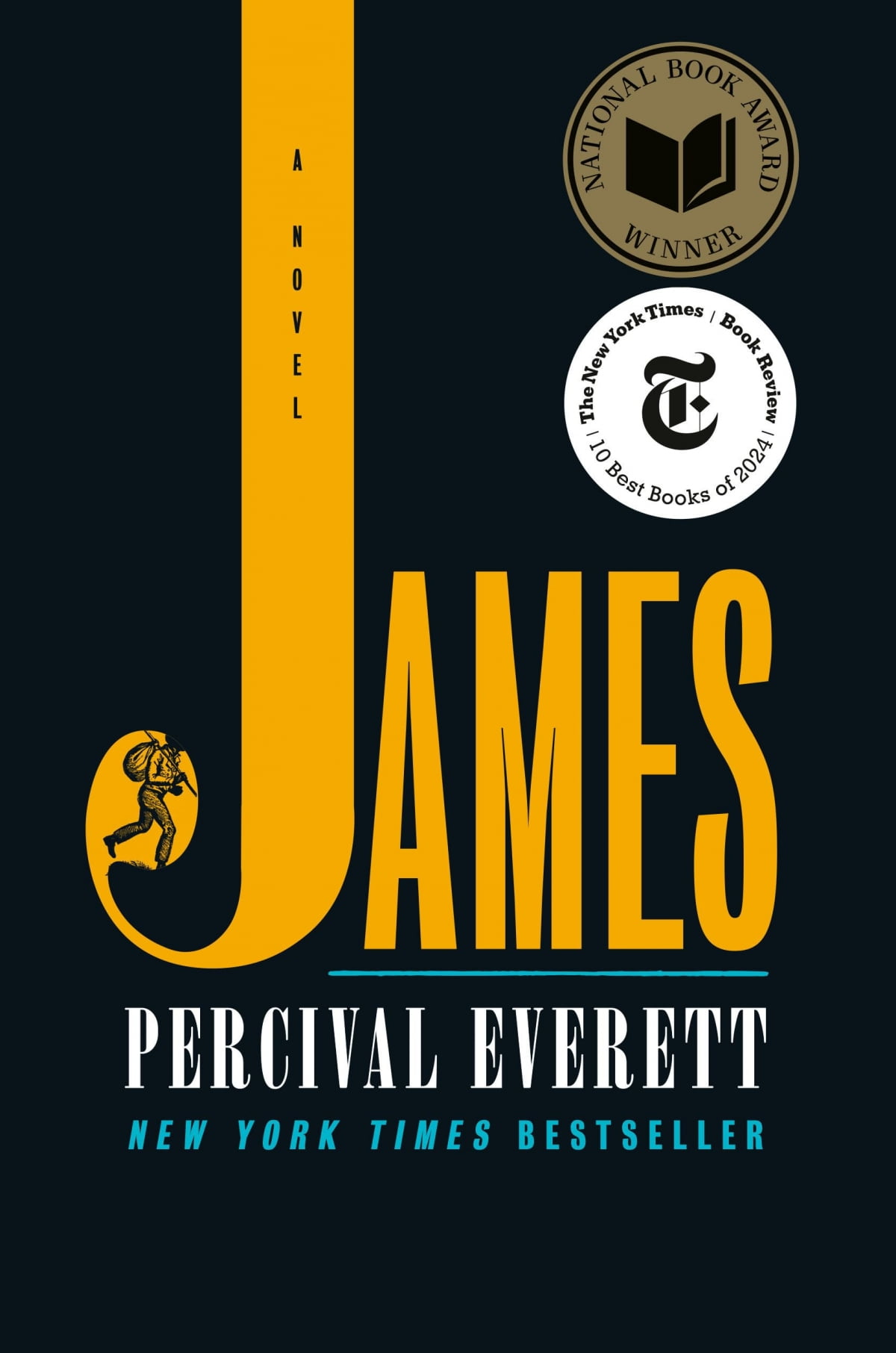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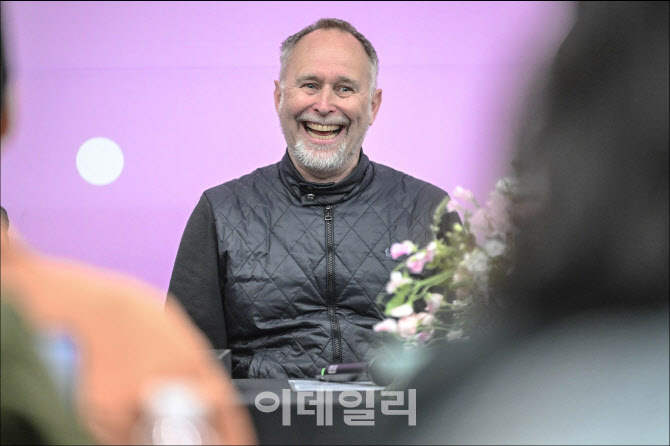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