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0년 잔혹사
딥페이크 앞세운
3세대로 수법 진화
"엄마 나 납치됐어"
알고보니 AI 음성
20년간 35만건
올 연간 피해액
처음 1조 넘을듯

"엄마, 나 납치됐어. 살려줘…." 지난 4월 지하철을 타러 가던 A씨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 속 딸의 목소리에 겁에 질렸다. 그는 '돈을 보내면 딸을 살려주겠다'는 납치범의 요구에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인공지능(AI)이 학습을 통해 만든 가짜였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처음 접수된 2006년 이후 20년간 정부는 140건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놈 목소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피해자와 가족 100명을 인터뷰하고 과거 20년간 발표된 정부 대책을 전수조사해 '보이스피싱 실태 긴급점검'에 나선 배경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발생 건수는 35만211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재산 피해는 작년까지 5조7136억원을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지난 19년 누적금액의 11%에 달하는 6421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연간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며 더 깊숙이 우리 사회 속으로 침투했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후반엔 전화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흉내내는 범죄자의 악행에 고령층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대포전화 개통을 방관한 통신사, 무용지물 탐지시스템을 갖춘 금융사,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정부 등 책임 있는 기관은 모두 "책임을 다했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수화기 바깥으로 울려 퍼지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수민 기자 / 김송현 기자 / 문광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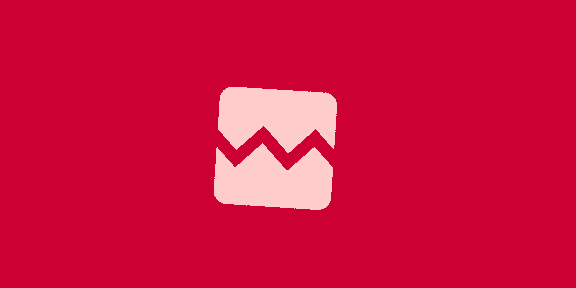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신문과 놀자!/디지털 세상과 정보]AI 시대엔 ‘문제해결-생각하는 힘’이 경쟁력](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8/04/132128708.1.png)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메탈’을 예술로 만든 오지 오즈본, 하늘 무대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8/04/132127123.4.jpg)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인하 유보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N.41075682.1.jpg)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로젠버그 차도가 없어, 복귀 불투명”…사실상 시즌아웃, 끝없는 키움 선발 고민 [SD 고척 브리핑]](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7/06/131945683.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