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더 많은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23일 서울 세계분쟁정상회의(Global Disputes Summit·GDS)에 참석한 국제분쟁 전문가들은 "미국 발(發) 불확실성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분쟁 해결 방식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GDS는 세계 1100여명의 국제중재 변호사·학자·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GDS는 국제분쟁 연구 단체다. 매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서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서울 소공동 센트로폴리스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열렸다.
전례 없는 美 무역 정책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분쟁 리스크가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도 미국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겨냥해 무역 정책을 폈던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상 처음이란 이유에서다.
박완기 리버티체임버스 변호사는 "중국에서 영업하거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관세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중국 당국도 예고 없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등 미국에 동조하는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을 위반할지 중국 법을 위반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대릴 츄 스리크라운즈 변호사는 "가령 한-중 합작법인이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사업구조가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업들이 기존 파트너십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면, 기업가치 평가나 현금 흐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무역 정책에 대응하는 기업의 선택지도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통상 계약을 맺을 때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을 예외 조항으로 둔다.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계약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다. 츄 변호사는 "많은 공급망 계약이 '가격에 세금·관세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는 만큼 위 조항들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했다.
"유예기간 동안 목소리 내야"
현실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한신희 쉐퍼드멀린 변호사는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단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불가항력이나 MAE를 이유로 소송이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90일 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한 변호사는 "90일 간의 유예기간 동안 관세 리스크 배분, 비용 조정, 계약 조항 명확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와 반도체 업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무역 질서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금은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시점이고, 사실상 바닥에 도달한 상태"며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3 weeks ago
4
3 weeks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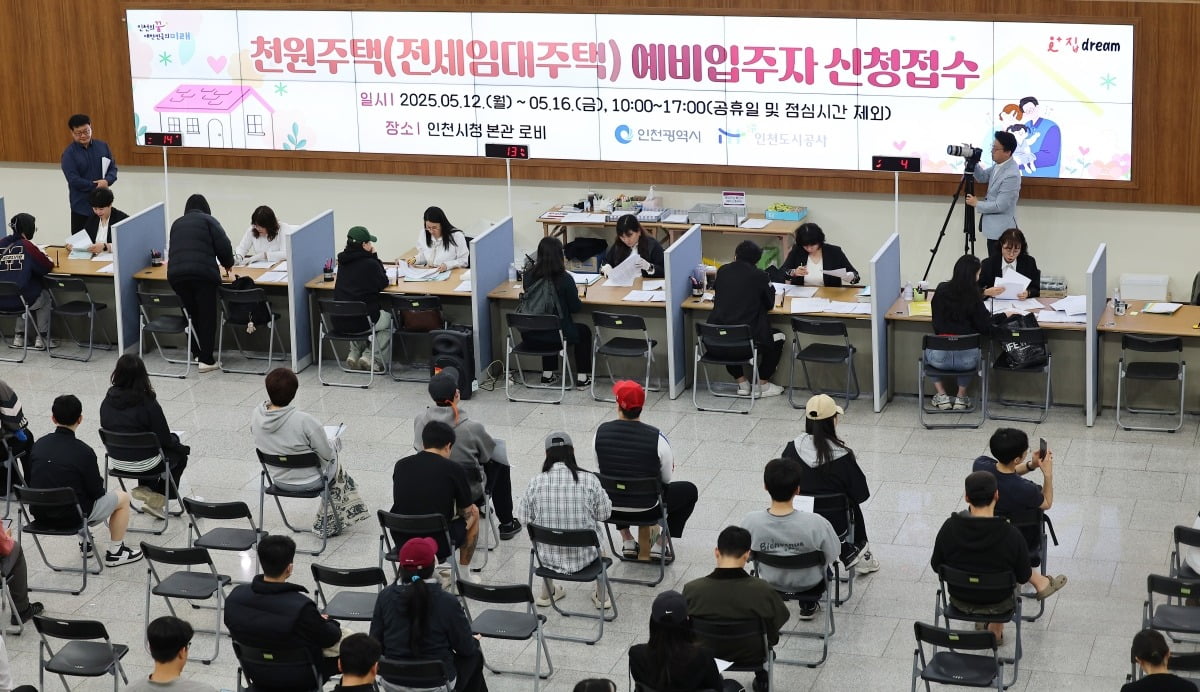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