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6일 매일경제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는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을 만나 청년정책의 한계와 청년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두 사람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만든 정책 틀에 청년을 맞추기보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뉴웨이즈(Newways)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들이 독립적인 정치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정치 스타트업이다. 2030 유권자들을 연결해 젊은 정치인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사진 제공=박혜민 대표]](https://pimg.mk.co.kr/news/cms/202505/06/news-p.v1.20250501.469fa0043f1142ee935d1e7b458134e4_P1.jpg)
박 대표는 “저출생·고령화, 노동문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웨이즈에서 진행한 ‘2030 표심의 정석’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근로 유연성, 지역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정책을 꼽았다. 신혼부부 출산 지원에 초점을 둔 현재 정책과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
청년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일·생활 균형 제도화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경력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둔 현 제도는 효과가 떨어진다.
![지난 30일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단체다. 2011년 대학 내 기숙사 확보 운동에서 시작해,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전세사기 예방 등 다양한 주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김송현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06/news-p.v1.20250501.4ba2e037124c4e7f81f11e11379e5b45_P1.jpg)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역시 청년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서 위원장은 “자가 마련만을 정답으로 보는 현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주체적인 생애 설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이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이 선거 주기와 비슷한 최대 4년으로 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이 늘어났다”며 전월세 세입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삶의 질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주거 문제는 개발 불균형, 지역 격차, 노동문제 등이 모두 얽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불안정한 주거로, 또 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 집을 주겠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수년간 실패해왔다”며 “청년의 삶과 기본적 사회 권리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사람은 오늘날 청년문제는 단일 영역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금의 사회 시스템 대부분은 여전히 1980년대 노동·결혼·주거 모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보완’이 아닌 구조적·장기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가 2030세대의 문제를 단순히 청년세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청년은 미래의 주체로만 불리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며 “차기 정권은 한국 사회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밤에 더 빛난다…경복궁 야간 개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41815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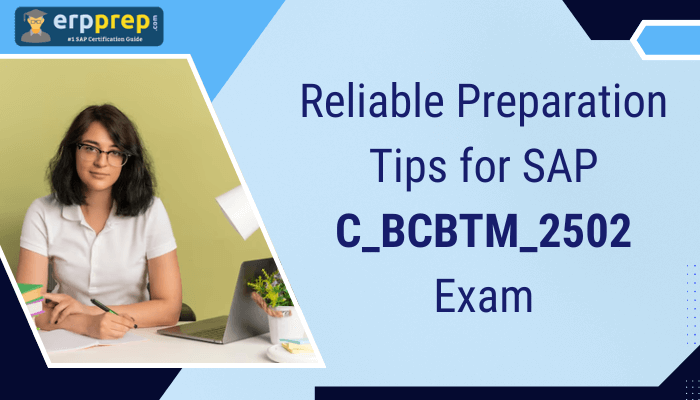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