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류의 고장인 전북 순창군 순창장본가에서 강순옥 식품명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우리가 먹고사는 데 쓰는 장(醬)은 말이여, 그냥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아니여. 그 속엔 우리네 삶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사람 사는 정이 들었는디. 그게 이젠 세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았다는 게 참말로 기쁘제”
전통 장 담그기의 산증인이자 순창 고추장의 대모로 불리는 강순옥 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5호)은 ‘장 담그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식을 들은 날, 한참을 울었다. 지난해 12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이 공식 발표한 이 소식에 장을 평생 담가온 강 명인은 누구보다 큰 의미를 느꼈다.
“내가 스무 살 안팎 때부터 장을 담갔는디, 그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콩 삶고, 띄우고, 장독대 닦고… 그게 다 배움이었어. 그 시절엔 누구나 장 담그는 법을 알고 있었제. 근디 요즘은, 집에서 장을 직접 담그는 집이 귀해져 불었어잉.”
‘장 담그는 문화’는 왜 세계가 보존해야 할 유산이 됐을까. 강 명인은 그 답을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오래, 따뜻하게 사람을 품어주는 맛. 그건 세상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지. 이 속에 한국 사람의 마음이 다 들었는디, 그걸 세계가 알아줘서 참말로 고맙제.”
유네스코가 높이 평가한 것도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이다. 장 담그는 일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세월을 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가정마다 장독에 부적을 붙이고 장이 익어가는 동안 집안의 평안을 비는 풍습, 장의 약효에 대한 믿음 등을 인상적인 문화적 요소로 평가했다.
자부심만큼 걱정도 크다.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다 끝난 거 아녀. 겉으로만 보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여. 지금처럼 공장서 찍어낸 장만 돌아다니면 진짜 장맛은 금방 사라지고 말제. 장은 사람 손으로 직접 담가야 살아 있는 거여”
강 명인은 등재 이후 더욱 살아 있는 문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인 교육,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장 체험 프로그램, 순창 고추장 축제 같은 현장 중심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산으로서의 의미도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마을 애들 불러다가 고추장 한번 같이 담가 보자 하믄,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허요. 그게 참 고맙고 기쁜 일이여. 아이들이 배우고 느껴야 이 문화가 이어지는 거지.”

 2 days ago
5
2 days ag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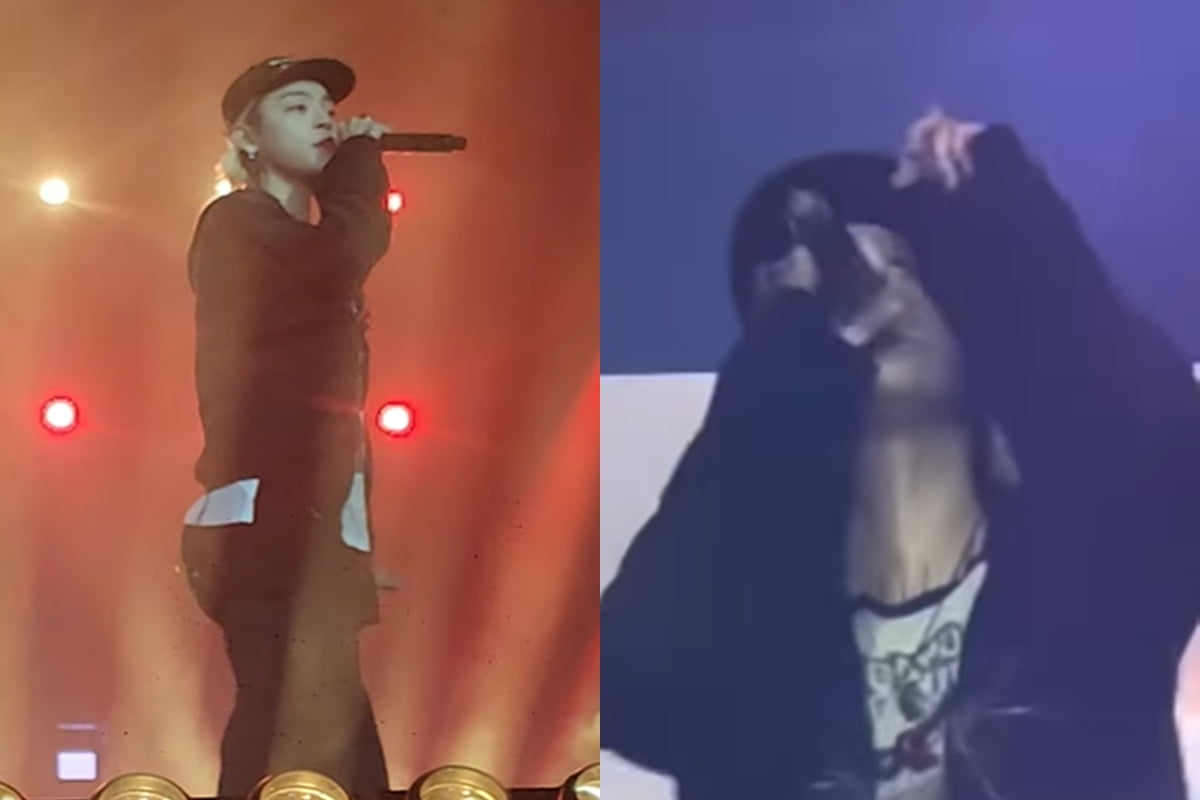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