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 '패왕별희'에서 본 경극 배우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다. 그의 손엔 종이로 만든 일본 전통 우산 '와가사'가 살포시 들려 있고, 금빛 자수가 수 놓인 형형색색 치마에선 한국과 동남아시아 전통 의상이 뒤섞인 듯한 이국적 기운이 감돈다.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아시아인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상상이 피어난다.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한 안은미컴퍼니의 신작 '동방미래특급'은 이처럼 한 단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아시아의 다채로운 얼굴로 무대를 열었다. 75분 동안 이어진 공연은 아시아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독창적인 하나의 몸짓으로 버무려낸 환상의 콜라주였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인 한국 대표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살아 움직이고 있는 아시아의 숨결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동안 아시아의 역동성을 도외시하고 그저 '신비한 세계'라는 낡은 이미지로 동양 세계를 소비해온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작년 10~12월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발리를 탐방하며 현지인들의 몸짓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했다. 그곳에 보존된 전통 춤과 이를 바탕으로 재해석된 현대적인 춤사위는 안은미의 몸을 거쳐 '아시아 예술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무대 위에 자유롭게 펼쳐졌다.
아시아 탐방을 함께한 무용수들은 발리 전통 무용 '레공 댄스'(Legong dance)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손놀림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필리핀 민속춤 '티니클링'(Tinikling)에 사용하는 대나무를 휘두르며 코어의 힘으로 무대를 껑충껑충 누비는 무용수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안은미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다. "몸이라는 문장, 춤이라는 언어, 그리고 아시아라는 거대하고 다층적인 텍스트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란 새삼 겸손해지는 행위다. 나는 모른다. 그렇기에 계속 걷고, 구르고, 부딪치고, 돌고, 춤출 수밖에."
안은미도 여러 차례 무대에 등장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독특한 아우라가 객석을 휘어감았다. 풍성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전동 휠을 타고 나타났을 때는 마치 생명을 관장하는 전설 속 여인과 같았다. 중국 광장무를 연상시키는 몸짓을 펼치다가 불쑥 나무판을 격파하는 장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연출도 즐기는 그의 여유가 돋보였다. 안은미와 18년 이상 함께한 무용수 김혜경의 존재감도 무대를 압도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절제된 힘을 직관하고 나면, 그가 안은미의 뒤를 이을 무용계의 아이콘이 될 것이란 예감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

공연은 후반부로 접어들어 신명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소룡으로 분한 무용수가 쌍절곤을 휘두르고, 귀여운 팬더 탈을 쓴 무용수가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일 땐 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즐기는 것이란 사실을 되새기게 된다. '한국의 춤사위는 언제쯤 나오려나' 아쉬움이 들 무렵, 무용수들은 강강술래를 추듯 서로 손을 맞잡고 공기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대를 누볐다. 때론 살풀이춤을 구현하듯 격한 에너지를 쏟아낸 이들은 공연의 마지막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붙들어맸다.

무대는 안은미가 직접 꾸몄다. 아시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은 쟁반 800여개와 개성 넘치는 의상 130여벌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이 같은 무대 디자인은 안은미 공연의 시그니처인 '짝짝이 양말'이 평범해 보일 정도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음악과 조명도 조연 이상의 역할을 했다.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밴드 이날치의 장영규는 전통 음악에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가미한 중독적인 음악으로 공연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공연은 단 사흘간의 여정으로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대신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파리 시립극장, 독일 베를리너 페스트슈필레 등에서 유럽 투어를 이어간다. 유럽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동방미래특급은 어떤 모습일지, 안은미의 또 다른 모험이 기대된다.
허세민 기자

 3 hours ago
1
3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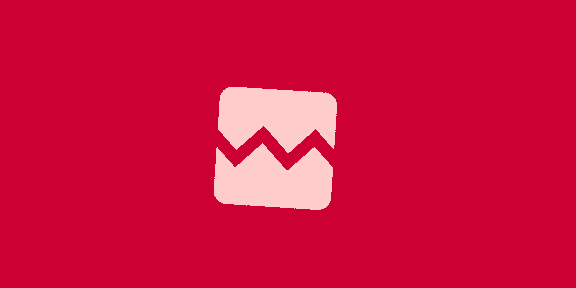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