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인구 과반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달고 산다. 현대인에게 피로와 불안, 과체중, 우울, 집중력 저하는 일상이다. 의학은 갈수록 정밀해지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아진 병원 시스템 속에서 더 많은 약을 처방받는데 왜 이런 걸까. 건강 콘텐츠는 쏟아지는데 왜 몸은 계속 무너지고 있을까.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굿 에너지>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이다. 저자 케이시 민스는 미국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한 외과의사다. 그는 어머니가 71세에 ‘운 나쁜’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포 에너지 장애’에 주목했다. 수년간 임상과 실천을 바탕으로 ‘대부분 만성질환은 세포 대사와 생체 에너지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책마을] 약과 영양제를 달고 살아도 계속 아픈 이유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40280147.1.jpg)
민스는 “문제는 병명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외과 레지던트 시절 진료한 환자들의 사례에서 그들이 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다시 찾는지 의문을 품으며 본질적 이해를 위한 세포 연구에 매진한다. 특히 어머니의 사망은 한 사람이 평생 그 많은 약을 처방받고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저자의 어머니는 평소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전 단계 약을 병원 처방에 따라 복용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은 증세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했다. 저자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타난 여러 증세가 세포 에너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음을 뒤늦게 알아챈다.
저자는 현대 의료의 함정이 증상을 따로 떼어놓고 진단한 뒤 그에 맞는 약만 처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식은 증상을 잠시 잠재울 수 있지만, 증상을 유발한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불완전한 치료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질병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신진대사 장애, 즉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자체의 붕괴엔 관심이 소홀하다고 꼬집는다.
저자는 병명은 달라도 그 뿌리엔 결국 ‘더 이상 좋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세포’가 있다고 주장한다.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 우울증과 치매가 생기고, 심장세포의 문제로 고혈압과 심장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생리불순과 난임도 난소세포의 문제로 본다.
이 책은 현대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후반부에는 대사 건강과 세포 에너지 회복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한다. 혈당 측정, 생체 시계 맞추기, 음식 선택 원칙, 수면 위생, 스트레스 관리, 생활 속 가벼운 불편을 통한 적응력 회복 등 다양한 방법을 망라했다. 특히 몸의 신호를 듣고, 조기에 개입해 치료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몸이 좋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4주 계획’과 영양소 중심의 식단 가이드, 레시피 등은 실천할 수 있게 상당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 일상에서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하다.
식사, 수면, 운동 등 생활 습관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거나 늘 피로하고 불안하고 빠지지 않는 살로 스트레스 받는 이들이라면 대사와 면역 작용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1 week ago
7
1 week ago
7
![장근석·오윤아 이어 진태현까지…갑상선암 발병 원인은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0269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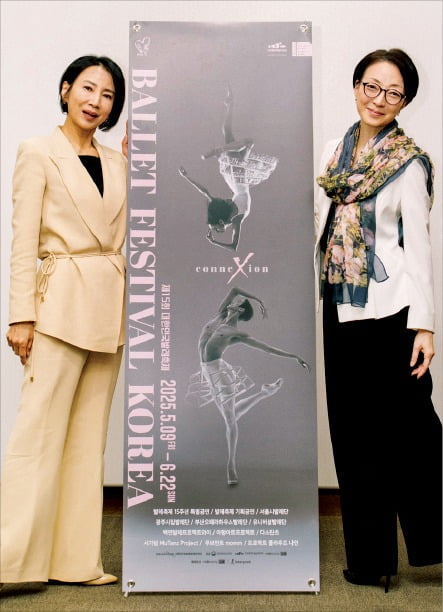




![[이 아침의 피아니스트] 공연 스케줄 빼곡한…가장 바쁜 피아니스트](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