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 조너선 케네디 지음 / 조현욱 옮김 / 아카넷 펴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 = NIAID-RML]](https://pimg.mk.co.kr/news/cms/202505/03/news-p.v1.20240822.b02e53238da84aec8dc578dd9e720278_P1.png)
지구를 인류가 지배한다는 생각은 인간만의 착각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췄던 사태만 봐도 ‘균’은 때로 총칼보다 치명적이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에서 글로벌 공중보건을 가르치는 저자는 “우리는 균으로 이뤄진 이 세계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첫 저서인 이 책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미생물이 5만년 지구 역사에 끼쳐온 영향을 펼쳐낸다.
인간이 미생물의 세계를 발견한 건 17세기다. 17세기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당시 막 발명됐던 망원경의 렌즈 순서를 바꾸면 아주 작은 사물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50년이 지나 네덜란드의 직물상이자 과학자였던 안톤 팍 레이우엔훅이 상품 품질을 검사하려고 렌즈를 들여다보다 자연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북적거리고 있는지 기록을 남겼다. 19세기 후반 루이 파스퇴르는 발효·부패에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런 일련의 발견과 발전은 곧 인간이 얼마나 주변적이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던 천동설을 깨트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인간이 수많은 동물과 같은 또 다른 종일 뿐이며 유인원과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고 본 찰스 다윈의 ‘진화론’ 등도 그렇다.

저자 역시 인간 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우월성’ 덕분이 아닌 ‘균’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많은 학자는 기원전 7만~3만년 사이에 호모사피엔스가 ‘인지 혁명’을 겪고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살아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살다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면역 체계를 획득했고 반면 다른 종들에겐 병원균을 옮겼기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로도 번성했다 사라진 문명마다 전염병이 있었다. 1524년 잉카제국을 강타한 천연두, 1545년 아즈텍제국에 유행한 코코리츨리라는 전염병 등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와 무관치 않았다.
인간과 동물의 이동이 바이러스·박테리아를 옮기며 기존 제국의 힘을 약화했으리란 것이다. 이렇듯 정복과 승리, 굴복과 패배의 역사 변곡점에선 균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사실 인류 역사는 미생물이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한국어판 책머리에 실린 컬러 화보 32컷은 주요 역사의 장면을 간략한 해설과 함께 보여줘 책의 서술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 다만 책에서 다룬 역사와 혁명들은 영국인 저자의 시각을 따라 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육성재, '김지연♥' 자각했다 [귀궁][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5/2025050407241450193_1.jpg/dims/optimize/)
![장동민, '바퀴벌레' 먹었다 "바삭바삭해" [독박투어3]](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5/2025050407154035192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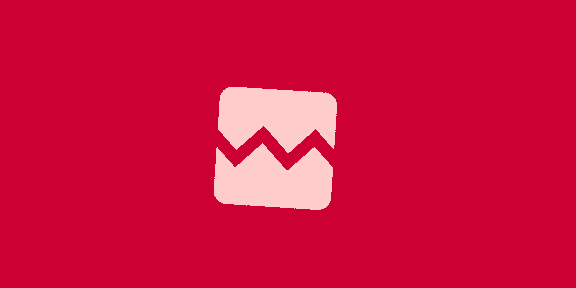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