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블루는 예로부터 귀한 안료였다. 원료가 희소한 데다 정제 과정도 어려워서다. 또 짙은 푸른색은 왕실을 상징하는 귀족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로열블루’로 불렸다. 고온에 소성해도 푸른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더 귀하게 여겨졌다.

그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 브랜드가 덴마크의 로얄코펜하겐이다. 블루 풀 레이스부터 하프 레이스, 플레인, 메가, 엘레먼츠, 팔메테 등 다양한 라인업이 유행을 타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다. 새하얀 도자기에 푸른색 안료를 손으로 그려 넣은 왕실 도자기를 하나씩 수집하는 마니아가 많은 이유다.
로얄코펜하겐이 250주년을 기념해 블루페인팅 워크숍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소비자가 22㎝ 크기의 블루메가 초벌 접시에 채색해볼 수 있는 행사다.
지난달 30일 미디어데이에서는 29년 경력의 베리카 젤체브 장인이 페인팅 시연을 했다. 초벌 접시에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가이드 선이 있어 그 위에 붓으로 푸른색을 입히면 되는 작업이었다. 젤체브 장인은 “선을 그려 넣는 붓, 굵은 선과 면을 채색하는 붓을 번갈아 사용하면 된다”며 “과감하게 그려야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아주 빠르게 선과 면을 채워 넣었다.
하지만 실제 체험해보니 쉽지 않았다. 접시가 편평하지 않고 굴곡이 있는 데다 가장자리는 올록볼록하게 입체감이 있어 붓이 자꾸 삐뚤게 움직였다. 코발트블루 물감에 물을 적당히 섞어 원하는 농도를 맞추는 것도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다. 장인의 도움을 받아 물감 농도를 맞춘 뒤 붓으로 과감하게 채색해 나갔다. 장인은 5분도 안 걸린 작업인데 20여 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의 묘미는 접시 뒷면에 적어 넣는 자신만의 이니셜이었다. 로얄코펜하겐 브랜드를 상징하는 파도 무늬 세 줄을 왼쪽에 그려 넣은 뒤 오른쪽에는 원하는 문구, 그림, 이니셜 등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좋아하는 문구인 ‘Carpe Diem’(현재를 즐기라는 뜻의 라틴어)을 조심히 그려 넣었다. 서툴긴 했지만 나만의 접시를, 그것도 로얄코펜하겐 본사에서 재벌로 구워 다시 보내준다니 무척 만족스러운 체험이었다.
블루페인팅 워크숍은 오는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세 번 열린다. 15만원대에 판매되는 블루메가 접시에 그림을 그려보는 비용은 7만원으로, 네이버예약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2 days ago
4
2 days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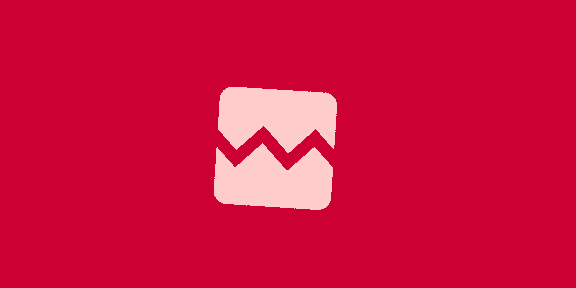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