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1금융권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똑같이 1억원으로 맞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금리 찾아 예금 대이동?
금융의 생명은 '신뢰'다.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 파산 등을 맞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일정 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는 뜻이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까지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모든 금융권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조치를 한시적(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으로 시행했다. 2001년 다시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쭉 유지해 왔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데도 예금보호한도는 너무 오랫동안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한국은 1.2배 수준으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보다 낮다. 이런 점을 반영해 24년 만에 한도 상향이 이뤄지게 됐다.
예금보호에는 '보험'의 원리가 활용된다.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꾸준히 보험료(예금보험료)를 거둬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쌓아뒀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에게 대신 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료는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내게 돼 있다. 현재 은행은 0.08%, 금융투자·보험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0% 등으로 매겨져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A은행에 몰아서 예금했는데 이 은행이 망했다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B은행에 3000만원, C은행에 3000만원으로 나눠서 예금했는데 두 은행 다 문을 닫았다면, 한도를 넘지 않아 모두 보호 대상이 된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000만원 쪼개기' 불편 줄어들 듯
다만 이 과정에서 자금 시장에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릴 경우 채권 시장이 출렁일 여지도 있다.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비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험료를 올리면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현 수준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2028년께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7 hours ago
2
7 hours ago
2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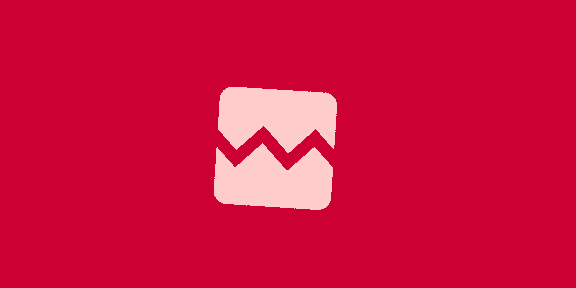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