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룡사 9층 목탑을 품은 듯한 모습의 경주타워는 경주의 랜드마크다.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꼭 가봐야 할 경주의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한 건축가에게는 상처를 안겼다. 200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물 설계 공모전에 출품한 설계안을 무단 도용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12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건축가는 세상을 떴고, 딸은 설계자의 이름을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설계자) 유동룡'. 경주타워 바닥돌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배경이다.
유동룡은 본명보다 예명 '이타미 준(伊丹潤)'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 건축가다. 제주 '포도호텔', '방주교회'와 일본 '석채의 교회', '먹의 집', '여백의 집' 등을 남겼고,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지만 한국 이름을 간직한 '경계인'이기도 했다.
최근 출간된 <이타미 준 나의 건축>은 이타미 준 본인의 글을 통해 그의 삶과 건축 세계를 들여다본다.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이나 대담 등 흩어져 있던 원고를 그의 딸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대표가 정리해 엮었다. 유 대표는 제주 유동룡미술관의 관장을 맡고 있다.

책에는 이타미 준 건축물들의 탄생 비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훗카이도현 도마코마이시 남부, 구릉에 둘러싸인 평원에 지은 '석채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다. "처음 현지를 둘러보고 이 풍경에 대항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건축, 나아가 자연적인 건축이어야 한다고 직감했다. 겨울 추위가 모질고 망망한 이 땅에서 인간의 손때가 묻은 것은 한겨울 지나면 볼품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교회는 겨울 한파를 견디는 동시에 인간의 강한 염원을 형상화했다.
종묘를 비롯한 한국 전통 건축물, 가구, 그릇에 대한 감상을 담은 글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애틋한 시선과 건축가로서의 미학적 평론을 오간다. "지난 4월, 건축 관계 일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다. 나는 최대한 일을 제쳐놓고 밤낮으로 골동품 가게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녔다. (…)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조선시대의 가구와 벼루를 샀다.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집에 갈 택시비가 없었을 정도니, 그간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그때 산 가구와 벼루는 좁은 내 작업실에 자리해 유유히 빛나면서, 다른 것들의 접근을 불허하는 긴장감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적 건축가가 일의 힘듦을 토로하는 부분은 괜한 위안을 준다. 다만 그는 드로잉 수첩 여백에 혼잣말을 적을 때조차 불평은 적지 않는다. "불평하는 말은 건축을 위한 종이 위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거장과 범인을 가르는 선인 걸까.
이타미 준은 평생 컴퓨터 설계 대신 아날로그 드로잉을 고수했다. 스스로 '마지맘 남은, 손의 건축가'라고 여겼다. 이 고집에는 '바람의 건축가' 이타미 준의 건축 철학이 녹아 있다. "건축의 근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인간의 생명과 강인한 염원을 담지 않는 한,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인간의 온기와 생명을 근저에 담는다. (…) 그 지역의 풍토와 '바람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언어를 듣는 것, 그 점이 중요하다."
건축 거장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건축 이야기 외에도 두부의 매력을 찬양하는 소소한 글이나 김중업, 시라이 세이이치 같은 역사적 건축가들과 교류한 일화가 흥미롭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4 days ago
8
4 days ago
8
![[포토] '2025 한돈런' 이하평과 윤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63.jpg)
![[포토] '2025 한돈런' 베스트드레서 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62.jpg)
![[포토] '2025 한돈런' 대성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61.jpg)
![[포토]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시즌6 ‘캠퍼스 챌린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43.jpg)
![[포토] 코카-콜라, GS25 반값택배와 ‘원더플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42.jpg)
![[포토] 농협유통-남서울농협, 고품질 축산 협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37.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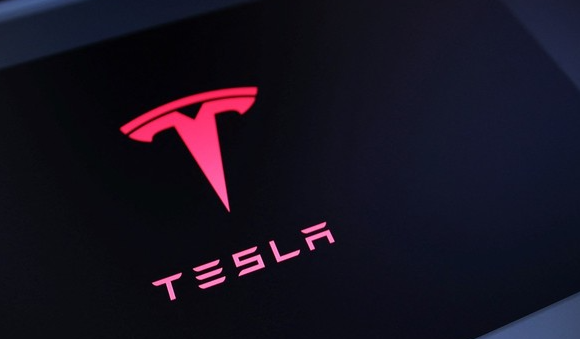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