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공공공사 78%가 '저가낙찰'… 민간은 26%
대통령 "비용 아끼려 안전미비 바보짓" 또 기업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영 기자 / 성승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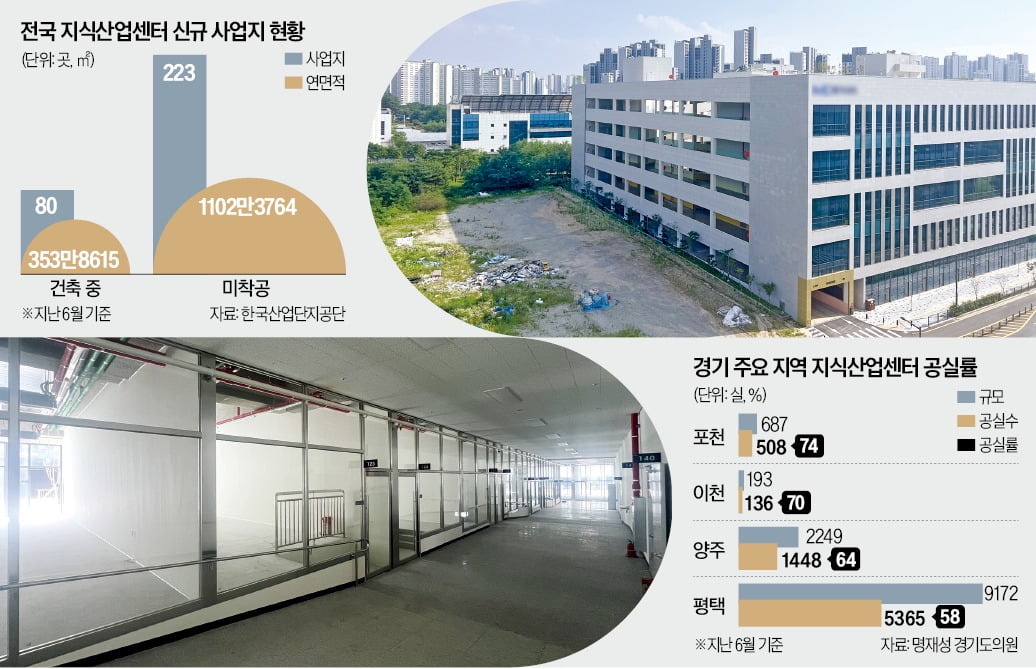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컨콜 종합] 넷마블, 2Q 영업익 1011억 ‘호실적’…하반기 신작 7종 출격](https://static.mk.co.kr/facebook_mknews.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