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하면 스타인웨이, 바이올린하면 스트라디바디우스가 명기 중의 명기로 꼽힌다. 녹음 작업을 하는 이들에겐 노이만이 그렇다. 프랭크 시나트라, 비틀즈, 마이클 잭슨 등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거쳐갔던 게 노이만의 콘덴서 마이크다. 96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음향기기 명가 노이만의 야스민 리처스 최고경영자(CEO)를 서울 동숭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단독으로 만나 마이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by_이주현 기자

마이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손에 쥐는 마이크는 다이나믹 방식이다. 내구성이 강하고 큰 음압에도 잘 견뎌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인다. 전문가가 녹음실에서 쓰는 마이크는 콘덴서 방식이다. 외부환경에 민감하지만 고음역대의 작은 소리도 잡아내 초정밀 녹음이 가능하다. 노이만은 1928년 세계 최초로 상용 콘덴서 마이크를 개발한 업체다. 이 업체가 1949년 만든 콘덴서 마이크 모델인 U47은 오늘날 800만원대에 거래될 정도의 명작으로 꼽힌다. LP 앨범 수집가에게 노이만은 소리를 디스크에 새기는 장비인 커팅 레이스를 제작했던 회사로도 유명하다.
“한국 음향 엔지니어와 소통 잦아져”
콘덴서 마이크는 악기만큼이나 섬세하다. 보컬 성별이나 악기 구성은 물론 공간 크기에 따라 최적의 마이크 모델이 달라진다.
“음성 녹음을 정확히 하고 싶을 땐 조용한 방에서 진동판이 큰 마이크를 써야 합니다. 반면 컴퓨터 소음이나 실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는 경우엔 작은 마이크를 써서 잡음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죠.”
이러한 콘덴서 마이크 특성은 노이만 같은 마이크 명가가 노래방 시장을 공략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리처스 CEO는 “노래방은 사람들의 환호, 배경음 등 다양한 소음이 있는 곳이라 잡음도 포착하는 콘덴서 마이크를 쓰기 어렵다”며 “더구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듣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노이만이 전통적인 녹음 시장만 겨냥하는 건 아니다. 유튜브로 인해 확산된 개인 스트리밍 방송 시장은 이 회사가 주목하는 새 먹거리다.
“스트리밍 목적으로도 콘덴서 마이크를 다루려는 고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환경도 스튜디오 녹음 환경과 비슷합니다. 한국 시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작지만 영향력은 상당하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서구 사회에 보급되면서 노이만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의 클래식 음악,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영화 등 각계에서 녹음 수요가 커지자 한국의 음향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노이만은 생성 인공지능(AI) 도입을 놓고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생성 AI가 음성 보정과 음향 제작에 쓰이는 요즘 분위기를 고려하면 뜻밖이다. 아직까지 AI는 고품질 마이크가 없는 고객들이 그 대안으로 쓰는 정도라는 게 노이만의 판단이다. 리처스 CEO는 “AI로 녹음을 손보지 않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길 바라는 고객들의 의견이 현재는 더 많다”며 “잡음 제거에 AI를 쓸 수 있겠지만 선명한 원본을 담길 바라는 현장의 요구 상 (AI로) 음색을 추가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AI 대신 있는 그대로의 소리에 집중”
노이만이 눈여겨보는 혁신은 따로 있다. 앞으론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녹음본을 수정하는 원격 작업이 가능해질 것라는 예측이다. 그는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실제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와 똑같아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음향 엔지니어가 스튜디오가 아닌 집에서도 녹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티스트가 해외 투어 중 믹싱 작업을 확인하는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리처스 CEO는 노이만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젠하이저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시작해 중화권 관리직을 거쳐 지난해 노이만 CEO 자리에 올랐다. 노이만은 1991년 독일 음향기기 업체인 젠하이저에 인수된 뒤 스피커, 헤드폰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음악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는 만큼 노이만도 다채로운 관점, 국제적 경험, 여성·남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려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신뢰하고 아티스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죠.”

이주현 기자

 4 days ago
4
4 days ago
4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4일 별자리 운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400013.jpg)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4일 띠별 운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40001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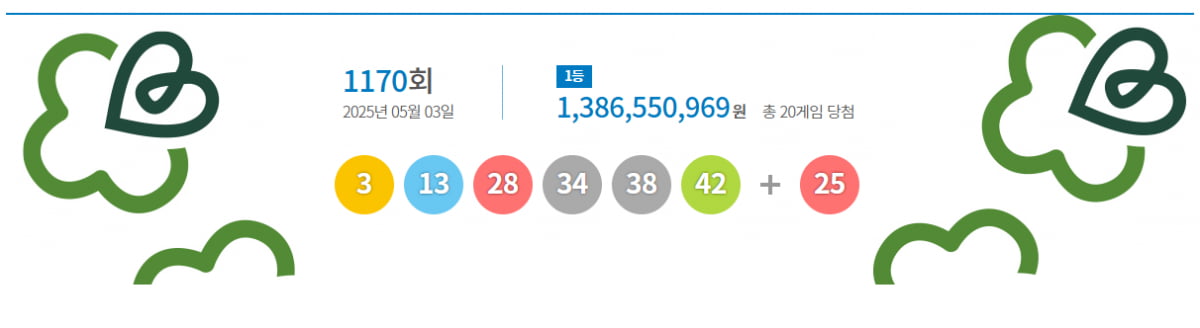


!['뿡뿡' 방귀 뀌면서 걸었더니…'대박 효과' 나타났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99.17717224.1.jpg)
!["아내 죽고 세상 무너졌다"…'비운의 천재'가 잊혀진 이유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62864.1.jpg)
![[포토] 푸마, 수원삼성블루윙즈 창단 30주년 유니폼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27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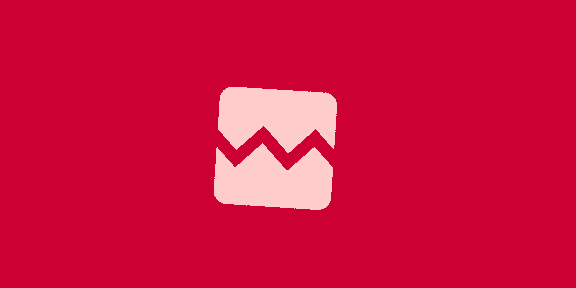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