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왜 인간은 한쪽에서는 더욱 큰 비행기와 대형 폭탄을 만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살기 위해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걸까요. 매일 전쟁을 위해 수백만달러라는 거금을 쓰면서 왜 의료시설이나 예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돈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게 남아돌아 썩는 일도 있다는데, 왜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안네의 일기> 중 일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 은신처에 숨어 있던 안네라는 소녀는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일상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일기에는 한 소녀의 생에 대한 의지가 담긴 문장이 이어진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소식으로 우리는 민족 단위 혹은 특정 집단 단위로 누가 희생됐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그 단위를 풀어헤쳐 보면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의 삶과 이야기가 존재한다.
전쟁, 테러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메모리얼(추모관)의 기억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대 메모리얼에는 이름이나 사진 나열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된 개인에 대한 기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등장했지만 후대가 기억해야 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대체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돼 전달된다. 거기에 개인의 이야기는 지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방식과 다른 메모리얼이 2016년 3월, 폴란드의 작은 마을 마르코바에 등장했다. ‘울마 가족 추모 박물관’이다. 1944년 3월 24일에 울마 가족과 이들이 숨겨주던 유대인들까지 17명을 나치가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곳은 홀로코스트 기간에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구출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한 가족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메모리얼과는 다른 기념 방식을 보여준다.
이곳은 대표하는 기념 대상이 가족인 점 그리고 메모리얼이 있는 마을의 다른 집들과의 조화를 고려해 ‘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박공 형태 매스로 설계됐다. 이 박공 형태는 내부까지 연계돼 방문객이 계속 집에 대한 인상을 갖고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전시 공간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문객을 30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작아서(117.3㎡) 집의 인상을 극대화한다.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과 폴란드인이 맺은 관계에 대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전시 공간의 중앙에는 울마 가족의 집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5m×8m의 직육면체 박스로 구현된 이곳은 콘크리트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한 밖의 전시 공간과는 달리 마루, 목제 가구 등을 사용했다. 울마 가족에게 집중된 전시 공간으로, 문서와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박스는 건물 파사드에 크게 자리한 유리 벽(입구를 겸하는)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박스 외면에 새겨진 가족의 이미지를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집 안에 가족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돼 기려야 하는 대상에게 쉽게 이입할 수 있다.
울마 가족 추모 박물관은 이처럼 특정 집단을 기념 대상으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희생된 한 ‘가족’에게 집중한다. 그들을 기념하고 여기에서 폴란드인과 유대인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는, 지금까지의 메모리얼과는 반대되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 사건에 대한 이런 미시적 접근은 규모는 작을지언정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모리얼을 건립할 수 있게 했고,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밤이 되면 이 집(메모리얼)의 앞마당은 반짝거리는 불빛으로 가득 찬다. 이 불빛은 유대인을 돕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폴란드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다. 마치 집을 향해 모여드는 것처럼 나열된 이름들을 보고 있으면 더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못다 한 삶에 대한 의지가 각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만 같다. 어쩐지 그리운 감정마저 느껴지는, 거대한 역사 앞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적 경험이다. 오직 개인의 이야기 안에서만 가능한, 공감을 통한 새로운 추모 공간의 개념이다.
배세연 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2 weeks ago
6
2 weeks ago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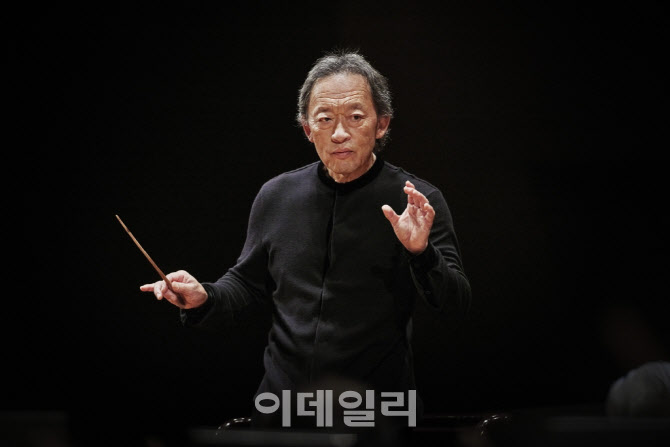



![[마켓인]2호 미술품 조각투자 내놓는 예스24 자회사…기대수익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1201149.jpg)
![[포토] 롯데물산, 쇼 미 더 오피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1201193.jpg)
![[이 아침의 작곡가] '위키드 돌풍' 일으킨 뮤지컬계 천재 작곡가](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