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에서 선보인 푸치니 ‘나비부인’은 2025 시즌 프로그램 발표 때부터 화제였다.
지금 시대 가장 바쁜 테너 중 한명인 조나단 테텔만(Jonathan Tetelman)이 핑커톤을 맡고, 엘레오노라 부라토(Eleonora Buratto)는 그녀의 대표적인 배역 중 하나인 초초상으로 바덴바덴 무대에 데뷔해 화제가 되기도 한 공연이었다. 또 연출 역시 이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다고 평가받았다. 다비데 리베르모어(Davide Livermore)는 이미 라 스칼라 극장의 시즌 개막 공연을 세 번이나 맡은 연출가이며, 이번 ‘나비부인’에서는 전통적인 무대 연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단순한 비디오 프로젝션이 아니라, 오페라 속 아이의 그림이 무대 위 현실로 구현되는 등 아이의 내면세계에 치중해 새로운 해석을 담았다. 이런 시각적인 장치들을 오페라가 가진 이야기와 조화롭게 결합해 오페라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출가의 말처럼 오페라 연출이란 악보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무대였던건 베를린필이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 마지막 무대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2025년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를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한다. 푸치니 ‘나비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이들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다. 예술감독 베네딕트 슈탐파(Benedikt Stampa)는 이를 ‘작별 파티’라고 표현하며, 비록 2025년 부활절을 끝으로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콜라보는 종료되지만 기쁘게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베를린 필하모닉의 공연은 다른 형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축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Klaus Mäkelä)가 2025년 부활절 축제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메켈레와 더불어 독일 출신의 지휘자 요아나 말비츠(Joana Mallwitz)가 부활절 축제의 음악 감독직을 함께할 예정이다. 메켈레가 축제에 합류하면서 2026년부터는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oyal Concertgebouw Orchestra)가 프로그램의 주축이 된다. 이들은 벌써 브루크너 교향곡 8번, 말러 교향곡 5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베를린으로 돌아온‘나비부인’
바덴바덴 부활절 축제를 장식한 ‘나비부인’이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다시 장소를 옮겨, 베를린 시민들에게도 푸치니 ‘나비부인’을 선보였다.

사실 오페라를 전문으로 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닌 베를린필이 오페라를 선보인다는 것 자체도 귀한 경험이었다. 빈 필하모닉이나, 같은 도시에 있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는 달리 이들은 콘서트 무대에 주로 오르는 오케스트라다. 오페라를 연주하는 베를린필은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역시 관전 포인트였다. 더군다나 이들과 함께할 지휘자가 키릴 페트렌코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베를린필을 이끌며 콘서트 무대에 주로 오르지만 키릴 페트렌코는 베를린 코미세오퍼와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음악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오페라로 커리어를 쌓았던 지휘자다.
이제 공연의 막이 오르고 베를린에서도 ’나비부인‘이 연주됐다. 우선 이번 베를린 무대에서 가장 놀라운건 조나단 테텔만이 맡은 미국 해군 장교 벤저민 F. 핑커톤이었다. 슈퍼스타의 탄생이었다. 조나단 테텔만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테너 중 하나다. 이미 세계 최고의 축제들을 함께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함께한 ‘나비부인’도 성공적이었다. 올해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 중 하나인 빈 슈타츠오퍼에도 데뷔했다.

첫 시작부터 놀라웠다. 핑커톤과 샤프리스(타시스 흐리스토야니스)가 부른‘Dovunque al mondo(세상 어디든지)’는 시작부터 오늘 공연이 얼마나 수준이 높을지 가늠하게 했다. 이 장면은 테너와 베이스가 일본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장면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만큼 두 가수들의 성부도 노래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데, 이 두 가수는 오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남성 이중창을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두 인물의 성격이 처음 제시되는 장면이라 오페라 전체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여기서 테텔만은 탄탄한 고음을 가진 동시에, 부드럽게 노래할 땐 자연스럽고 깊은 ‘다정함’이 흘러나와, 어떻게 핑커톤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해 나갈지 관객들에게 각인시켰다. '나비부인' 속 핑커톤은 여러 행동을 종합할 때 분명 행실이 좋지 않은 나쁜 남자였지만, 테텔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관객들을 설득했다. 특히 3막에서 보여준 연기와 절규가 핑커톤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전달하는 순간적인 표정들과 연기덕분인데, 이런 그의 능력으로 관객들을 오페라 속으로 순식간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이 젊은 가수는 어떻게 이런 역량을 발휘하는걸까? 테텔만이 2011년에 성악을 그만두고 뉴욕의 클럽에서 DJ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생각났다. 테텔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험은 단순한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청중과의 즉각적인 교감과 몰입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히는 계기가 되었던건 아닐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감정 전달력과 생생한 현장감이 놀라웠다.
실제로 DJ는 대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음악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일텐데, 이러한 감각이 오페라에서도 신선하고 현대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 청중과의 심리적 거리마저 좁히는 강한 몰입감을 만들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에너지라, 듣는 내내 압도되었다.
초초상을 맡은 엘레오노라 부라토는 테텔만에 맞춰 완벽한 앙상블을 이뤄냈다. 이미 바덴바덴 축제때부터 여러 회차를 맞춰온 호흡이었다. 1막의 ‘Viene la sera(저녁이 다가오고)’는 그 절정이었다. 두 가수 모두 빈틈이 없었다. 서로의 음악을 정확히 이해하고 , 예측하고 노래를 주고 받았다. 완벽한 흐름에 감동은 덤으로 따라왔다. 뿐만 아니라 ‘Un bel di vedremo(어떤 갠 날)’,‘Scuoti quella fronda di ciliegio(벚꽃가지 흔들어 꽃잎을 깔고)’등 주요 아리아에서 안정적인 발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다양한 캐릭터의 초초상을 잘 표현했다.
2막과 3막에서 부라토가 보여준 초초상의 다양한 캐릭터는 ‘그녀가 지금까지 맡았던 배역 중 초초상만큼 잘 어울리는 배역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한사람의 퍼포먼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톤이었다. 공연장 안 모든 관객들은 무대가 모두 끝나고 그녀가 등장할 때 기립해 환호했다. 엘레오노라 부라토는 현장의 반응에 감동하고 울컥하는 모습이 객석에서도 보였다.
오페라 속 또다른 주인공,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지막으로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반주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페트렌코는 가수들과 오케스트라를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계에 가둬버리고 통제했다. 아름다운 구속이었다.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치열한 분석 덕분이었다. 키릴 페트렌코는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마저 연구했을 정도로 자세했다. 인수분해를 연상하게 할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나비부인’이었고, 이러한 정밀함이 ‘나비부인’이 가진 뜨거운 드라마와 아주 잘 결합되어 푸치니 작품이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가진 음악인지 알려주었다.

거기에다가 베를린필은 모든 단원이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다. 말그대로 전문가들의 집합체다. 이건 베를린필이 가진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모든 악기 하나하나가 홀로 무대에 서도 될 만큼 뛰어난 예술가들이다. 덕분에 ‘나비부인’은 더욱 짙은 드라마가 되었다. 단원들이 만드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생생한 캐릭터였다. 마치 하나하나의 등장인물처럼 움직였다. 가수들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개별 악기 모두가 ‘나비부인’에 등장하는 또다른 캐릭터가 된 것이다.
베를린필의 이전 감독인 사이먼 래틀 시대에선 보기 드문 순간이기도 했다. 사이먼 래틀이 현대음악에 집중하며 날카롭고 예리한 베를린필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키릴 페트렌코는 취임 이후 콘서트 오페라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2022년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The Queen of Spades)’, 2023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Die Frau ohne Schatten)’, 2024년 ‘엘렉트라(Elektra)’ 등을 지휘하며 오페라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2025년엔 라흐마니노프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Francesca da Rimini)’와 푸치니의 ‘나비부인(Madama Butterfly)’까지 무대에 오르며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페라를 가장 잘 하는 지휘자 중 하나가 베를린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베를린필은 이제 콘서트 무대 뿐만 아니라, 오페라도 가장 잘 하는 오케스트라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허명현 음악 칼럼니스트

 1 week ago
8
1 week ago
8
![장근석·오윤아 이어 진태현까지…갑상선암 발병 원인은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0269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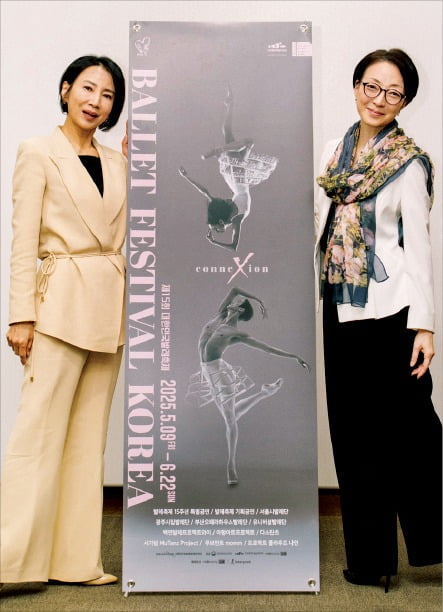


![[이 아침의 피아니스트] 공연 스케줄 빼곡한…가장 바쁜 피아니스트](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