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가 루게릭병 환자를 다시 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의 제목입니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일명 루게릭병 환자인 브래드퍼드 스미스가 만든 9분42초짜리 영상(사진)입니다. 루게릭병은 근육조절 신경이 퇴화해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는 병입니다. 스미스 역시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지마비 환자로, 말을 할 수 없고 자가호흡도 어렵습니다.
그는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스미스는 영상 속에서 미국 뉴럴링크의 ‘텔레파시’와 이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만든 영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뉴럴링크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BCI는 뇌의 신호를 읽어 말이나 신체 동작을 거치지 않고 기계에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텔레파시는 뇌에 전극을 심는 전차 칩입니다. 미국 화폐 25센트 동전 크기에 전극이 달려 있죠. 스미스는 텔레파시를 이식받은 세 번째 환자입니다. 생각을 통해 커서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24개의 전극에서 수집한 신호를 블루투스로 컴퓨터에 전송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합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대화 앱이 발병 전 목소리가 담긴 영상에서 목소리를 따와 인공지능(AI)으로 목소리를 복구했습니다. 스미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목소리로 변환해 직접 말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BCI를 통해 목소리를 찾은 환자는 또 있습니다. 지난 3월 ‘네이처 신경과학’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20년간 사지가 마비되고 언어능력도 상실한 47세 여성 환자 ‘앤’이 BCI를 이용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머리에 붙인 센서가 환자의 신경신호를 0.08초마다 포착해 문장을 읽거나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밖에 BCI를 활용해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하거나, 시각 장애를 겪는 환자의 시력을 되살리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두 연구·임상 중인 기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BCI를 활용한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특히 뇌를 열고 칩을 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센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신경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환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어 폭넓은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1 day ago
3
1 day ago
3
![추억의 '블랙베리' 사라진 줄 알았는데…'깜짝 부활' [강경주의 테크X]](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35406.1.jpg)
![5연패 DK, 11연패 DN…이번 주말엔 웃을까 [이주현의 로그인 e스포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2874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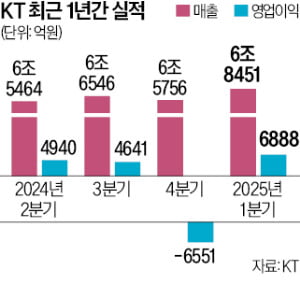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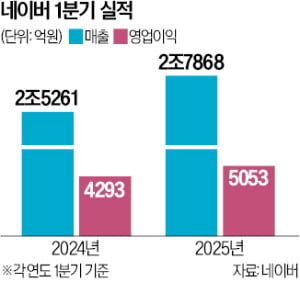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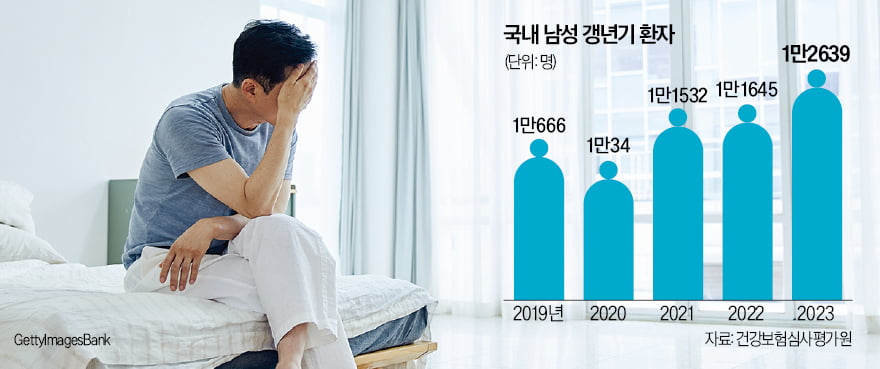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