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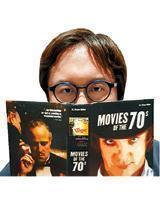
이 영화는 두 가지가 놀라워요. 첫째는, 이걸로 영화가 끝난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카메라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찍는단 사실이죠. 아웃포커스의 흐릿한 화면에는 등장인물의 눈 코 입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아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도 61분이라는 짧은 러닝 타임을 통해 이 영화는 관객을 구원하죠. 당시 상영관에는 “영화에 나오는 침침하고 뿌연 화면은 감독의 의도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어요.
‘진짜란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탐구해온 홍상수로선 감독의 의도가 담긴 화면 초점까지도 해체시킴으로써 영화 언어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를 한 듯한데, 이 영화를 초청한 베를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홍상수 감독의 시적 비전을 새로운 스타일로 전달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어요. 그러나 이런 신묘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일반 관객은 “안경 안 써도 잘 봤네요” “물안경 쓰고 보는 거 추천합니다” 같은 반응을 관람 후기로 남기기도 했죠.
[2] 예술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도, 도도 되죠. 예술은 창조 행위이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를 이미 예술로 여기니까요.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끈 자크 리베트 감독의 ‘누드모델’(1991년)을 볼까요?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이 영화는 러닝 타임부터 걸작의 티를 팍팍 내요. 238분, 무려 4시간이죠. 내용은 이래요. 위대한 노화가 ‘에두아르트’를 동경해온 젊은 화가 ‘니콜라’와 그의 아내 ‘마리안느’가 노화가의 집을 방문해요. 노화가는 창작의 열정을 잃고 붓을 놓은 지 오래죠. 젊은 화가의 육감적인 아내를 마주한 뒤 메말랐던 예술욕이 불끈 솟은 노화가는 그녀를 모델 삼아 누드화를 그려요.
이 영화도 두 가지가 기막혀요. 첫째는, 상영시간 4시간 중 3시간 동안 에두아르트가 누드화를 그리는 과정만 보여준다는 점. 둘째는, 그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그림을 노화가가 세상은 물론이고 관객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벽 사이에 욱여 넣고 시멘트로 봉인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예술은 고통스러운 창작 과정으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영화의 이런 사색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일반 관객은 “지루해요” “예술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벗어요” 같은 촌평을 남기기도 했죠.
[3] 이런 이유로, 가치를 뒤집고 질서에 저항하는 영화예술은 법과는 제일 멀리 떨어진 영역으로 여겨져 왔어요. 영화가 움직인다면 법은 부동(不動)이고, 영화가 뜨겁다면 법은 차갑죠. 그래서 영화에 굳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아름답던 향기는 똥파리 꼬이는 악취로 변해요. 할리우드 영화 ‘나 홀로 집에’(1990년)만 봐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집에 홀로 남겨진 소년이 침입한 좀도둑들을 혼내 준다는 내용이에요. 화염방사기로 도둑의 머리카락을 태워버리고, 바닥에 유리조각을 깔아놓고 맨발로 밟게 만들죠. 어때요? 통쾌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소년은 사디즘 성향의 변태 꿈나무일 뿐이에요. 그의 행위엔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 요건인 ‘상당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경찰에 알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년은 도둑들에 대한 공격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실행하죠. 아마도 상해 혹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 소리(sorry)! 소년은 처벌받지 않겠네요. 촉법소년이니까요. [4] 어때요? 예술과 법은 구분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요즘, 구속이었다가 구속 취소로, 유죄였다가 무죄로 엎어지고 뒤집히는 법원에서의 극적 반전은 스티븐 시걸의 액션영화 뺨칠 만큼 역동적이에요. 이러다간 꿈속의 꿈속의 꿈속의 꿈으로 들어가는 미친 이야기를 담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셉션’(2010년)의 상상력을, 사법의 예술성이 뛰어넘을 것만 같아 흥분돼요.이승재 영화평론가·동아이지에듀 상무 sjda@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8
2 weeks ago
8

![[데스크 칼럼] '3차 대전'이란 각오로 임해야](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단 3일만에 항공모함을", 북한이 노리는 '이것' [박동휘 칼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72881.1.jpg)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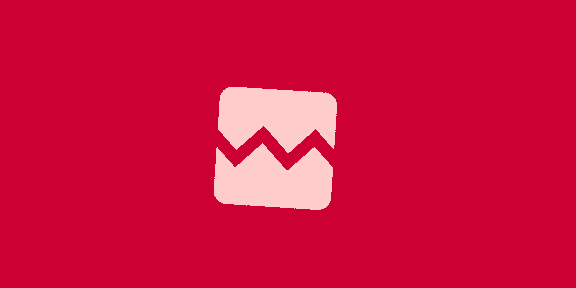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