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윤 감독은 딸이 운동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응원만 했다. 다른 부모들처럼 경기가 열린 펜싱 경기장을 찾은 적도 한 번 없다.
하지만 윤지수는 선수 생활 내내 ‘윤학길의 딸’로 통했다. 그만큼 아버지의 그림자는 크고 깊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땀 흘리고 노력해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섰을 때도 사람들은 “윤학길 선수가 어떤 조언을 해줬느냐”고 물었다.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빠의 존재가 그에겐 큰 동기부여가 됐다. 윤지수는 “어릴 적 종종 아빠를 따라 야구장을 갔다. 아빠는 항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었다. 아빠처럼 나도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유망주 소리를 들었던 윤지수였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과정이 호락호락 하지 만은 않았다. 세상은 넓었고 강자들은 많았다. 부산디자인고 3학년 때 처음 국가대표가 돼 태릉선수촌에 들어 갔지만 선배들의 기량은 그보다는 한참 위였다. 윤지수는 “나는 안되는 선수라고 생각했다. 당시 사촌 언니한테 전화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모든 아마추어 선수들의 꿈인 올림픽도 번번이 그를 외면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땐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을 딴 김지연의 파트너 선수에 머물렀다. 런던 땅은 밟지도 못한 채 국내에서만 훈련했다. 처음 올림픽 출전이었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후보 선수로 엔트리에 들어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단체전에선 5위를 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는 무릎 수술을 받아 출전을 못 할 뻔했다. 자신감도 바닥까지 떨어졌다. 죽도록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시 여자 사브르 감독으로 부임한 이효근 감독의 지휘 아래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선 도쿄 올림픽에서 그는 김지연, 최수연, 서지연과 함께 여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탈리아와의 동메달 결정전 한때 10점 차로 뒤졌지만 이를 45-42로 뒤집었다. 윤지수는 6바우트에서 11점을 추가하며 역전의 발판을 놨다. 그는 “내 생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도쿄 올림픽 동메달이다. 꿈에 그리던 첫 올림픽 메달이었다”고 했다.
아버진 윤 감독은 딸의 경기를 TV로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혼자 산에 올라 등산을 하면서 마음으로 딸을 응원하고 있었다. 마침내 동메달을 확정한 윤지수의 연락이 왔을 때 그의 반응은 참으로 경상도 남자다웠다. “메달 땄다고 까불지 말고 몸가짐 잘하라”는 것이었다.
귀국 후 윤지수가 아빠의 목에 올림픽 동메달을 걸어줬을 때도 윤 감독은 “축하한다”는 말 대신 “잘나갈수록 겸손해라”고 말했다. 윤지수는 “정말 아빠다운 축하 말이었다.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조금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학길-윤지수 부녀는 ‘올림픽 가족’이기도 하다. 1984년 상무 소속이던 윤 감독도 그해 열린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 다만 당시 야구 종목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시범 종목이었다. 윤 감독은 “경기장이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이었다. 그곳에서 한국 팀의 첫 승을 내가 거뒀다. 아마 박찬호보다 훨씬 빨리 승리를 거둔 한국 선수일 것”이라며 “그런데 아픈 기억도 있다. 3, 4위 결정전에서 내가 홈런을 맞는 바람에 우리 팀이 졌다. 다저스타디움 첫 피홈런 기록도 내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윤지수는 맏언니로 출전한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후배들과 함께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올림픽 은 1개, 동메달 1개를 갖고 있는 윤지수가 올림픽에 관한 한은 아버지를 뛰어넘은 셈이다.
부녀는 특징도 다르다. 윤 감독은 투수 시절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였다. 12시즌 동안 거의 대부분 선발 투수로만 뛰며 117승을 거뒀다. 그중 완투가 100회, 완봉승이 무려 20회였다.
반면 딸 윤지수는 단체전에서 후반을 지키는 ‘마무리’ 역할에 더 강했다. 개인전보다는 단체전때 훨씬 성적이 좋았다. 윤지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단체전을 할 때면 지고 있어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파리 올림픽 때 맏언니로서의 무게를 이기고 값진 은메달을 땄다. 시울시청 입단 후 파리 올림픽까지 이끌어주신 조종형 협회 부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올해 1월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의 간판으로 활약하던 윤지수가 정들었던 칼을 내려놨다. 더 뛸 수도 있지만 미련 없이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 전북 익산체육관에서 열린 은퇴식 때 윤 감독은 꽃다발을 들고 딸을 찾았다. 윤지수는 “아빠는 한 번도 직접 경기장을 찾은 적이 없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하던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펜싱장에 오셨다. 부녀간의 의리를 지켜주셨다”며 웃었다.
그가 ‘의리’라는 표현을 쓴 건 1997년 8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윤 감독의 은퇴실 때 네 살이던 그가 꽃다발을 들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얀색 치마를 입은 그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아빠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부녀는 은퇴 후 살아가는 모습도 닮았다. 2019년 한화 코치를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난 윤 감독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재능기부위원으로 야구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틈날 때마다 유망주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1 hours ago
3
11 hours ago
3





![[영상] 시구하러 용감하게 마운드 오른 김민재 군 '우리 아빠는......'](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2121571071411_1.jpg)

!["작년 우승 이미 끝났다, 이제 새 챕터" LG 필리핀 특급 굳은 다짐, 화려한 출발로 '언행일치' [창원 현장인터뷰]](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2112360033844_1.jpg)

![이혜영, 재혼 스토리 언급 "1년 동거→확신 있으면 미룰 필요NO"[돌싱글즈7][★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2123082116177_2.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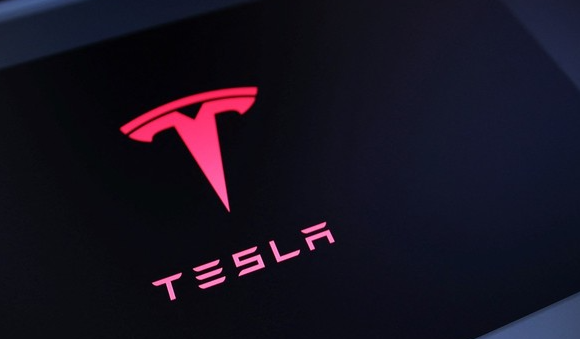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