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사용’으로 선회 중인 인도
‘공세적’ 핵 독트린 파키스탄
인더스강 물이 ‘아킬레스 건’
![[RS 푸라=AP/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5/131614333.1.jpg)
지난달 22일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인도가 통치하는 카슈미르에서 잔혹한 공격을 가해 민간인 26명을 살해하면서 긴장은 시작됐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무장 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몇 차례 보복 공격 과정에서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허위정보 논란도 제기됐다.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파키스탄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도에선 이들 국가 여행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불리는 두 나라의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물 전쟁’이 자칫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인도는 ‘평화적 핵폭발’이라는 명목하에 1974년과 1998년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을 확보했다.
인도의 움직임에 긴장한 파키스탄도 1970년대 중반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를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s)으로 분류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약 170기의 핵무기(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보유 수는 비슷하지만 전력 측면에서는 인도가 항공 및 해상 핵전력 면에서 파키스탄보다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크리스토퍼 클래리 미국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인도는 파키스탄보다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항공 전력이 더 크며 해상 전력도 앞선다”고 BBC에 전했다.◆ ‘선제사용’으로 선회하는 인도…‘공세적’ 파키스탄
핵무기 사용 정책에 있어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인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선제 불사용’(no-first-use) 원칙을 천명했지만, 점차 예외 조항을 추가하며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2003년에는 생화학 공격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2016년에는 마노하르 파리카르 당시 국방장관이 “이 원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핵 독트린을 밝힌 적은 없지만, 칼리드 키드와이 전 전략계획국 국장이 제시한 ‘4대 임계점’이 비공식적인 기준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영토의 상당 부분이 인도에 점령될 경우 ▲군사력의 대규모 파괴 ▲경제적 교살 시도 ▲내부 불안정 혹은 전복 시도가 포함된다.
◆‘실수로 인한 전쟁’이 더 무섭다
두 나라의 핵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BBC는 이를 두고 14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년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핵 억제력이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양측은 군사 충돌 이후 일정 수준에서 물러서는 ‘통제된 충돌’을 반복해왔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 제한적 공격을 수행한 후 공멸의 임계점을 넘지 않고 ‘후퇴’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간의 실수, 해커 개입, 테러, 컴퓨터 오류, 위성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억제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클래리 교수는 “현재로선 핵무기 사용 위험은 비교적 낮고 통제 가능하지만, 대규모 지상전이 발생하면 ‘선제 사용 아니면 무력화’라는 압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수밋 강굴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양국 모두 히로시마 이후 핵무기 사용 금기를 깨는 첫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제 사용은 감당할 수 없는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군비통제·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정책국장은 “핵무기가 관여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물전쟁’이 ‘핵전쟁’ 되나…여전히 남은 불씨
양국 간 갈등의 ‘아킬레스건’은 수자원 문제다. 이번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인도는 1960년 체결된 물 공급 관련 ‘인더스강조약’(Indus Waters Treaty·IWT)을 중단했고, 파키스탄은 1972년 맺은 양국간 평화조약 ‘심라협정’(Simla Agreement)을 파기했다.
특히 심라협정은 1971년 전쟁 이후 수차례 위기를 견뎌온 안전장치였다. 이번 파키스탄의 파기는 인도와의 관계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공세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히말라야 티베트에서 발원해 인도령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흘러드는 인더스강에 대한 인도의 물공급 방해 조치는, 세계 최악의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에 실존적 위협이다. 인더스강 수계는 파키스탄 농업의 90% 이상을 뒷받침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3%, 노동력의 38%를 책임지는 생명줄이다.
농업에 기반을 둔 파키스탄에게 물 공급 차단은 식량, 민생,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2억4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 아래, 파키스탄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양국 간 ‘물 전쟁’이 자칫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인도가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을 유지하자,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와의 회담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만약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5 hours ago
1
5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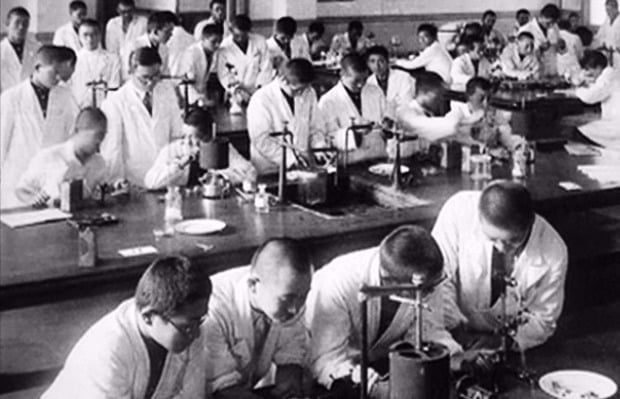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