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대중화 앞장서는 개그맨 겸 지휘자 김현철
웃기려고 흉내낸 클래식 지휘
풍부한 스토리·재미에 푹 빠져
오케스트라 창단·지휘자까지
30년 활동하며 덕업일치 실현
“클래식팬 됐어요” 들을때 보람
청중에 당당한 ‘현마에’ 될 것
![개그맨 겸 지휘자 김현철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교보문고에서 열린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지휘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18/news-p.v1.20250504.2c0c734be30f47618881649f654e0e18_P2.jpg)
“제게 클래식은 거창하지만 ‘목숨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클래식의 매력에 끌려 어느 순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클래식을 많은 분이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클래식 음악 입문서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을 출간한 개그맨 김현철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클래식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며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웃기려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지휘자의 모습을 흉내 낸 것이 시작”이라고 회상했다.
‘지휘자’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는 개그맨 김현철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한다’는 공자의 성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요즘 말로 하면 ‘덕업 일치’의 대표주자인 것이다.
김현철의 클래식 사랑은 1994년 데뷔 이후 계속돼 왔다. 라디오 방송 ‘현마에의 유쾌한 클래식’을 비롯해 클래식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2014년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홀트학교 명예단장을 비롯해 샤롯아마추어오케스트라단장, 평택페스티발오케스트라 지휘 등의 경력도 쌓았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공연문화 특별상(2019년)과 국회 문화예술 표창(2021·2023년) 등도 수상했다.
![개그맨 겸 지휘자 김현철이 최근 서울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린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지휘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18/news-p.v1.20250516.b4eeafc90aab49fbbb059461d6c2d6ba_P2.png)
김현철은 클래식의 매력을 소설에 비유했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클래식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본다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 속에서 풍부한 감정과 재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베토벤, 모차르트처럼 유명한 음악가의 대표곡을 접하면서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라며 “대중가요에 숨겨진 클래식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도 재미 포인트”라고 말한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김현철의 음악 활동은 그만의 독창적인 ‘지휘 퍼포먼스’다. ‘현마에’(김현철+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이 탄생한 계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오케스트라용 총보(악기별 악보의 종합) 읽는 법을 숙지하지 못해 곡의 형식과 구성을 통으로 외웠다고 한다. 그가 공연 때 지휘하는 곡도 아직 이 50곡의 범주 안에 있다. ‘악보를 읽지 못해 외워서 지휘한다’는 소문이 반은 맞는 셈이다.
김현철은 “데뷔 때 약 20곡의 악보를 외우던 것이 지금 50곡이 됐다”며 “총보 읽는 법을 어느 정도 숙지한 지금도 아직 외워서 지휘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하다 곡 전개를 순간 까먹을 때가 있다”며 “처음엔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당황했지만 한두 마디만 들으면 바로 악보의 어느 지점인지 떠올라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알고 보니 ‘상대음감’이 좋으면 그렇다고 한다”고 넉살을 떨었다.
10년 넘게 ‘지휘 퍼포머’로 활동하면서 탄탄한 팬층도 생겼다.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담은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명을 넘는다. 지휘봉을 사러 낙원상가에 갔을 땐 30만원에 판매하는 지휘봉을 선물받은 적도 있다.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을 출간한 개그맨 겸 지휘자 김현철이 출판기념 사인회에서 팬에게 책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18/news-p.v1.20250419.f513762ac3584a379a6107912c6a6119_P1.jpg)
김현철은 “공연이 끝나고 한 여성 관객에게 ‘6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처음으로 클래식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그런데 클래식이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난 줄 몰랐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도 클래식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땐 정말 보람을 느낀다”면서 웃었다.
통상 7~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에서 ‘전 연령 관람가’를 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극장이나 지자체에서 전 연령 관람가는 힘들다고 하면 ‘3세부터’로 최대한 낮춘다. 김현철은 “아이들이 연주자나 관람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제한이 생겼을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아기가 울면 그것도 웃음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개그맨 겸 지휘자 김현철이 인터뷰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18/news-p.v1.20250419.cff2fbf116ae415e9a8241d1a3987b82_P2.jpg)
김현철은 자신과 가장 닮은 음악가를 묻는 질문에 베토벤을 꼽았다.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명곡을 작곡했던 ‘악성(樂聖)’의 모습이 말을 더듬지만 말로 남을 웃기고, 또 악보를 보지 못하면서도 지휘를 하는 자신의 지향점과 닮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년 한 곡씩 공연 레퍼토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그 스스로 ‘지휘자’라는 명칭에 당당해지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김현철은 “사실 ‘지휘자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지금까지 지휘를 하면서 지휘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전공자가 아님에도 이런 일을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꾸준한 연습으로 지휘자라는 명칭에 언젠가 당당해지고 싶다”고 했다.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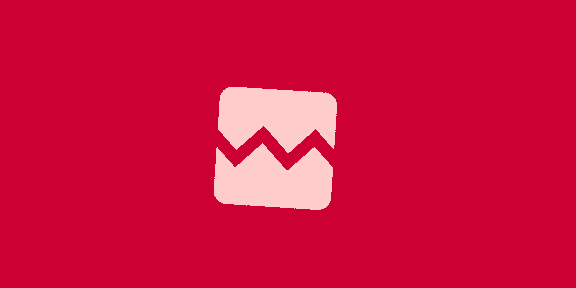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