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경고성 평화적 계엄’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모두 배척당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똑같은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법적 논리조차 펼 수 없는 군색한 처지임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엔 “계엄은 칼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칼로 요리도 하고 나무도 베고 환자 수술도 하는데, 칼을 썼다고 살인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만 가능한데도 윤 전 대통령은 그 요건을 무시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결국 칼을 쓸 일조차 없었다는 얘긴데, 윤 전 대통령은 칼의 여러 용도를 들며 기괴한 논리를 폈다. 더욱이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모든 칼에는 용도가 있기 마련이고 위험한 만큼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가장 위험한 칼을 아무렇지 않게 휘둘러 놓고 “하나의 법적 수단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이런 혹세(惑世) 논리는 계엄군 지휘관들의 일관된 증언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과거 ‘검사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다. 그는 “(의원 끌어내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도 이 발언 때만큼은 눈을 뜨고 응시했다고 한다.아직껏 헌재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퇴짜 맞은 억지 논리를 고집하는 데는 법적 대응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그가 설 자리는 적어도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는 없을 것이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11
1 week ago
11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635.2.jpg)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59.1.png)
![[오늘과 내일/정양환]가톨릭 록스타와 화엄사 극락버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30.1.png)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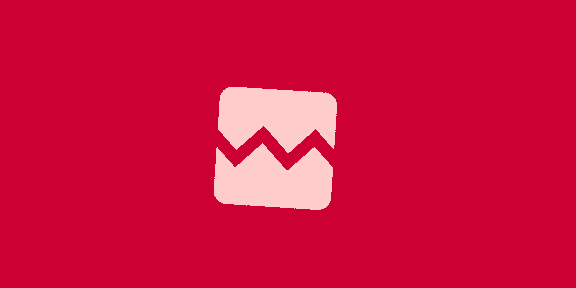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