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화 드라마트루그] 4월이 절반쯤 지나가자 비가 왔다. 내린 비에도 노란 꽃들은 하나 바래지지 않았다. 2025 혜화동 1번지의 안전 연극제는 불완전이란 소제목으로 ‘안전이 더 완전해지길 원하지만, 동시에 더 안전해지지 않은 세계에서 종종 갈피를 잃는 우리들’을 화두에 올리며 ‘불완전한 안전의 장면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중 극단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의 ‘각방 프로젝트: n개의 안전’(n개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
| (사진=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제공(촬영=박태양)) |
‘n개의 안전’은 세 편의 짧은 공연으로 무대에서 바깥, 이야기에서 현실로,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으로 이야기를 확장해가며 안전의 의미를 되묻는다. 안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세 공연은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은근슬쩍 다른 두 편의 이야기에 고리를 건다. ‘이야기한다’라는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전을 모토삼아 한 배우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김염지의 첫 20분은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안전과 맞서는 일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다음 이어지는 박주영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더욱 예리하게 와닿는다.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그 불안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안전과 맞설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다. 류원준은 분장실에서 앞의 공연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공연을 리허설한다. 조금 앞의 미래로 갈 듯 현재의 공연을 과거의 사고와 겹치게 배치하면서 무대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끌어낸다.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또는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류원준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같이 사고를 당한 친구 둘은 형사의 추궁으로, 또는 순간의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다시 만난다. 그 순간 ‘너와 내가 우리를 해했어’라고 깨닫는 류원준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곧 있을 미래 어디쯤에서 바깥을 떠돈다. 류원준의 깨달음이 다음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갈 테고, 관객은 모든 공연을 보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 마지막 공연은 그러므로 관객이 보지 않은 그 어딘가에서 공연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어느 누구도 공연하지 않는 그 공연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환경일 것이다. 가해물도, 피해자도 없으니까. 안전과 맞서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곳은 없을 것이다.
이 영리한 공연은 내용과 형식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위험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할 위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해는 언제나 점점 늘어난다. 박주영의 공연 끝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쓰는 글을 붙잡고, 인근의 성범죄자 고지 우편물을 손에 쥐고,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그 순간이 김염지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안전을 외치지만 안전하지 않는, 바로 ‘너와 내가 우리를 해’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다.
배우들은 트렁크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무대로 만들고 이야기로 만들며 우리를 지나 극장 밖 현실로 걸어나간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 다시 묻는다. 그런 게 과연 가능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안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연을 보며 웃고, 감탄했고, 끄덕이며 무대에 오르지 않은 다음 이야기를 생각했다. 이 작은 공연이 가진 큰 이야기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4월이었다. 바깥의 지지 않은 노랑에 여전히 눈이 시리다.
 |
| (사진=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제공(촬영=박태양)) |
 |
| (사진=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제공(촬영=박태양)) |
 |
| (사진=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제공(촬영=박태양)) |
 |
| 마정화 드라마트루그. |

 5 days ago
5
5 days ag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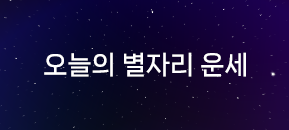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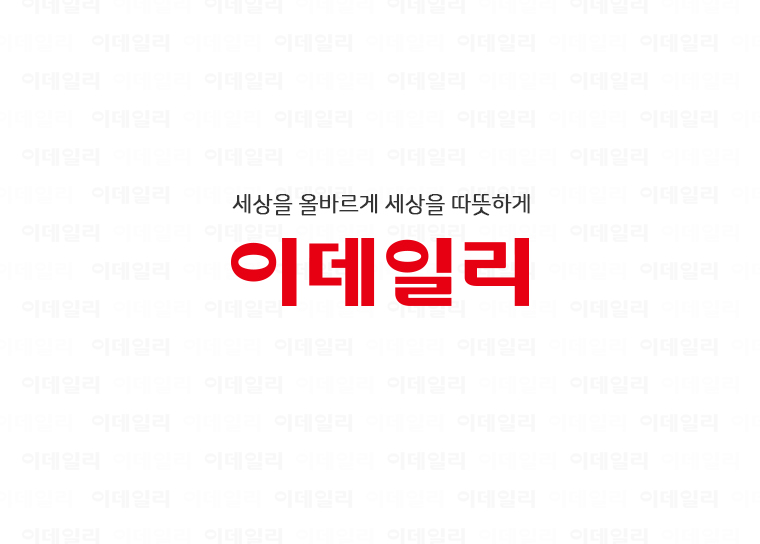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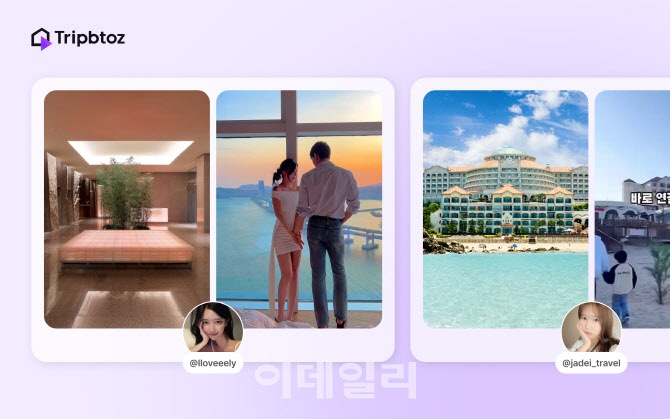

![콜드플레이·지드래곤 공연 갔다가…"여기 한국 맞아?" 깜짝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59224.1.jpg)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4일 별자리 운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400013.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