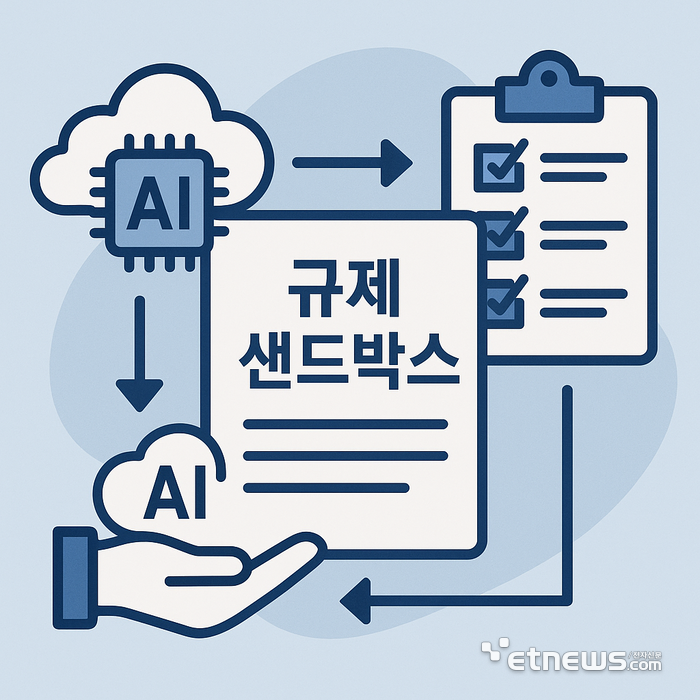 사진= 챗GPT
사진= 챗GPT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경직된 심사 구조와 빠른 기술 변화 사이에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업데이트 주기가 짧은 영역에서는 신청 시점에 기획한 기술 설계가 서비스 출시 시점에는 이미 시장 흐름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 부담 없이 혁신 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신청 당시의 기술 모델과 서비스 구성보다 더 적합한 방식이 등장해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절차상 사용 기술과 서비스 구성을 세부적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AI 모델이나 서비스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다. 결국 약 6개월 뒤 실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신청 당시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AI 활용과 서비스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규제 특례를 주는 만큼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적용 기술과 서비스 내용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최대 12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지정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보안 요건 검토를 추가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평균 1~2개월 더 걸리면서, 신청부터 서비스 출시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개발팀 관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같은 규제를 풀어도 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에게 비슷한 건의 사항을 듣고 있어 관련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2 weeks ago
5
2 weeks ago
5






![美中관세 인하에 '뉴욕증시 급등'…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 격돌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455252.1.jpg)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