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떼 칼럼] 번아웃 부르는 자기계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38510832.1.jpg)
연초 건강검진에서 골감소 진단을 받고 근육 운동을 권유받았다. 운동도 식사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기로 했다. 꽃 피는 봄, 공원 러닝을 시작했고 오래된 운동화를 버리고 새 운동화를 샀다. 기능보다 기분을 고려한 소비였다. 식사를 바꾸니 이상하게 피곤하던 아침이 조금씩 나아졌다.
운동은 좋은 흐름이었다. 그런데 헬스장에 등록한 뒤부터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자꾸만 ‘수정해야 할 나’만 보이기 시작했다. 운동 선생님은 내 자세를 체크하고 말했다. 거북목이니 두통이 오고, 밤에 숙면이 안 되는 거라고. 속으로 ‘거북목이라니…. 근데 난 밤에 잘 자고 두통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에 받아쓰기 빵점 시험지를 받아 든 기분이 들었다.
측면과 후면 사진까지 찍고 나니, 운동은 점점 건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결함 개선 프로그램’처럼 느껴졌다. 개인 훈련(PT) 30회를 끊어야만 당장 거북목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예전에 특정 화장품을 사면 바로 다크서클이 사라질 것 같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처럼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됐다.
비슷한 감정은 심리상담에서도 느껴진다. 상담은 내 감정을 객관화하고 정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은데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다. 내 안에 감춰진 무언가를 끄집어내야만 진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건 억압일 수도 있어요”라는 설명을 들으면 흔들린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심리상담 받아봤는데, 결국 별수 없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땐 뛰거나 집 안 청소를 하는 게 낫죠.” 단순한 다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에 나름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 내 상태를 돌보려던 일이 오히려 나를 끝없이 점검하고, 분석하고, 더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 지치는 건 순식간이다.
단지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서 시작한 운동과 상담이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자꾸 고쳐야 할 목록이었다.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몸과 마음에 빨간 펜으로 O, X를 매겨준 것 같았다.
자기돌봄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됐지만, 그 안에 감춰진 초조함은 종종 무겁다. 현대 심리학은 지속적인 자기 개선 욕구가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자기 계발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다. 취약성과 수치심 연구를 선도하는 브레네 브라운 역시 ‘충분히 괜찮은 상태에 머무는 것도 건강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라는, 오히려 성숙하고 안정된 태도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지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 목표치를 어디에 둘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완벽한 건강, 완벽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통증이 없고 큰 걱정이 없는 상태면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히 괜찮은 상태, 거기서 멈추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일.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내면만 들여다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바깥을 향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거창한 사회활동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몰입하는 시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일. 자기돌봄은 그 지점에서 비로소 ‘나’라는 틀을 넘어서기도 한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 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13 hours ago
1
13 hours ago
1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635.2.jpg)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59.1.png)
![[오늘과 내일/정양환]가톨릭 록스타와 화엄사 극락버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30.1.png)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26.1.jpg)
![[고양이 눈]하루를 시작하는 마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7999.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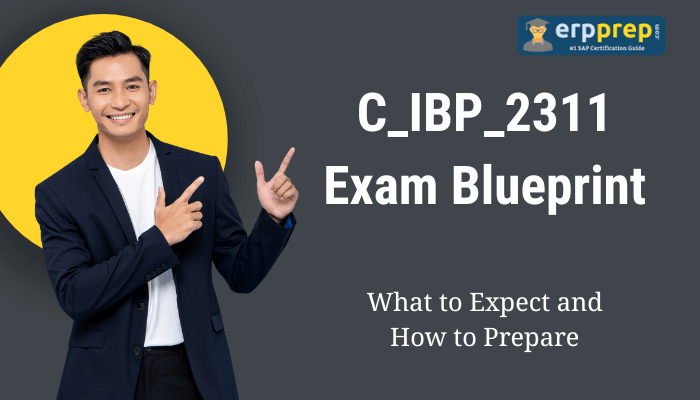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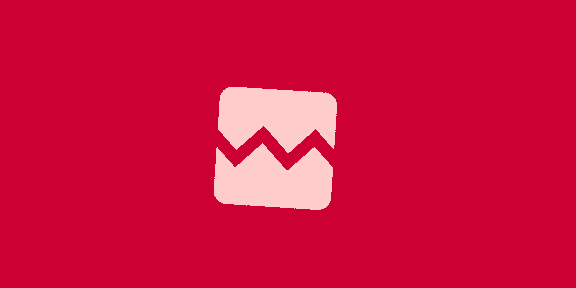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