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는 통증과 회복으로 정신이 없었다. 신생아 면회도 하루에 딱 한 번 창문 너머로 2분뿐이라 우리가 아기를 낳기는 낳은 건가, 꿈을 꾼 건가 싶어질 즈음 퇴원을 했다. 산후조리원에 도착해 짐 정리를 마치고 저녁이 돼서야 온전히 함께 있을 시간이 생겼다. “얘가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지?” 노오란 빛 속에 아기와 셋이 있는 게 무언가 비현실적이었다. “우리 거다, 우리 거.”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행복이 거기 있었다.
그제야 실감했다, 부모가 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사니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비할 데 없이 큰일. 책이나 드라마에서 또는 주변에서, 가깝게는 부모님을 통해 숱하게 접하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아는 것만 같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는 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새삼 거짓말 같았다.
며칠 뒤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자마자 부리나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다. 남편과 내 이름 밑에 밤낮을 고심해 붙인 이름 석 자가 ‘25’로 시작하는 생경한 일련번호와 함께 놓여 있었다. 문득 나는 내 ‘추억상자’에 있는 또 다른 등본 하나를 떠올렸다. 아빠 이름 밑에 엄마와 언니, 나, 동생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 2008년 발행 등본. 필요해서 떼 놓았다가 언젠가는 아련해질 서류라는 생각에 근 20년을 간직해 왔다. 세 딸이 각기 가정을 이뤄 그 등본이 ‘해체’된 지는 오래지만, 내 이름 밑에 자녀 한 줄이 덧대어진 기분은 또 사뭇 다른 것이었다.단축번호 1번이 ‘우리 집’이던 시절이 있었다. 늦잠을 자면 아빠 찬스를 쓰던 시절이, 비가 오면 엄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축번호 1번은 점차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대체됐고 다 큰 딸은 더 이상 출근길이나 늦은 귀갓길 아빠를 찾지도, 비오는 날 엄마를 찾지도 않았다. 그래서일까. 몇 해 전 딸 집에 머물던 아빠는 느닷없이 회사에 태워다 주겠다 하셨다. “힘들게 뭐 하러!” 손사래 치는 내게 아빠가 말했다. “너희들 학교 태워다 주던 때가 생각나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는 그 등본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우산을 들고 서 있을 차례라고.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는 출근하는 딸을 붙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딸 학교 데려다 주던 때가 생각나서.” 그 미래에 서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너를 사랑하련다. 앳된 나의 부모가 나를 길러냈을 바로 그 마음으로.
김지영 스타트업 투자심사역(VC)·작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5 days ago
6
5 days ago
6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635.2.jpg)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59.1.png)
![[오늘과 내일/정양환]가톨릭 록스타와 화엄사 극락버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30.1.png)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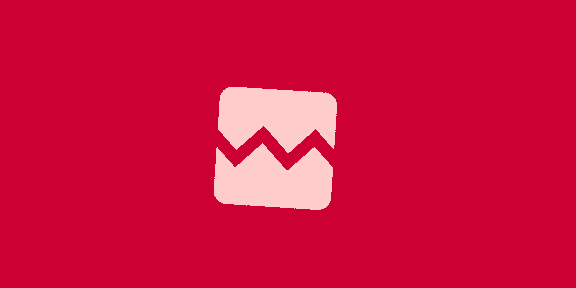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