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선반엔 꿀단지가 채워져 있기는커녕
먼지만 뿌옇게 쌓여 있는데,
빚으로도 못 갚는 땟국물 같은 어린것들이방 안에 제멋대로 뒹굴어 자는데,보는 이 없는 것,
알아주는 이 없는 것,
이마 위에 이고 온
별빛을 풀어 놓는다.
소매에 묻히고 온 달빛을 털어 놓는다.―박재삼(1933∼1997)
살다 보면 유난히 독한 날이 있다. 해결할 일과 싫은 일과 어긋나는 일이 연달아 뺨을 때리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 김치로 뺨 맞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드문 장면이지만 일이 사람을 후려치는 것은 일상의 흔한 일이다. 휘청휘청 뒤로 주춤하다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으로 밀어낸다. ‘나 우리 애들 보러 가게 좀 도와주라, 도와주라.’ 아무도 안 도와줄 것을 알지만 나는 오늘의 나를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지친 마음에는 한 편의 시라도 달다. 지금 뭐 하고 사는 건가 푸념하다가도 이런 시를 읽으면, 읽고 상상을 하면 ‘고단함이 대수인가’ 쪽으로 마음이 변한다. 저 시의 어머니를 보면 나의 퉁퉁 부은 발은 가련하지 않다. 나는 저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다시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보는 이 없어도 가족을 사랑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위대한 보통의 삶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위대한 보통의 삶을 따라 살고 싶다. 이렇듯 평범한 진리를 위대하게 외치는 것이 시라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날마다 시가 필요하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11
1 week ago
11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635.2.jpg)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59.1.png)
![[오늘과 내일/정양환]가톨릭 록스타와 화엄사 극락버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30.1.png)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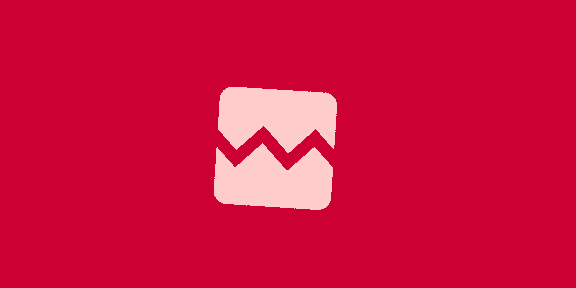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