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의 IT인사이드] 현실보다 실제같은 지도 꿈꾸는 구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4937105.1.jpg)
지도가 현실을 똑같이 묘사할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의 대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소설집 <불한당들의 세계사>에 수록된 ‘과학의 정확성에 관하여’란 짧은 글에서 이 같은 상상을 펼쳤다. “지도 제작 길드는 정확히 제국 크기만 한 제국전도를 만들었는데, 그 안의 모든 세부는 현실의 지점에 대응했다.
지도학에 별 관심이 없었던 후세대는 이 방대한 지도가 쓸모없음을 깨닫고 불손하게 그것을 태양과 겨울의 혹독함에 내맡겨버렸다.” 보르헤스는 이 글을 1930년대에 썼다. 실제와 동일한 1 대 1 비율의 지도는 땅 위를 그대로 덮을 테니 설령 만들더라도 쓸모가 없었다.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도가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하며 현실보다 더 자세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수십 년에 걸쳐 현실화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지도를 볼 수 있는 서비스는 1980년대 후반 월드와이드웹(WWW)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초기 지도 서비스는 단순히 지도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곳은 제록스 팰로앨토 연구소(PARC)다. 마우스, 그래픽사용자환경(GUI)과 같은 수많은 현대 컴퓨터 기술을 발명한 곳이다.
최초의 온라인 지도 만든 제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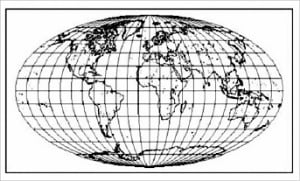
제록스 PARC에서 1993년 선보인 PARC 맵 뷰어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지도를 보는 것은 물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세계 지도를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서버에서 지도 이미지를 생성해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동적 이미지 생성 기능을 처음 선보였다. 미국 도시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는 지리 정보 서버와 연동해 사용자가 특정 위치의 좌표를 쉽게 확인하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됐다. 현재 흔히 쓰는 지도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제공한 것이다. 이 같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1996년 세계 최초 상업용 온라인 지도이자 경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맵퀘스트가 출시됐다.
21세기 들어 디지털 지도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를 꼽으라면 구글지도의 등장과 스마트폰 보급이다.
18년째 한국 지도 요구하는 구글
구글은 2004년 호주 스타트업 웨어2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고 이듬해인 2005년 2월 데스크톱용 구글 지도를 처음 내놨다. 타일 기반의 상호작용 지도와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2007년에는 ‘스트리트 뷰’ 기능을 도입해 전 세계 거리를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00년대 후반 등장한 스마트폰도 온라인 지도의 급격한 발전에 영향을 줬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성항법시스템(GPS) 덕분에 누구든 손쉽게 자신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알 수 있게 됐다.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지도 정보를 모아 현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이미 지도 내에서 식당, 명소 등 장소와 관련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장소에 대해 남긴 의견은 현실에선 알기 어려운 정보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구글이 공개한 ‘이머시브 뷰’는 주요 도시의 지형과 건물 정보를 3차원(3D) 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구글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구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세 번째다. 구글이 원하는 1 대 5000 이상의 대축척지도를 받으려면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피해 정밀 지도를 받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데이터 이전 제한 같은 비관세장벽 철회를 압박하는 것에 편승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구글지도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글에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려운 것 또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1 week ago
4
1 week ago
4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635.2.jpg)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59.1.png)
![[오늘과 내일/정양환]가톨릭 록스타와 화엄사 극락버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30.1.png)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26.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