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경제활동 1천만명 그늘]
시니어 10명중 6명이 현역
정년연장 고용質 개선 못해
임금·직무체계 둘다 바꿔야
![고령자 취업 상담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8/06/news-p.v1.20250806.91b60b7a4f354b8192d9327b5482e371_P2.jpg)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양적 성장과 별개로 상당수는 단순노무직이나 비정규직에 머무는 등 일자리의 질은 뚜렷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여전히 자리 잡은 채로 정년만 늘리면 청년 고용을 잠식하고 기업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 고용이 사회 구조로 안착하려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주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올해 17년 6.6개월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5개월 늘었지만 2008년 20년 7.8개월에 비하면 장기적으로 내림세에 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는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노동시장에 머무르더라도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 65~79세 취업자 379만3000명 가운데 126만3000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해 비중이 33.3%에 달했다. 같은 시기 55~64세는 598만7000명 중 95만1000명(15.9%)이 단순노무직으로 절반 이하 비율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층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법제화하는 입법안을 내달 발의할 계획이며, 정부도 공공부문 중심의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고령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8/06/news-p.v1.20250806.ee4e86f06b704bfcabcc9dca264170f4_P2.jpg)
하지만 일방적인 정년 연장 개혁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속이 길수록 임금이 커지는 연공형 급여구조 아래에서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건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노동시장에 남을 경우 청년 근로자 최대 1.5명이 밀려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 신규 채용이 26만명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선 고령 근로자의 잔류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발간한 ‘고용 전망 2025’ 보고서에서 “근속 연수 기반 급여 구조는 실제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도 청년층 61.2%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논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고용 위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임금체계가 유연하다면 기업들은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기꺼이 계속 고용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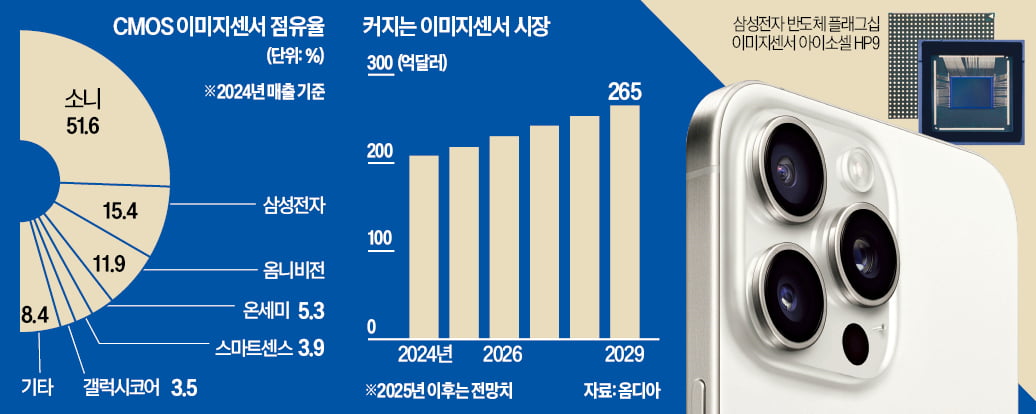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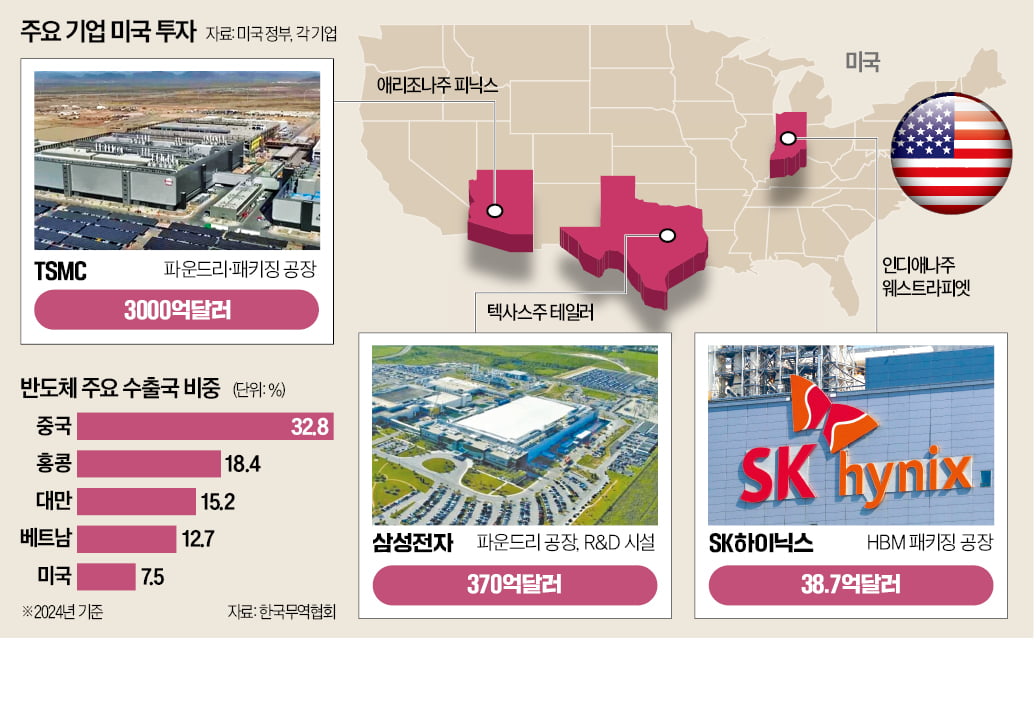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인하 유보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N.41075682.1.jpg)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