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콘클라베의 시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40241924.1.jpg)
보통 사람들에게 교황은 미스터리하면서 이중적이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권위를 간직한 귀한 존재다. 트럼프가 미국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명령한 데서 정치·외교·문화적 영향력이 감지된다. 12억 명의 신도를 대표하는 가톨릭의 최고 목자라는 후광 덕분일 것이다. 교황은 특정 종교를 넘어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자도 있다. 교황은 ‘하느님의 종들의 종’으로 몸을 낮추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로 간주된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니 정서적 반감이 불가피하다. 교황청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바티칸 은행이 연루된 부패사건 등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때가 적잖다.
‘빈자의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 소수자·약자에 입맞추던 평화·겸손의 아이콘 이었다. 세계의 관심이 콘클라베로 향한다. 전 세계 추기경이 로마교황청 시스티나성당에 모여 새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다. 3분의 2의 찬성표를 받는 후보가 나와야 끝나는 콘클라베는 비밀주의가 특징이다. 추기경들은 외부 소통이 단절된 채 매일 두 번 비공개 투표한다.
이런 비밀주의야말로 교황청 불투명성의 출발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얼마 전 개봉해 흥행 중인 영화 콘클라베는 교황 선출 과정의 타락상을 스크린에 담았다. 신의 뜻을 묻는 비밀스러운 여정에 참여한 추기경들은 진홍빛 수단을 입고 짐짓 엄숙함을 가장하지만 교황 자리를 향해 이전투구한다. 폭로와 공작, 혐오와 편가르기가 판친다. 수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성직 매매 등 비리로 유력 주자들이 차례차례 낙마한다. 그러자 ‘나는 자격이 없다’던 양심적 추기경조차 슬그머니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낸다. 보수·진보 대립은 정치판과 꼭 닮았다. 진보적 추기경은 전통주의 후보를 ‘무찔러야 한다’며 적으로 상정한다. 전통주의 추기경 역시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를 호소한다.
영화 속 콘클라베는 전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을 앞세우는 모습이 민망하다. “우리는 정말 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권력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을 들먹이며 권력만 탐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대사다.
백광엽 수석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

 1 week ago
7
1 week ago
7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횡설수설/김재영]면세점 빅4 모두 희망퇴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몰락](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635.2.jpg)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59.1.png)
![[오늘과 내일/정양환]가톨릭 록스타와 화엄사 극락버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30.1.png)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2/1315398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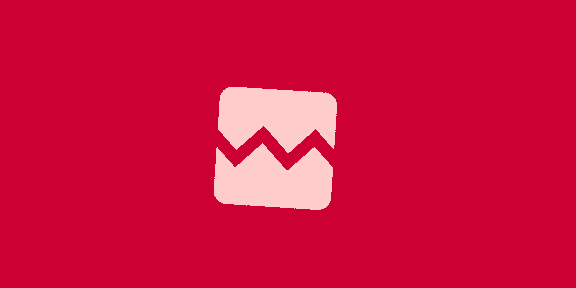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