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 색채와 향기를 기대한다. 근사한 잔에 따른 와인은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목으로 넘긴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귓전을 뒤흔든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그랬다.
지난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열렸다. 29년 만에 내한한 프랑스 대표 악단의 예술의전당 무대는 비제 ‘아를의 여인 모음곡 2번’으로 시작됐다. 루마니아 출신 불혹의 마에스트로, 크리스티안 마첼라루의 지휘는 열정적이면서도 속 깊었다. ‘파스토랄’에서 오케스트라의 총주와 플루트, 호른으로 이어지는 음색이 경묘했다. 현악기군은 어둑한 유화물감을 연상시키는 짙고 불투명한 질감으로 중후함을 더해 주었다. 중간의 경쾌한 춤곡 리듬의 외피를 플루트, 피콜로가 도금한 듯 감쌌다. 악기 사이에 통풍이 양호했다. 전체 앙상블이 두 대의 하프와 같은 무게로 가볍게 떠가듯 했다.
템포를 꾹꾹 밟으며 유지한 ‘인테르메초’에서 앙상블은 무거워졌다. 뭉근한 호른은 약간 답답했다. 가장 유명한 ‘미뉴에트’는 이 곡의 백미였다. 플루트의 맑고 순수한 음이 아이의 눈동자를 연상시켰다. 두 대의 하프가 날개를 달고 오케스트라를 견인하듯 했다. 마첼라루의 느린 템포에 대응한 플루티스트의 대응력도 감탄을 자아냈다. 앙코르곡으로도 인기 높은 ‘파랑돌’ 역시 플루트 협주곡을 방불케 했다. 맑은 목관 소리를 일사불란한 현악기군의 보잉이 감쌌다. 금관이 터져 나올 때도 마첼라루는 절제로 밸런스를 유지하며 점층적으로 피날레를 풀어냈다.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토로프가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협연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와 ‘진노의 날’ 주제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이 곡은 짧은 변주들로 구성돼 피아노 협주곡에 비해 관객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캉토로프의 연주는 피아노에 수많은 결을 세우는 듯 다가왔다. 속주에 임할 때도 한 음 한 음이 또렷하면서 리스트의 작품처럼 안개 같은 미스터리가 드리웠다.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의 다채로움이 먼저 들어왔다. 연주에서 풍기는 자유로움과 도회적인 이미지는 재즈를 연상시켰다.
현악기군은 깊은 바다의 표면을 스치듯 했고 영롱한 피아노가 곡 전체를 이끌고 갔다. 피아노는 육박하는 오케스트라의 포효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호른, 첼로와 대화를 나눌 때 시적인 흐름이 도드라졌다. 티 없이 맑은 날씨 같은 금관과 한 음 한 음 종소리처럼 또렷한 피아노 터치, 존재감을 드러낸 악장의 바이올린도 기억난다. 가장 유명한 제18변주는 지극히 낭만적으로 해석했다.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절정을 이루는 오케스트라 속에서 캉토로프의 피아노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앙코르는 리스트 편곡 슈베르트 ‘리타나이’였다. 영혼을 위로하는 연도문은 캉토로프의 잔잔한 건반을 타고 귓가로 스며들었다. 더욱 뜨겁고 환해진 청중의 반응에 그는 스트라빈스키 ‘불새’ 중 피날레를 연주했다. 건반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 특징을 재현하는 모습은 예술가다웠다. 나날이 팬을 늘려가는 캉토로프의 개성이 빛났다.
모리스 라벨 편곡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은 화사하고 색채감 넘치는 폭발력을 기대했었다. 막상 연주는 보기 좋게 예상을 빗나갔다. 프롬나드에서 트럼펫 음색 자체는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악기들 사이의 통풍과 블렌딩이 잘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총주는 날카로워졌다. ‘그노무스’는 타악기의 끝처리가 상큼했고 팀파니가 독특했다. 총주의 음량은 놀랍게 컸다. 이후 프롬나드는 평온했다. 마치 음량의 평균치를 맞추려고 시도하듯 흥분하거나 치우치지 않았다. ‘옛 성’에서는 고적하게 우는 색소폰 솔로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곡에서 마첼라루의 지휘는 자극적인 해석보다는 ‘순한 맛’이었다. 곡 본연의 고유성을 살리는 의도가 개입된 것 같았다. 다시 평균을 맞추듯 프롬나드는 힘차고 묵직해졌고, 약동하는 ‘튈르리’에서도 약음을 강조했다. ‘비들로’에서는 다른 연주와 마찬가지로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스네어드럼이 활약했다. ‘껍질 쓴 병아리들의 발레’는 플루트가 맹활약했다. ‘사무엘 골덴베르크’는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더 느물댔으면 좋았을 것이다. 반면 ‘쉬밀레’는 깽깽대는 트럼펫이 잘 어울렸다. ‘리모주의 시장’은 적극적인 표현으로 부산함을 나타내면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았다. ‘카타콤베’에서 마첼라루가 그려낸 내성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는 ‘닭발 위의 오두막’이나 ‘키예프의 대문’보다도 오히려 클라이맥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끝의 두 악장에서도 승리의 소모적인 벅찬 화려함보다는 강약의 대비로 곡 전체의 윤곽을 닦는 절제가 작용했다.

마첼라루가 유예했던 발산은 앙코르에서 발휘됐다.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레’는 이국적인 성격과 향기를 살렸다. 그러면서도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인 움직임을 벗어나지 않게 제어해 인상적이었다. ‘오펜바흐’ ‘지옥의 오르페’ 중 ‘지옥의 갤럽’은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끝인사였다. 무용수들의 캉캉 춤으로 잘 알려진 이 곡에서 청중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쳤다. 관객의 박수를 유도하는 ‘라데츠키 행진곡’도 아니었지만 무대 위로 보내는 청중의 마음이 전해져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2 days ago
8
2 days ago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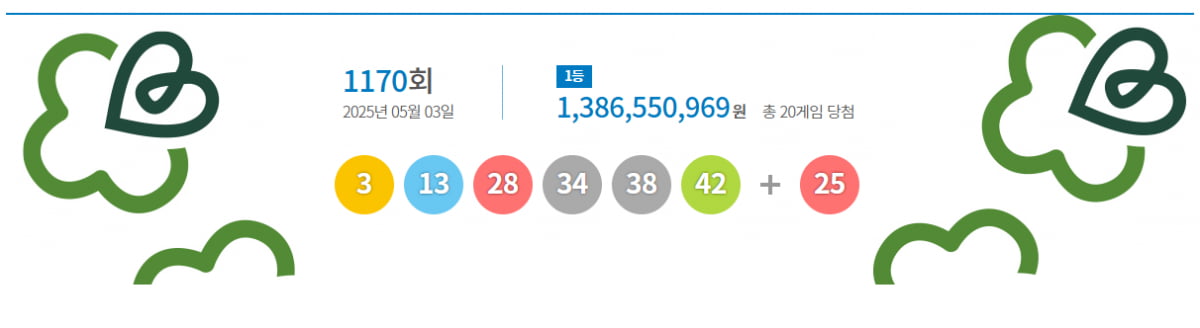


!['뿡뿡' 방귀 뀌면서 걸었더니…'대박 효과' 나타났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99.17717224.1.jpg)
!["아내 죽고 세상 무너졌다"…'비운의 천재'가 잊혀진 이유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62864.1.jpg)
![[포토] 푸마, 수원삼성블루윙즈 창단 30주년 유니폼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275.jpg)
![[포토] 여주 도자기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274.jpg)
![[포토] 새로 개통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273.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