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분이 오셨어!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에 씌인 듯 술술 풀릴 때 위트를 담아 ‘그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일상에서 ‘접신’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신내림과 신지핌의 상태는 예술가에게 더 친숙하다. 고대에 춤은 제의의 하나였으며 신에게 홀려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추던 것이기도 했다. 힘차게 땅을 밟고 구르는 플라멩코 무용수들의 표정은 마치 신과의 합일을 기도하는 의식 같아 보인다. 춤을 추며 마치 접신한 것처럼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플라멩코에서는 ‘두엔데(Duende)’라고 부른다. 플라멩코는 집시의 혼을 담은 춤이다. 집시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플라멩코를 익힌다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 어딘가에 정착할 곳 없이 떠다닌 그들이 잠시 비와 추위를 피해 기거한 곳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토로하며 어디서 말하지 못하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플라멩코 안에 담았다. 과연 이런 애환과 두엔데가 현대적으로 정비된 프로시니엄 극장 안에서, 신화를 잃어버린 21세기라는 시간 안에서, 관객을 상대로 하는 정제된 공연 안에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플라멩코의 원형에서 이 작품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확장된 것이고, 또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 마르코스 모라우와 스페인 국립플라멩코발레단이 만나 작업한 ‘아파나도르(Afanador)’는 이런 질문을 품고 만난 작품이다.
색이 없이 정지된 이미지 안에서 플라멩코의 혼을 읽다
사진이라는 정지된 이미지 안에 두엔데의 몰아 상태를 담아낼 수 있을까. 색이 없는 곳에서도 두엔데는 피어나는가. 이런 의구심은 사진작가 루벤 아파나도르가 플라멩코 무용수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담은 작품을 보면 바로 풀린다. 그의 사진집 <집시 천사>(2009), <천 번의 키스>(2014)는 모라우에게 영감을 줬고, ‘아파나도르’의 원천이 됐다. 우리는 이미 정지된 이미지 안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흑백의 이미지 안에서 수많은 색깔을 보는 환영에 휩싸인다.

플라멩코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건 무용수가 땅을 구르는 동작, 사파테아도(zapateado)다. 구두 발끝과 발꿈치로 바닥을 치는 이 동작이 오래 지속될 때 무용수들은 절정의 도취와 신비한 경지, 즉 두엔데에 이른다고 말한다. 아파나르도의 첫 장면이 루벤 아파나르도에 경의를 표하는 인사였다면 두 번째 장면부터는 본격적인 플라멩코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무대의 막이 내려와 무용수의 발끝만 보이도록 남기고 오로지 사파테아도로 그 시간을 채운다. 플라멩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이 ‘제의’에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플라멩코는 일종의 제의다.
플라멩코의 제의적 성격은 관객을 위한 공연 형태를 갖춘 아파나르도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원형의 구조를 만들며 펼쳐지는 군무가 특히 그렇고, 사랑하는 남성이 먼저 죽음의 길로 들어서자 절망에 빠져 자신도 저세상의 길로 들어서려는 여성과 그를 둘러싸고 위로하는 군무 역시 그렇다. 추상성을 추구하지만 서사를 담은 단편들이 실타래의 끈처럼 이어지는 구성은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객을 사로잡아 놓는 힘이 되기도 했다.
추상과 초현실주의로 해석한 플라멩코의 전통
보통 플라멩코를 춤이라고 생각하지만 춤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바일레(Baile)라고 불리는 춤은 플라멩코의 한 요소이며, 그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 ‘칸테(Cante)’, 손뼉을 치는 ‘팔마(Palma)’, 기타 음악인 ‘토케(Toque)’가 만나 하나의 플라멩코를 이룬다. 이 네 가지 요소의 위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팔마는 사파테아도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통해 무용수들을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고, 칸테와 토케는 감정을 북돋는다.
한편 세비야와 그라나다는 서로 자신들이 플라멩코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채나 캐스터네츠, 꼬리가 길게 달린 스커트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공연용으로 자리 잡게 만든 건 세비야로 알려져 있다.
기괴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며, 추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장면을 끌어내는 모라우의 특징은 이번 작품에서도 두드러졌다. 무용수 출신이 아닌 안무가로서 움직임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면적인 무용 언어를 무용수들의 몸 위에 쌓고, 칸테와 팔마를 교차시키며 플라멩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점이 인상적이다. 스페인 국립플라멩코발레단의 무용수들은 플라멩코 외에도 발레와 다양한 춤이 몸 안에 새겨 있어서 현대적으로 해석된 플라멩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아파나도르는 플라멩코의 정신과 아방가르드가 만나 오늘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단비 무용칼럼니스트

 2 days ago
2
2 day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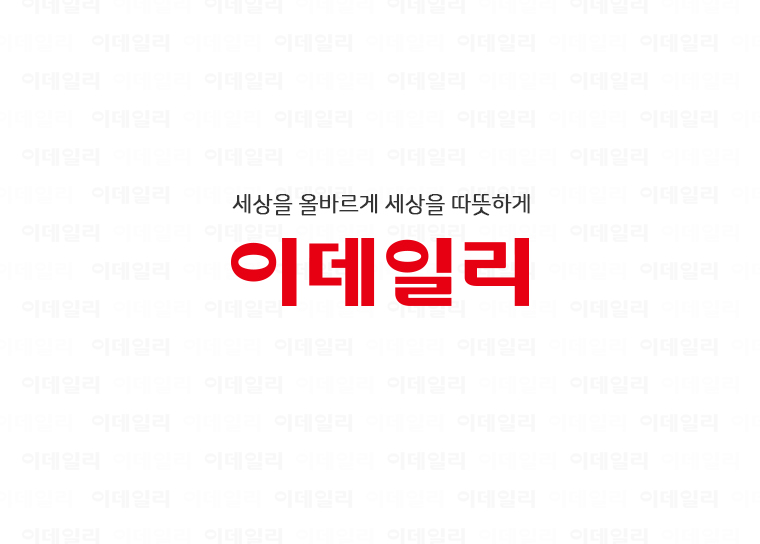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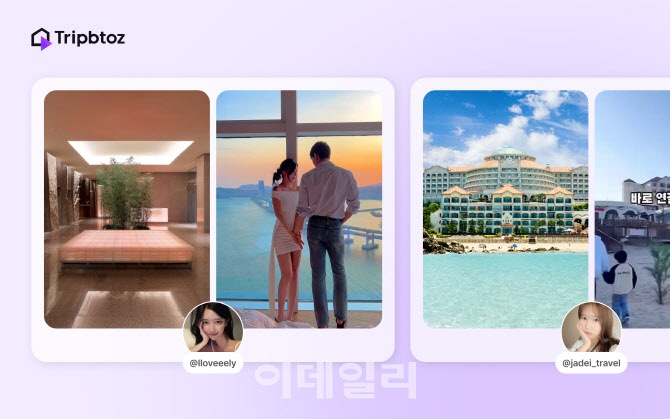

![콜드플레이·지드래곤 공연 갔다가…"여기 한국 맞아?" 깜짝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59224.1.jpg)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4일 별자리 운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400013.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