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석유화학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 기업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 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채권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불안이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무조건적인 자금 공급에는 선을 긋고 있다.
▶본지 8월 25일자 A8면 참조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석유화학 기업을 비롯한 채권시장 상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석유화학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총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가운데 40조원가량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12·3 비상계엄,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건 석유화학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상환이 최대 난제로 급부상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LG화학, HD현대케미칼 등 국내 10대 나프타분해설비(NCC)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가운데 만기가 1년 이내인 회사채·CP 잔액은 5조29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석유화학 기업은 회사채·CP 차환(롤오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석유화학 기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면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회사채·CP 등 시장성 차입 상환은 각 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채 차환(롤오버)이 어렵다면 대주주가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자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하더라도 석유화학 기업에 직접 자금을 대기보다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옮겨붙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3 weeks ago
2
3 week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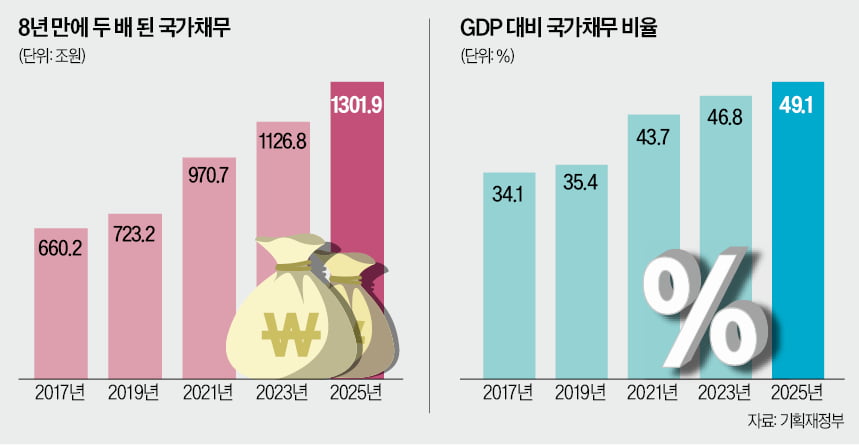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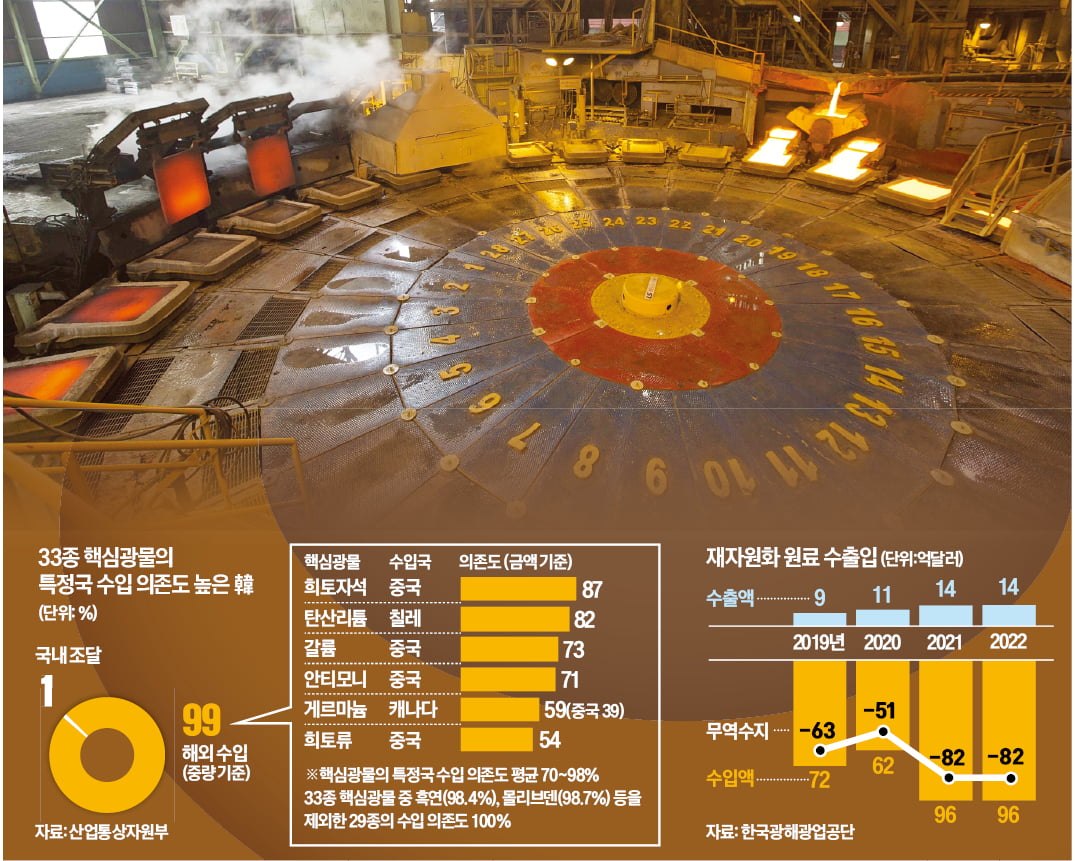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