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여파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미국 부유층 소비자가 슈퍼카 구매를 미루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슈퍼카를 많이 제작하는 독일의 고용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슈테판 빙켈만 람보르기니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부유층도 차량 가격 인상에 민감하고 많은 소비자가 더 안정적인 관세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람보르기니 브랜드의 핵심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여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람보르기니 차량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최소 40만달러(약 5억5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미국과 27.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람보르기니는 하반기부터 일부 차종의 미국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7~1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독일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언스트앤드영(EY)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5만1500개에 달했다. 지난 1년간 독일 전체 인력 감축 규모가 11만4000개인 걸 감안하면 감축된 인원의 절반이 자동차산업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다. EY는 독일 자동차업계 전체 종사자의 약 7%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산하며 “다른 어떤 산업 부문도 이렇게 큰 고용 감소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독일 자동차산업은 이미 전기차 전환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치며 충격을 받고 있다. 올 상반기 독일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완성차의 감원이 이어지면서 부품사들도 실적 부진에 빠졌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3 weeks ago
1
3 weeks ago
1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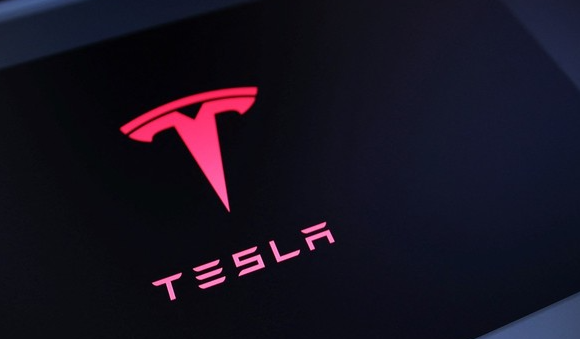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