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배터리 전기차(BE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 비롯된다. 보조금을 주는 명분은 단 하나, 운행 중 탄소 배출이 내연기관 대비 월등히 적어서다.
그래서 한국도 BEV 초창기는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때 승용과 상용을 가리지 않고, 수입 BEV가 앞다퉈 들어와 보조금을 선점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이 수입차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자 비판이 쏟아졌고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양한 지급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국산차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물론 ‘수입’이라는 이유로 BEV 보조금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금을 줄였음에도 수입산 BEV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중국산 테슬라 인기가 대표적이다. 브랜드가 생산지의 부정적 효과를 덮으며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32% 증가한 2만6569대가 판매됐다. 지난달에는 7357대로 수입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의 보조금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산 보조금을 줄였지만 테슬라 또한 무이자 할부 등으로 맞선 결과다.
그러자 국산과 수입 BEV의 보조금 차등화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투입되는 보조금이 세금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반면 지나치게 세금 출처에 얽매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적 명분이 약화된다는 반론도 강화됐다.
상용차는 더욱 논란이다. 승용 대비 탄소 배출이 월등히 많아 적극적인 BEV 전환이 이뤄지는 분야여서 정부는 국산 BEV를 은근히(?) 권고한다.
그럼에도 개인 및 운송 사업자가 중국산 BEV를 선택하자 보조금을 추가로 줄이거나 아예 지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어느 순간 탄소 배출 저감 명분은 사라지고 BEV 보조금 정책이 ‘국산 vs 수입’ 구도로 형성되는 셈이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보조금 운용 방식을 바꾸면 된다. 구매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 저감 효과 극대화에 목표를 두자는 목소리다.
BEV 판매는 제조사 간 경쟁에 맡기되 세금 지원은 운행에 초점을 두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 주차장 이용료 및 충전료 지원 확대에 쓰는 게 오히려 낫다.
게다가 이때 사용되는 보조금은 해외 유출 없이 모두 국내에 소진돼 ‘국산 vs 수입’ 차별 논란도 사라진다.
현재 보조금 지급 기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밀도, 서비스센터 숫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 등은 제조사 간 경쟁으로 이미 전환됐기 때문이다. 보조금으로 BEV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보급 초창기 역할일 뿐 이제는 운행 확산에 방점을 찍자는 의견이 쏟아진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자 판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구매 보조금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 이익으로 흡수돼 끊임없이 ‘국산 vs 수입’ 갈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정작 탄소 배출 저감을 실행하는 이용자의 혜택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BEV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때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

 3 weeks ago
3
3 weeks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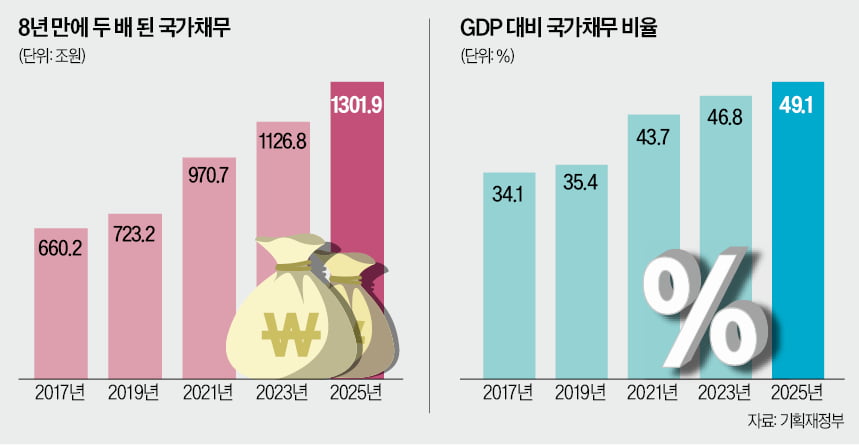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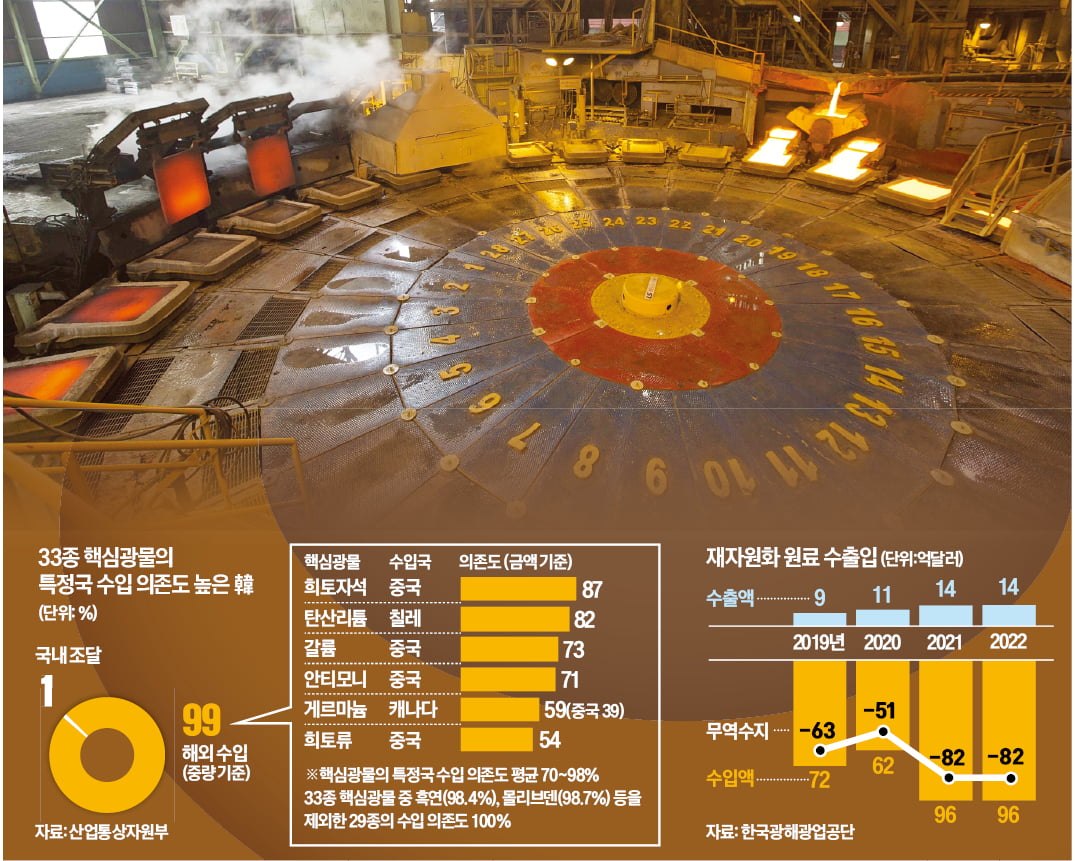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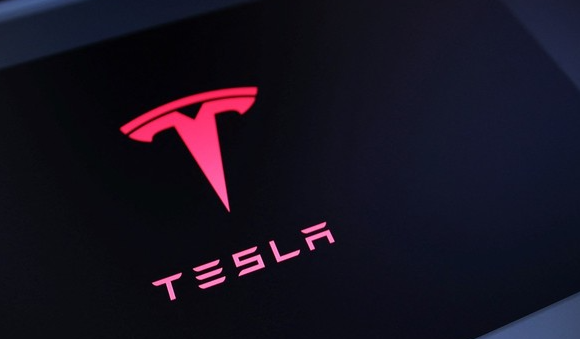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