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이 마련한 5대 그룹·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에도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별도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회장은 지난 29일 미국 출국길에 올라 민관 협력을 강조했던 발언을 행동으로 옮겼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처음 확인된 외부 일정이 한미 관세 협상 '측면 지원'인 것.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자국 내 투자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 현지 매체는 한국 정부가 투자 규모만 1000억달러+알파(α)에 해당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4000억달러 수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측면 지원은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6'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는데 이를 계기로 대미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370억달러(약 5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워싱턴DC로 향한 점에 주목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첨단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회장은 그간 경제사절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외교'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전 정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 등 해외 순방길에 동행해 각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사우디 순방 당시엔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함께 나서 '네옴시티' 등 중동 인프라 건설 사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을 땐 ASML과 7억유로를 투자해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을 위한 극자외선(EUV)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국제 비즈니스 회의 선 밸리 콘퍼런스(앨런&코 콘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다. 선 밸리 콘퍼런스엔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애플·구글·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도 참석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1일)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기획재정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협의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함께했다.
한국 정부는 민감한 농산물 분야 양보를 포함해 수정안을 거듭 제안하면서 미국과 상호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소고기·쌀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더 폭넓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7 hours ago
2
17 hour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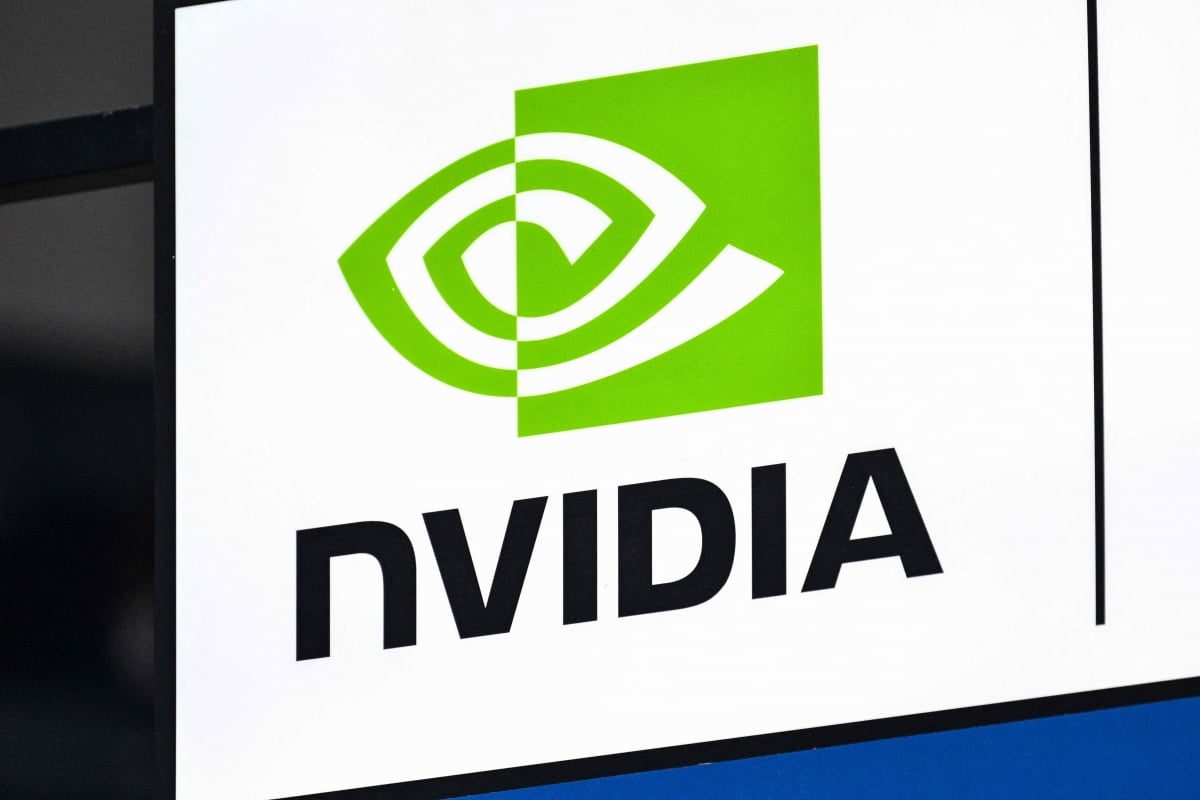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인하 유보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N.41075682.1.jpg)

![이준영·아이들 슈화·크래비티 앨런·키키 수이, 'ACON 2025' MC 발탁[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7/2025070309484071779_6.jpg/dims/optimize/)


![“로젠버그 차도가 없어, 복귀 불투명”…사실상 시즌아웃, 끝없는 키움 선발 고민 [SD 고척 브리핑]](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7/06/131945683.1.jpg)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