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권 이행소송은 채무자 권리”
3자간 관계에서 효율적 해결 도모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은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제3채권자에게 소송을 걸 당자자로서의 자격(적격)을 잃는다고 판단해왔는데, 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사는 B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원심에서 패소한 B씨는 이를 근거로 ‘A사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A사의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심 채권자(이 사건에서 C사)에게는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며 “채무자(B)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해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추심 채권자(C)로서는 채무자(B)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설렴 채무자가 제3채무자(A)를 상대로 패소하더라도, 이 피해는 채무자에게 귀속될 뿐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제3채무자 소송 어떻게 바뀌나

‘상철’과 ‘영숙’이 있다고 가정하자. 상철은 영숙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 영숙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갖고 있다. 상철은 동시에 대부업체 ‘콩팥’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콩팥(1000만원)→상철(100만원)→영숙의 구도로 각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철이 콩팥에게 돈을 갚지 못할 때 콩팥 측은 “네가 영숙에게 받을 100만원은 어차피 우리에게 갚아야 할 돈이니 우리가 직접 받겠다”며 채권 추심명령을 얻어낼 수 있다. 콩팥이 아니라 과세당국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콩팥이 추심명령을 받아낼 경우, 상철은 영숙에게 100만원을 내놓으라는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콩팥이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100만원 반환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상철이 아닌 콩팥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바뀐 대법원 판례는 콩팥이 추심명령을 얻어도 상철이 영숙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숙이 상철에게 갚을 100만원은 상철을 거치든, 콩팥에 직접 보내든 저절로 콩팥으로 흘러갈 채권이다.
문제는 상철이 영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할 때 발생한다. 2심 재판부가 “영숙은 상철에게 100만원을 돌려줘라”라고 선고했지만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다. 이때 콩팥이 “내가 직접 받을테니 상철은 빠져라”라며 추심명령을 얻어낼 경우, 상철은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고 재판은 자동으로 각하(상철 패소) 처리된다. 그리고 콩팥은 영숙에게 따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을 받아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 비효율이 높아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수의견 “판례 바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소송경제 측면에서 난점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실무상 확립돼 온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노태악 대법관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 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먼저 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행소송 참가만으로는 추심권능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례를 바꿀 경우 영숙에 대해서는 콩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철만 가능하다. 뒤집어 생각하면 콩팥은 영숙에게 추심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제약되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뜻이다.
노 대법관은 소송경제 면에서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채권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던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당사자들인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추심명령 관련 실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지성 이어 조규성·이한범도 포스텍 울렸다! 미트윌란, 노팅엄 원정서 3-2 승리…포스텍의 노팅엄, ‘패패무무패패’ 멸망 [유로파리그]](https://pimg.mk.co.kr/news/cms/202510/03/news-p.v1.20251003.f2964094c0e0447f84af28c5f48d0e9a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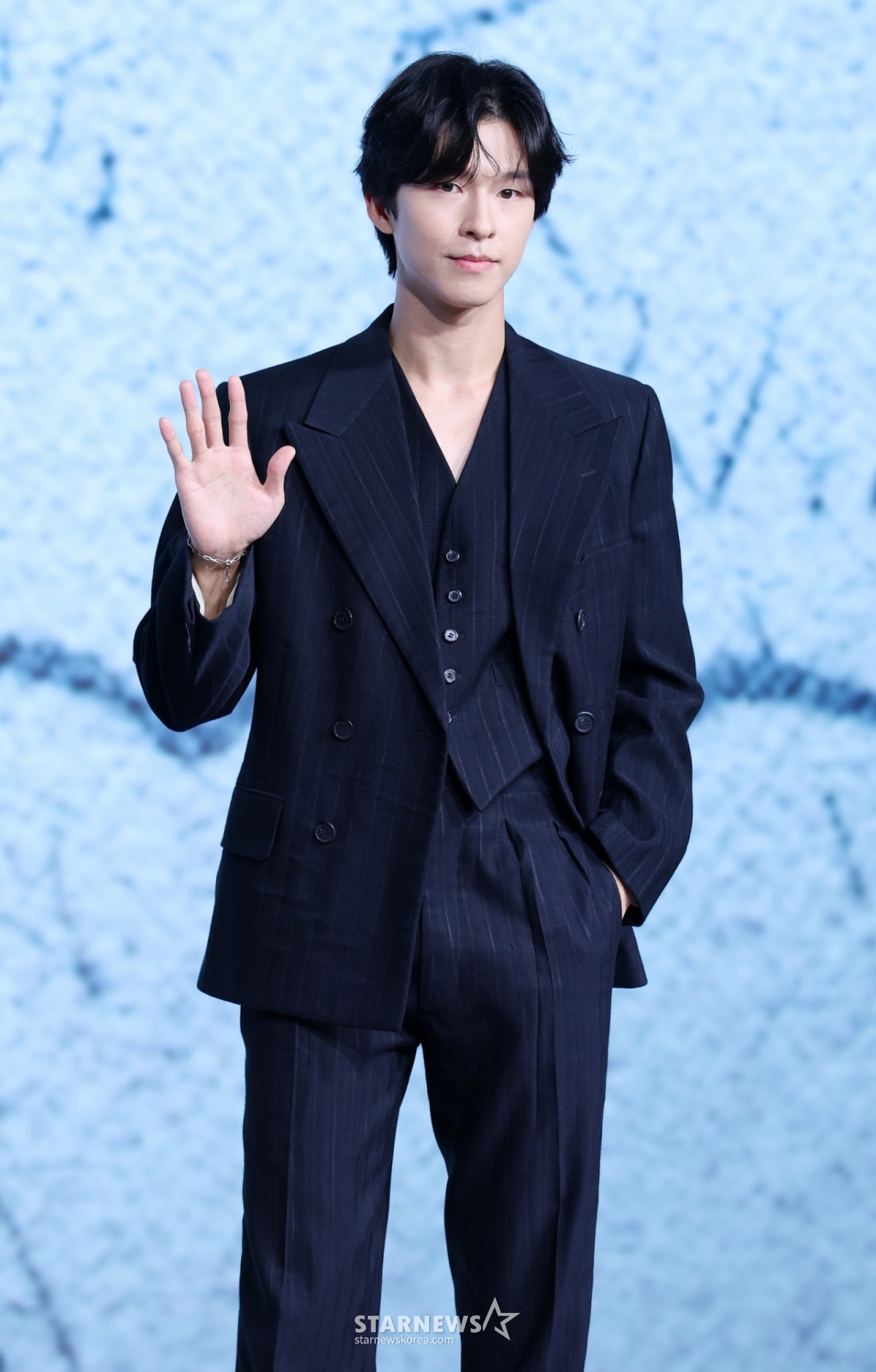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