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격은 분명하다. 이념과 철학부터 형식까지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화적 대안’을 표방해 온 전주는 언제나 쉽게 소비되지 않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지난 25년간 영화제는 늘 관객을 ‘보는 자’가 아닌 ‘응답하는 자’로 만드는 작품을 골라 스크린에 걸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도 ‘대안 정신’을 들고 나왔다. 열흘 간 상영되는 224편의 초청작 중에서도 이런 영화제의 정체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건 개막작인 라두 주데 감독의 ‘콘티넨탈 ’25’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각본상)을 받았다는 명성을 지우고도 영화의 작품성은 전주영화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작으로 손색이 없다. 영화제가 오랜 시간 지키려 했던 작가주의적 탐구와 사회적 메시지, 형식적 실험이라는 삼박자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얼개는 이렇다. 루마니아 제2의 도시인 클루지에서 집행관으로 일하는 여성 오르솔랴(에스테르 톰파)의 트라우마 극복기. 건물 보일러실을 무단 점거 중이던 노숙자를 퇴거시킨 직후 그의 자살을 목격한 오르솔랴는 며칠간 주변 사람들을 만나 개인의 도덕적 위기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헤쳐 나갈 방법을 고심한다.

영화는 쉽게 피부에 와닿는 몇 가지 정치적 구호를 담고 있다. 콘티넨탈이라는 이름의 부티크 호텔로 재건축될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노숙자는 왕년에 동구권에서 잘 나가는 국가대표 체육인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머물며 노숙자로 전락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약자다.
오르솔랴는 늘 상냥하지만, 결국 이런 자본의 횡포에 가담하는 공모자다. 한편으론 ‘집행관 때문에 불쌍한 노숙자가 내몰렸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악마화되는 언론의 희생양이다. 동시에 역사적 앙금 때문에 “너희 나라로 꺼지라”는 루마니아인들의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로 공포를 느끼는 헝가리계 이민자이기도 하다.
다만 정치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화의 메시지만으론 성에 차지 않는다. 굳이 루마니아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회 구조의 모순을 꼬집는 작품은 많다. 영화에서 몰입해야 하는 건 오르솔랴와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다. 윤리를 포장하는 언어의 공허함과 도덕적 자기기만이라는 색다른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노숙자 퇴거 사건 이후 며칠 간 오르솔랴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소통한다. 남편과 엄마, 친구, 옛 제자, 성직자를 만난다. 비록 법적으론 노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란 점에서다.
오르솔랴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불쌍한 노숙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반복하며 슬픔에 잠긴다. 그렇다면 그는 착한 사람일까. 사실 오르솔랴는 위선적이다. 이미 세상을 뜬 노숙자를 현실로 불러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묘비에 꽃이라도 놔야겠다”면서도 정작 그가 묻힌 무연고자 묘지는 찾아가진 않는다.

도덕적 파열음은 갈수록 커진다. 10여년 만에 만난 제자에게 불쑥 전화를 걸어 만난 자리에서 힘들다고 털어놓더니 덜컥 불륜을 저지른다. 이마저도 술에 취한 탓이다. 평소엔 잘 가지 않는 냉담자지만, 사제를 찾아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스스로 목을 매 발버둥 치다 세상을 떠난 노숙자의 마지막 순간은 오르솔랴의 자기위로를 위해 소비될 뿐이다.
오르솔랴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위로한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하다. 그의 심경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은 힘들어하는 아내가 여행에 동참하지 못할 것 같다는 데 실망하고, 엄마는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해묵은 감정만 뒤적거릴 뿐이다. 제자는 온갖 선불교 고승들의 선문답을 늘어놓지만 관심사는 오르솔랴와의 키스뿐이고, 교회의 사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죄책감을 정당화하며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는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일련의 구차한 양심고백 뒤 나오는 침묵의 화면이다. 값비싼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찍은, 아무런 소리가 삽입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도시의 무표정한 풍경들은 수많은 현학적 수사로 가득했던 오르솔랴와 사람들의 내러티브와 대비된다. 마치 “당신이라면 어땠겠느냐”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내리지 않는 것 같은 영화의 말미에 관객은 불편함이 가득해진다. 바로 이 지점이 겉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전주영화제가 주목한 ‘콘티넨탈 ’25’의 미학이다.
지난달 30일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 모습을 드러낸 민성욱·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은 개막작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트라우마의 극복 과정에서 모순을 마주하는 영화”(민성욱), “새로운 서사형식 속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을 잘 반영한 영화”(정준호).
전주=유승목 기자

 12 hours ago
1
12 hours ago
1
![[포토] 한돈자조금, ‘5월 슈퍼 한돈페스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014.jpg)

![[책마을] 4조 적자에서 6조 흑자로…일본제철은 어떻게 부활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358932.1.jpg)
![[책마을] 강남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책마을] 한강 신작 출간되자마자 2위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35894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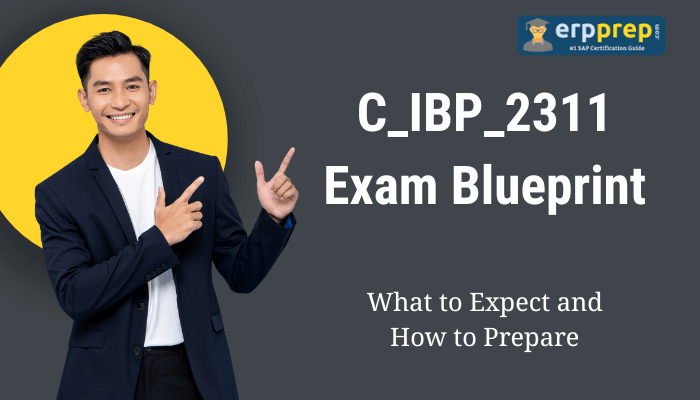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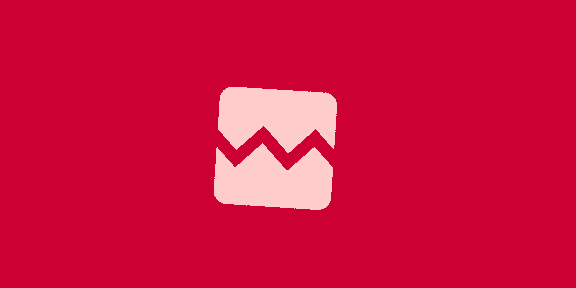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