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어떤 경제 효과를 나타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국에서는 엔데믹 후 좀처럼 내수 활성화가 난항을 겪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한 바 있고, 태국도 지난해 하반기 디지털 지갑을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효능과 대비책을 미리 짐작해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게, 전 국민 중 신청자에 한해 소비 쿠폰이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태국 등 사례의 경우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4년 3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내수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재 교체 보조금과 디지털 쿠폰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쿠폰 프로그램은 2024년 소비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3000억 위안(한화 약 58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결과였다.
통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97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2671만명 이상이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구매를 위해 보조금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제도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올해 보조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의 소비 쿠폰 효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본적인 구조 변화, 고용 창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점이다.
중국 담당의 팅 루(Ting Lu)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로이터통신에 "하반기 수요 절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월 "이러한 조치들이 특정 소매 부문에서 단기적 이익을 촉발하긴 했지만 낮은 소득, 취약한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계속해서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앞당겨진 소비가 비보조 품목에 대한 소비를 잠식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통신은 "트레이드인은 즉각적인 지출을 장려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품에 대한 미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국의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에 국한해 사용이 제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재난지원금이 상당수 편의점에 집중됐는데, 당시 고가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취지와 달리 전반적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고루 쓰이는 게 아니라 일부 상권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폭염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전통시장 등에는 효능이 미미할 우려도 고개를 든다.
아울러 중국 사례에서는 경기 부양 후 지역 간 불균형을 더 자극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후에도 지방 정부의 수입은 급감하는데 복지 등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별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또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 내에서 고려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 격인 칭화대 소속 연구소는 국채 추가 발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번 소비 쿠폰 발행이 재정 부담을 더 지울 수도 있다. 또 소비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작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4일까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57.1%였다. 인천(60.95%), 세종(60.01%), 광주(58.59%)가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53.19%), 제주(53.24%), 강원(54.74%) 등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4 hours ago
1
4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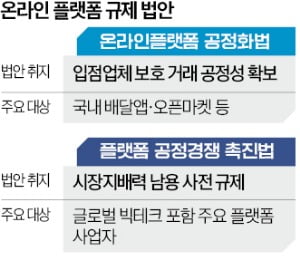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인하 유보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N.41075682.1.jpg)



![이준영·아이들 슈화·크래비티 앨런·키키 수이, 'ACON 2025' MC 발탁[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7/2025070309484071779_6.jpg/dims/optimize/)


![“로젠버그 차도가 없어, 복귀 불투명”…사실상 시즌아웃, 끝없는 키움 선발 고민 [SD 고척 브리핑]](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7/06/131945683.1.jpg)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