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20세기 정신분석학을 세운 이들의 이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359013.1.jpg)
20세기는 정신분석학의 세기였다. 이 학문을 추종하거나 비판하거나 극복한 사람들 모두 궁극적으로 그 자장 안에 있었다. 특히 190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수도 빈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황금빛 그림처럼 화려한 모습 뒤에 노동자의 가난한 삶, 격변기의 불안과 적의가 팽배했다. 이곳에 모여든 지식인과 예술가는 인간 이성과 진보란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면의 원초적 충동, 즉 관능과 폭력의 쾌락에 주목했다.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영혼의 건축가들>은 지크문트 프로이트, 알프레트 아들러, 카를 융 등 수많은 학자가 20세기 정신분석학사의 무대에서 펼치는 애증과 희로애락의 인생사를 다룬다. 의기투합해 새로운 정신의학 세기를 열지만 주장의 대립 끝에 결별하고 서로 내치는 과정들, 이들의 성격, 배경, 제1·2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 굵직한 시대사가 교차하며 정신분석학의 역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그렸다.
이들도 개인사를 돌아보면 각자 자기만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동력 삼아 인간을 이해하고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했다. 그 결과가 현대의 심리치료다. 역사에 남은 학자들이 자기 이론과 자아의 포로가 되는 모습이 소설처럼 펼쳐진다. ‘좋은 학문, 좋은 심리치료란 무엇인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헤겔의 정반합처럼 싸우고 통합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조망하게 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13 hours ago
1
13 hours ago
1
![[포토] 한돈자조금, ‘5월 슈퍼 한돈페스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014.jpg)

![[책마을] 4조 적자에서 6조 흑자로…일본제철은 어떻게 부활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358932.1.jpg)
![[책마을] 강남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책마을] 한강 신작 출간되자마자 2위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35894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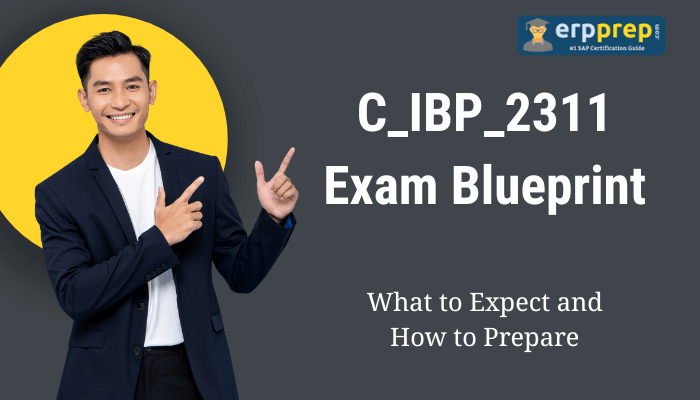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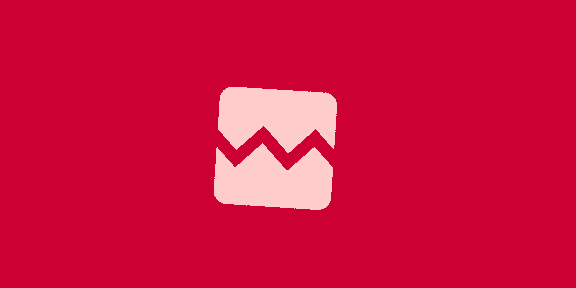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