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가 맺은 보험금 분배 약정에서 ‘변호사 선임비’라는 표현은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결했다. 약정서 해석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해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15일 아들의 사망 이후 며느리인 B씨가 받은 보험금과 위자료 일부를 자신에게 나눠달라고 주장한 망인의 아버지 A씨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망인의 시아버지인 A씨와 며느리 B씨는 2020년, 고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과 위자료 등에 대해 “소송이 모두 끝난 이후 받은 금액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는 보험금 약 2억 원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등 약 7억 원을 수령했고 소송을 맡긴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과 인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이 변호사 비용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A씨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각서의 ‘선임비’라는 표현이 통상 착수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성공보수는 분배 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성공보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 뒤 나머지 금액을 A씨와 절반씩 나눠야 했고, 이로 인해 A씨보다 적은 금액을 최종 수령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서에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별도로 기재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변호사 비용 전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days ago
2
2 day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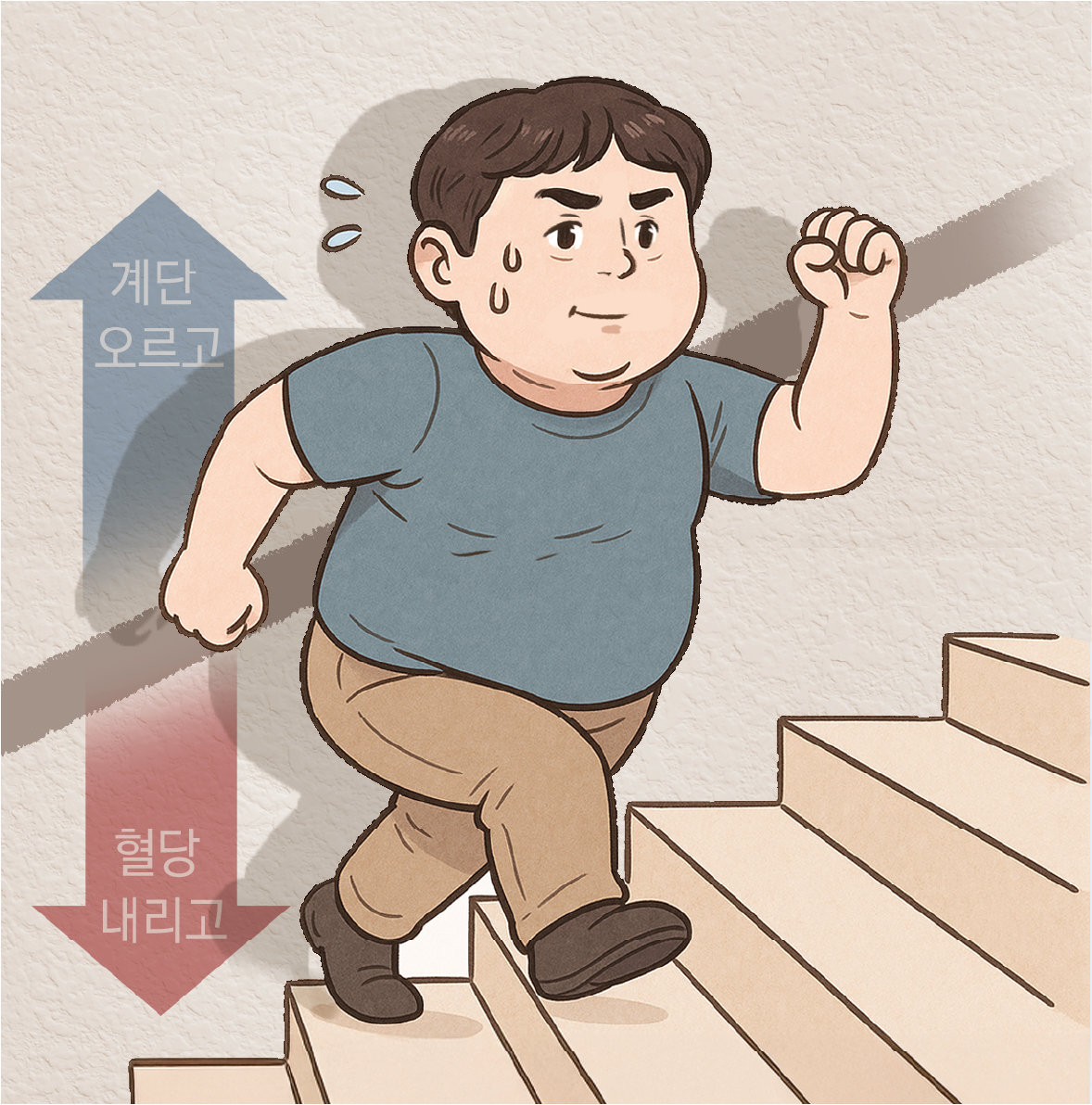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